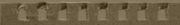<물계자勿稽子>는 신라 제10대 내해왕(奈解王) 때의 사람으로
검술과 음악을 좋아하였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말 없기로, 시나위(향가) 잘 부르기로, 거문고 잘 타기로,
춤(특히 칼춤) 잘 추기로 유명하였다.
<물계자>는 칼을 만지거나 거문고를 안고 앉는 것이 평생의 버릇이었다.
누구에게 못마땅한 말을 듣거나 세상의 걱정스러운 소문을 듣거나 하면,
으레 칼을 가지고 숲속으로 들어가서 칼춤을 추었다.
아니면 거문고를 끼고 시내 물가로 가 앉았다.
나라에 포상팔국의 난이 일어나자, <물계자>는 義兵으로 종군하여 큰 공을 세웠다.
그러나 기록자의 미움을 받아, 그 공(功)이 전혀 기록되지 않았다.
“그대의 공이 가장 컸는데, 나라에 탄원이라도 내지 그러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물계자>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공을 자랑하고 이름을 구하는 일은 뜻있는 선비가 할 일이 아니오.
다만 뜻을 분발하고 격려하여 뒷날을 기다릴 뿐이지.”
그 후에 또 전쟁이 났고, <물계자>는 또 전쟁터에 나가 승리를 거두고 큰 공을 세웠다.
그러나 이번에도 또 그의 공은 기록되지 않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부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 일찍이 들으니, 신하된 도리는 위태롭게 되면 목숨을 내놓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기 몸을 잊는다고 했소.
두 번에 걸친 싸움은 진정 위태롭고도 어려운 싸움이었소.
그런데도 능히 목숨을 내놓고 몸을 잊는 것으로서 여러 사람에게 알리지 못했으니,
장차 무슨 면목으로 저자거리와 조정에 나가랴?”
<물계자勿稽子>는 이후 머리를 풀고 거문고를 들고 산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
나라에 큰 공을 세웠으되,
그 공을 내세워 녹을 탐내지 않고 끝내 몸을 뒤로 물리었던 것이다.
이는 무언(無言)의 실천 가운데 보여준 위대한 대선인(大仙人)의 숭고한 정신이었다.
<물계자>가 중년이 되자,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속속 모여 들었다.
검술, 음악, 그리고 검령(神靈)을 섬기는 묘리(妙理)는 말할 것도 없고,
처세법 혹은 정치 군사를 물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리고 자기 지망대로 수련을 쌓으며 묵기를 청하는 청년들이 날로 늘어났다.
<물계자>는 이를 허락하고, 오랜 세월을 두고 수련을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과목 수련의 준비 과정으로 정신수련부터 먼저 시켰다.
“검술이나 음악이나 그 밖에 무엇이나 열 가지고 백 가지고 간에,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바른 道理이기만 하면 반드시 둘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근본에서 나오는 것이니, 그것을 사람의 얼(精神)이라고 해두자.
천만 가지 도리가 다 이 얼에서 생겨나는 것이니,
이 얼을 떼어놓고는 이것이니 저것이니 하는 것은,
소 그림자를 붙들어다가 밭을 갈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허망한 소견이야.”
그래서 수련을 시킬 때 먼저 이런 질문을 하였다.
“너 숨을 쉴 줄 아느냐?
숨이란 만들어 쉬는 것이 아니라, 절로 쉬는 것이다.
숨을 고루는 것이 얼의 앉을 자리를 닦는 것이니,
얼의 자리가 임의롭고 난 뒤에야 무슨 수행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숨을 고른다, 얼의 자리를 닦는다,
천만 가지 일과 천만 가지 이치가 다 여기서 시작되는 법이거든.
여기서 시작된 것이 아니면 참된 경지에 이를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설령 모르는 사람의 눈을 얼핏 속여 넘기는 수 있다 하더라도,
검님(신령님)이 그런 사람의 눈에는 그물을 덮어버리는 거야.”
이러한 방법의 수련으로 얼마를 지내고 나면,
누구나 다 대선인(大仙人)의 신통한 교육 방법에 감복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물계자는 또 항상 이런 말을 했다.
“사람은 누구나 제 빛깔(自己本色)이 있는 법이어서,
그것을 잃은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제 빛깔을 지닌 사람만이 제 길수(自然의 妙理)를 찾게 되는 법이야.
보라, 꾀꼬리 소리는 아름답고 까마귀 소리는 곱지 않다지만 그것이 다 제 빛깔이거든.
노루는 뛰기를 잘하고 솔개는 날기를 잘 하거니와,
뛰는 대로 나는 대로 그것 역시 제 빛깔 제 길수야.
까마귀가 꾀꼬리 소리를 내는 체 하거나, 노루가 나는 체 하거나
이것은 모두 다 제 빛깔을 잃은 것이니,
백년이 가도 천년을 가도 제 길수를 얻지 못하는 법이야.
어린애 말씨는 말이 되지 않은 채 어른의 귀에 괴이지마는
철든 사람이 이런 흉내를 내다가는 웃음꺼리나 되고 말것이니
이것이 다 제 빛깔 제 길수를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
그러나 제 빛깔이라는 것은 제 멋(自己趣向)과는 다른 것이야. 누구나 제 멋이 있어야 하지만, 제 멋대로 논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맞는 것이 아니야. 아무에게나 맞을 수 있는 제 멋은 먼저 제 빛깔을 지녀서 제 길수를 얻은 그 멋이고, 한 사람에게도 맞을 수 없는 제 멋이란 제 길수를 얻지 못한 그것이야. 말하자면 제 빛깔과 절로(自然)와가 한데 빚어서 함뿍 괴고나면 제작(天人妙合)에 이르는 법인데, 이 제작이란 검님이 사람의 마음에 태이는(和合) 것이요, 검님의 마음이 사람의 생각에 태이는 강이니, 말하자면 사람이 무엇이나 이루었다고 하면,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제작에 이르렀다는 것이야.”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저절로 <물계자勿稽子>를 중심으로 한 풍기(風氣)가 생겼다. 그 풍기(風氣)란, <물계자> 문인치고 빽빽하거나 어색하거나 설멋지거나 까불거나 설넘치거나 고리거나 비리거나 얄밉거나 젠체하거나 따분하거나 악착한 사람은 아주 없는 것이다. <물계자>와 그의 문인들은 그야말로 참 멋! 참 풍류인들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누구나 척 대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은 물계자의 문인들을 모두 참 멋쟁이(風流)라고 말하게 되었다.
“멋, 풍류(風流)! 그야말로 하늘과 사람 사이에 통하는 것이 ‘멋’이야. 하늘에 통하지 아니한 멋은 있을 수 없어. 만일 있다면 그야말로 설멋이란 말이야. 제가 멋이나 있는 체 할 때, 벌써 하늘과 통하는 길이 막히는 법이거든. 참 멋과 제작은 마침내 한지경이니, 너희는 여기까지 아는지? 사우(調和)맞지 않는 멋은 없는 것이며, 터지지(融通透徹) 않은 멋도 없는 것이니, 사우맞지 않고 터지지 않은 제작이 있는가?”
이런 말을 들을 때면 환희와 감격에 넘쳐서 눈물을 흘리며 절하는 제자도 있었다. 물계자는 칼을 쓸 적마다 언제든지 먼저 숨을 고루었다. 그리고는 “살려지이다.”라는 기도사를 몇 번이든지 수없이 되풀이하면서 정성을 다하여 기도를 올린 다음에, 으레히 노래를 불렀다. 노래가 끝나면 이어 춤을 추었다. 춤이 끝난 다음에 비로소 칼을 쓰는 것이 언제나 변함없는 순서였기 때문에, <물계자>의 문인들은 으레 대선인(大仙人)의 하는 순서대로 따랐다.
<물계자>는 술이라도 한잔 들어가면 누가 청할 것도 없이 유별나게도 큰 키에 황새 춤을 추면서, 같이 취한 사람들과 어울러져 자작곡인 <봄 술>을 불렀다. 물계자가 앞창을 대면 여러 사람들이 일제히 뒤(후렴)를 받는 것이었다.
삼거리 주막에 나그네 오고 삼거리 주막에 나그네 가네. 나그네 가는 날 나그네 오고 나그네 오는 날 나그네 가네.
달 좋은 봄철이 몇 밤이뇨. 알뜰한 이 밤이 가단 말이 얼시구 놀잔다 벗님네여 얼시구 들시구 놀다 가세.
접동새 비렁에 꽃이 피고 접동새 비렁에 꽃이 지네. 꽃 지는 가지에 꽃이 피고 꽃 피는 가지에 꽃이 지네.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그 누구 할 것 없이 <물계자>가 나오면 반겨 인사를 했고, 술이 있으면 반드시 <물계자>를 청했다. <물계자>는 몇 모금 목을 축이고 나서 자기가 작곡한 가락으로 우렁차게 거문고 줄을 울렸으며, 이따금은 이 또한 자작의 사슬로써 혼자 병창을 하기도 하였다. 바다가 울어 성낸 물결이 야횐 밤중에 왼 땅이 뒤누어 미르가 짓나니 구비를 치나니 구비를 치나니 미르가 짓나니 벼락아 아느뇨 사나이 가슴을 바람이 일어 세찬 바람이 천리를 불어 만리를 가자 자던 갈범이 으흐렁 으흐렁 쌍불이 철철철 바람을 달려라 벼락아 아느뇨 사나이 가슴을
이 곡조는 <벼락아 아느뇨>가 제목이었고, 벼락이란 다름 아닌 자기 칼 이름이었다. 포상팔국의 난에서 공을 세웠지만 그 공이 기록되지 않자 <물계자>는 부인과 함께 사치산으로 들어가 자기가 지은 <사치산 가락>을 맑은 목청을 돋구어 힘차게 부르며 자연과 함께 살았다.
구름이 피어 구름이 나부껴 거듭에 더한 거듭 열두 거듭 흰 구름이 일어 사치산은 깊어 또 깊어라. 물이 맑어 물이 흘러 샘물은 골을 울려 시냇물은 구비를 틀어 사치산은 깊어 또 깊어라. 소나무 잣나무 벗나무 도토리나무 어흐럼 머루 다래 얼키 설키 한 넝쿨이 사치산은 깊어 또 깊어라. 삼주 아기풀 주대뿌리 은조롱 사재발 겨우살이 임자 없는 불로초를 사치산은 깊어 또 깊어라. 엉개 두룹 도라지 더덕 고비 고사리 원추리 참나물 사치산은 깊어 또 깊어라. 꾀꼬리 접동새 뻐꾸기 부흥이 사슴이 국찌기 갈범 멧돼지 사치산은 깊어 또 깊어라. 이런 꽃 저런 꽃 풀엔 풀꽃 나무엔 나무꽃 피는 꽃 지는 꽃 이름 없이 좋은 꽃을 사치산은 깊어 또 깊어라. 개인 날 흐린 날 바람 불고 비 오는 채 날마다 그럴 듯 거문고 소리 그윽할 때 사치산은 깊어 또 깊어라
이윽고 세월이 흘러 물계자의 머리도 학처럼 희어 노선인(老仙人)이 되었을 때, 나라에 또 전쟁이 났다. 이때도 물계자는 필마단기(匹馬單騎)로 홀연히 군문(軍門)에 나타났는데, 노선인의 풍도(風度)에 적군 아군 할 것 없이 감탄을 감추지 못하였다.
노선인(老仙人)은 싸운다기보다는 차라리 긴 칼을 휘두르면서 한 마리 학처럼 춤을 추었다. 그래서 몸은 가볍고 날쌔며 나는 듯하였다.
그러나 이 학춤이 바로 칼 쓰는 묘법(妙法)인지라, 칼 빛이 번쩍이는 곳마다 적군들은 바람에 쓰러지듯 자빠져 갔다.
이렇게 쉽사리 적군을 물리치고 돌아온 물계자는 약간의 땀을 닦으면서 빙그레 웃었다. "사람은 역시 나이 먹으면 늙는 게야. 웬 땀이 다 났어..."
대선인(大仙人) <물계자勿稽子> 외에도 신라에 선풍(仙風)을 드날렸던 풍류인(風流人)은 옥보고(玉寶高), 백결선생(百結先生), 우륵(于勒), 영랑(永郞), 술랑(述郞), 남랑(南郞), 안상(安詳) 등 많은 선인들이 있었다. 신라는 선도(仙道)의 나라였다.
'고대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45. 晉이 실권없는 平州를 설치하다 (0) | 2014.09.11 |
|---|---|
| 244. 中川大帝 然弗이 女色으로 죽고 西川大帝 若友가 즉위하다 (0) | 2014.09.11 |
| 242. 浦上八國의 亂 (0) | 2014.09.11 |
| 241. 司馬炎의 晉 건국 (0) | 2014.09.11 |
| 240. 모래 반쪽 인생 沙伴과 古爾의 王位簒奪 (0) | 2014.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