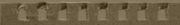1. 7세기 동아시아 최대의 전쟁을 고구려의 승리로 이끈 위대한 군사전략가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외침(外侵)을 막아내고 국난(國難)을 극복한
대표적인 전쟁영웅(戰爭英雄) 세 명을 거론한다면
고구려(高句麗)의 <을지문덕乙支文德>, 고려(高麗)의 <강감찬姜邯贊>,
조선왕조(朝鮮王朝)의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을 이야기할 것이다.
이들 가운데서도 가장 위대한 전공(戰功)을 세운 최고의 영웅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한국인들은 대부분 <이순신>이라고 대답한다.
하지만 <이순신>이 활약했던 16세기 임진왜란(壬辰倭亂)보다
6세기 후반에 중원대륙을 통일한 수(隨) 제국이 모든 국력을 걸고 고구려를 침략했던
7세기 초반의 여수전쟁(麗隨戰爭)이 가장 규모가 크고
사상자가 매우 많았던 전란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612년 살수대첩(薩水大捷)으로 수조(隨朝)의 침략군을 격퇴한
<을지문덕>의 전공이야말로 우리 대외항쟁사(對外抗爭史)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컸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러나 <을지문덕>은 우리에게 너무 암흑 같은 존재다.
역사 인물이 분명하지만 우리는 그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
그가 언제 태어나 어느 시기에 출장입상(出將入相)을 했으며 무슨 벼슬을 지냈는지,
심지어 언제 죽었는지도 모른다.
그의 아버지는 누구이며 그의 가문은 어떤 집안이었는지조차 알려져 있지 않다.
삼국사기(三國史記) 열전(列傳)에서도
을지문덕의 업적인 살수대첩에 대해서만 기술(記述)했을 뿐,
그의 개인 사료는 현재 남아있지 않는다.
야사(野史)로 분류되는 조대기(朝代記)·규원사화(揆園史話)·태백일사(太白逸史) 등과
해동명장전(海東名將傳)·고려을지공막리지제축문(高麗乙支公莫離支祭祝文) 등
조선왕조 시대의 문헌, 단재(丹齋) 신채호(申采浩) 선생이 1908년에 출간한
을지문덕전(乙支文德傳) 등만이 그와 관련된 설화(說話)를 전해주고 있을 뿐이다.
중국 정부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동북공정(東北工程)을 진행하여
고조선·부여·옥저·고구려·발해를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분리시키고
심지어 신라나 고려마저 중국 변방의 소수민족이 세운 위성국가였다는 주장을 펼치며,
만주 지역에 대한 통치력을 강화하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의 역사왜곡(歷史歪曲)을 추진하여 왔다.
동북공정은 공식적으로 완료되었지만 중국의 집권 공산당이
아직도 남한 측에 의해 주도되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한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한국의 교육정책 책임자들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더욱 우리 민족의 역사를 교육하는 일에 전력을 쏟아 붓기는커녕,
대학입시에 별 도움이 안 되고 경제실용적인 학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역사 교육을 축소하여 선택과목으로 전락시켰다.
나관중(羅貫中)의 삼국지(三國志:三國志演義)는
중국 후한(後漢) 말기부터 위(魏)·촉(蜀)·오(吳) 삼국시대까지
중원대륙에서 일어났던 다양한 정치적·군사적 분쟁을 표현한 명대(明代) 초기의
장편소설로 오늘날까지 동양 사람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문학작품이다.
나관중의 삼국지에 가장 크게 열광하는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다.
한국인들이 중국인들보다 삼국지를 더 많이 사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기 184년에서부터 280년까지 이르는 이 시기에
중원대륙에서 무수히 많은 영웅호걸들이 각자 독특한 캐릭터를 뽐내며
등장했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삼국지연의에는
사내들의 호승심(好昇心)을 자극하는 마력이 숨어 있다.
그래서일까?
이문열(李文烈)·정비석(鄭飛石)·김홍신(金洪信)·황석영(黃晳映) 등
국내 문학의 거두들은 마치 연례행사를 치르듯이
삼국지연의를 옮겨서 각색하는 글쓰기를 반복하였다.
이렇게 되니 나관중의 삼국지는
국내 대학 입시 논술고사의 단골 메뉴로 등장하게 되었고
“삼국지를 세 번 이상 읽지 않은 사람과는 친구로 사귀지 말라”는
괴상한 소리까지 나오게 되었다.
삼국지연의의 배경,
즉 1백 여년간의 시기에 활동했던 제갈량(諸葛亮)·관우(關羽)·장비(張飛)·조운(曺雲)·
곽가(郭嘉)·허저(許楮)·하후돈(夏侯惇)·서황(徐晃)·여포(呂布)·주유(周瑜)·감택(鑒澤)·
황개(黃蓋)·주태(周泰)·여몽(呂蒙) 등은 잘 알지만
고구려사(高句麗史)에 불꽃을 피운 온달(溫達)·강이식(姜以式)·을지문덕(乙支文德)·
연개소문(淵蓋蘇文)·양만춘(楊萬春) 등은 모른다.
적벽(赤壁)·허창(許昌)·건업(建業)은 줄줄 외우지만
비류수(沸流水)·건안성(建安城)·오골성(烏骨城) 등은 어느 나라 영토인지도 모른다.
삼국지연의는 모두 60년도 못 간 보잘것없는 나라였던 위·촉·오 중국 삼국시대의
역사는 알아도 7백년에서 1천년까지 사직(社稷)을 유지했었던
고구려·백제·신라 우리 민족의 삼국시대를 모르고,
심지어 우리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국력을 자랑했던 고구려의 역사마저
망각해가는 정신없는 백성만을 양산했던 것이다.
중국 정부는 고구려가 한국인들의 조상에 의해 건국된 나라였다는 사실을 부정하면서
만주는 물론이거니와 북한의 영토마저 한국인들의 문화적 종속권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교활하고 치밀한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정작 한국에서는 자국 역사의 교육을 소흘히 하면서
중국의 삼국지연의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으니
장래 우리 민족의 생존권을 과연 누가 무슨 방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단 말인가?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광활한 영토를 가진 나라이며
지구촌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지닌 강대국이다.
지금의 티베트 지역과 신강유오이자치구(新疆維吾爾自治區)에서
벌어지고 있는 독립운동을 무력(武力)으로 탄압하며
조심스럽게 한반도 북부 지역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중국은
연변조선족자치주(延邊朝鮮族自治州)를 완전히 중국의 세력권에 귀속시키기 위해
한반도에서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는 일을 방해하려고 갖은 공작을 꾸몄으며,
동북공정(東北工程)은 그러한 공작 가운데 하나였을 뿐이다.
일본 정부는 독도(獨刀)를 다케시마[竹島]라는 명칭으로 부르며,
1945년 태평양전쟁(太平洋戰爭)의 종전(終戰) 당시
미국에 의해 자국의 영토로 인정받았으나
한국에서 70년 동안 불법적으로 점거중이라면서
국제사법재판(國際司法裁判)을 통해 시비(是非)를 가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인들이 이 같은 일본 측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함과 동시에
백두산(白頭山)이나 이어도(離於島)에 대한 영유권을 내세우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제적으로 명분과 지지를 얻고 장차 정세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전개된다면
한반도를 점령하겠다는 의도임에 틀림없다. 즉, 침략이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파문에 이어
중국의 동북공정까지 한국인들의 대외적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고
우리 민족의 자주권 유지에 대한 명분이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는 오늘날,
외침(外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민족의 생존권에 대한 위협을 막아낸
구국간성(救國干城)의 영웅을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찾아내어 탐구하고
부각시키는 작업을 경기회복(景氣回復)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하여
하찮은 일로 치부해도 되는 것인가?
한반도를 강점하고 36년간 식민지 지배를 했던 일본 제국주의 세력은
1910년 8월에 경술병탄늑약(庚戌倂呑勒約)을 체결하기 전부터
한국침략의 정당성을 완성하기 위해 한사군 한반도 북부 위치설,·
임나일본부설 등을 만들어 역사를 날조하였다.
이 시기에 우리 민족의 고대사를 복원하여
일본인들의 역사왜곡(歷史歪曲)에 대응하고,
중원 세력과 대등하게 경쟁했던 자랑스러운 역사를 민중에게 가르쳐서
민족해방운동(民族解放運動)의 정신적 토대를 구축한 천재사학자(天才史學者)가
등장했으니 그가 바로 단재(丹齋) 신채호(申采浩) 선생이었다.
선생이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고 연구했던 것은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무력(武力)과 재력(財力)이 막강했던 시기인 고구려사(高句麗史)였으며,
그 가운데서도 선생이 매우 자랑스러운 영웅으로 숭상했던 역사인물이
바로 을지문덕(乙支文德)이었다.
그러나 선생께서 ‘우리 역사상 최고의 위인’이라며
극찬과 존경을 바친 을지문덕에 관련된 사료가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연구와 문장에 천부적인 자질을 갖추었던 선생이라고 해도
그의 전기를 쓰는 데 애를 먹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은 을지문덕전(乙支文德傳)의 서론에서
“다행이구나, 을지문덕이여! 오히려 이 몇 줄의 역사가 전해오고 있도다.
불행하구나, 을지문덕이여! 겨우 이 몇 줄의 역사만 전해 오고 있도다”
라고 한탄했던 것이다.
우리는 학교에서 서양사(西洋史) 과목을 수업받을 때에
약소민족이 강대국의 침략을 물리쳐 승리한 대표적인 전쟁을
기원전 5세기의 그리스·페르시아 전쟁이라고 배웠다.
페르시아의 국왕 크세르크세스 1세가
기원전 480년 50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침공했을 때,
그리스 해군의 총사령관으로서 살라미스 해전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테미스토클래스는 고대의 역사인물 가운데 세계 최고의 영웅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서기 7세기의 여수전쟁(麗隨戰爭)을
고구려의 승리로 이끌었던 을지문덕이야말로
아테네의 테미스토클래스보다 더 위대한 전공(戰功)을 세운
탁월한 군사전략가였음을 누구에게도 내세울 수 있고 또 자부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자랑스러운 승리를 들추어내는 것은
조상들의 위대한 업적을 기림으로써 국민들에게 영웅을 숭배하는 마음을 고취시키고,
열성적이며 모험적이었던 고구려인들의 옛 발자취를 묘사하여
다시 영웅을 불러 일으켜 나라의 어지러움과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함이니
을지문덕에 대한 이 현대판 전기가 비열한 자들의 마음을 경계·각성시키고
민족의 자존감을 되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고구려군은 어떤 방법으로 전투를 벌였을까?
옛날 전쟁에서 승패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대형이다.
기원전 6세기에 로마군은 게르만 종족과의 전쟁에서
밀집대형을 펼쳐 승리했다고 전해진다.
전투시 상대방의 대형을 먼저 허물어뜨리거나
허물어지기 직전의 상태를 연출하면 승기(勝氣)를 잡는 것이었다.
상대방 군대가 자군의 대형을 뚫고 들어가 진지의 후면이나 측면을 먼저 포위하면
대개는 전투를 포기하고 도주했다.
이것은 총포와 창검을 병용한 19세기 미국남북전쟁(美國南北戰爭) 같은
근대의 전쟁까지도 변함이 없었다.
이 시기의 군인들은 총탄이 날아오고 포탄이 작렬하는 가운데서도 꼿꼿하게 서서
사각형 대열을 이룬 채 전진했다.
몸을 낮게 숙이고 넓게 산개해서 전진하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전투에서 백병전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이었다.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서양에서 사용되던 총기(銃器)는 사거리도 짧고
총탄과 화약을 따로따로 장전하는 방식이라 사격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러므로 밀집대형으로 전진해도 집중사격이 날아오는 순간은 한 번 내지 두 번이다.
진짜 승부는 백병전으로 판가름 난다.
그런데 어떤 군대든 촉장(蜀將) 관우(關羽)처럼
혼자 적진으로 뛰어들 수 있는 용사가 과연 몇이나 될까?
그러므로 이때까지만 해도 공격군이든 수비군이든
먼저 대형이 깨지는 편이 지는 것이었다.
이렇게 뻣뻣이 서서 걸어가는 공격형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대포와 기관총이 맹위를 떨친 제1차세계대전(1914년~1918년) 때였다.
적군의 대형을 허무는 중요한 임무는 먼저 기병대가 맡게 된다.
기동력이 뛰어난 기병대를 내보내 밀집대형의 측면
또는 약한 부분을 뚫고 들어가는 이 전술은
서양에서는 고대 마케도니아의 제왕인 알렉산드로스 1세가 개발했고,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Hannibal)이 계승하여
로마의 군인 카이사르에 의해 완성되었다.
그러나 동양에서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훨씬 강력하고 정교한 기병전술이 사용되었다.
중장기병은 고구려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중국북방의 유목민족인 흉노족(匈奴族)과 선비족(鮮卑族)도 중장기병대를 운영했으며
중국에서도 당대(唐代)까지는 군대에서 중장기병을 양성했고,
거란족(契丹族)의 요(遼)·여진족(女眞族)의 금(金)과 청(淸)·몽고족(蒙古族)의 원(元)도
모두 중장기병을 중시했다.
중장기병대는 밀집대형을 이루어 천천히 진격하여 적진의 모서리나 측면을 공략한다.
중장기병들이 적진에 충돌할 때에는
방진 또는 쐐기골 대형으로 창을 내밀고 부딪힌다.
고구려의 중장기병대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군대나 로마의 기병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위력을 지녔는데
그 비결은 말안장 밑에 다는 발받침인 등자(鐙子)였다.
서양에서는 8세기부터 보편화된 등자를 동양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최초로 중장기병의 장비에 등자를 포함시키기 시작했던 나라 역시 고구려였다.
고구려의 중장기병은 4미터가 넘는 장창을 어깨와 겨드랑이에 밀착시키고,
말과 기사의 갑옷과 체중에 달려오는 탄력까지도 모두 합하여 적진에 부딪혔다.
고구려군은 중국인 군대보다 더 길고 무거운 5·4미터에
9킬로그램까지도 나가는 장창을 내지르며 덤벼든다.
(다만 모든 창이 이렇게 길지는 않았을 것이다)
권투에서 잽과 페인팅 모션처럼
적군의 눈을 혼란시키는 화려한 창 놀림과 함께 말이다.
물론 동양의 기병들도 서양의 기병들처럼 투창술(投槍術)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고구려군을 비롯한 동양의 기병들은 사실 등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투창술의 위력도 더욱 강화되었다.
투창 공격은 원거리에서 적군을 제압하는 장점이 있다.
보병의 밀집대형과 충돌할 때도 여러 명의 기병이 빠르게 선회하면서
집중사격을 하고 빈틈을 노려 돌격조가 치고 들어가는 전술도 활용됐을 것이다.
장갑을 높이면 군마의 속도는 떨어지고,
속도를 높이려면 장갑을 가볍게 해야 하기에 장갑과 속도는 상극이다.
당나라의 기병대는 장갑보다는 속도를 선택했고
금나라의 군사들은 반대로 속도를 아예 포기하고 말에 두 세벌의 갑옷을 껴입혀
그야말로 화살로는 쓰러뜨릴 수 없는 탱크를 만들었다.
두 세벌까지 껴입지는 않았지만 고구려의 중장기병도 상당한 장갑력을 발휘한다.
그런데 아무리 중장갑을 했어도 말은 속도가 있으므로
적군의 기병이 5미터나 되는 긴창을 내지르며 50미터 이내로 들어오면
사격할 수 있는 기회는 한두 번밖에 되지 않는다.
비록 중장기병대의 장갑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보병에 비해 대형이 쉽게 허물어지는 약점이 있으므로
보병들은 진지 앞에 녹각이나 마름쇠 같은 장애물이나 함정을 설치,
적군의 기병들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사격지점을 확보하게 된다.
수비군의 대응전술이 만만치 않다고 여겨지면
공격군도 중장기병대가 보병과 충돌하기 이전에
가능한 수비대형을 동요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경기병대를 함께 출동시킨다.
기마민족의 상징처럼 된 환상의 기마술과 사격솜씨를 자랑하는 부대는
중장기병대가 아니라 이 경기병대다.
말 달리며 활 쏘는 기술을 기사(騎射)라고 한다.
무용총(舞踊塚)의 수렵도에는 말을 타고 활로 사냥하는 벽화가 있고,
덕흥리벽화고분(德興里壁畵古墳)에는 표적을 세우고
활쏘기 연습을 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이 그림들을 보면 말을 탄 용사는 앞으로 사격을 하기도 하지만,
몸을 뒤로 돌리고 쏘기도 한다.
이 뒤로 돌려 활을 쏘는 방법을 서구 사람들은 파르티아 사법(射法)이라고 불렀다.
이 파르티아 사법 역시 등자 때문에 가능했다.
등자를 몰랐던 서구의 기사들은 말 달리며 활을 쏘는
동양 기병대의 솜씨에 경탄을 금치 못했다.
몸을 뒤로 돌려 쏜다는 것은 더욱이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다.
몽골군과 싸워 본 유럽의 기사들은 몽골군이 달아날 때
절대로 함부로 쫓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다.
달아나다가 몸을 돌려 날리는 그들의 화살에 엄청나게 당했기 때문이다.
조선왕조를 창업한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도 왜구를 토벌하는 전쟁에서
여러 번 이 수법으로 적장을 사살했다.
이동목표를 쏠 때도 그렇고 자신이 이동하면서 쏠 때도 마찬가지지만,
표적이 계속 움직이므로 겨냥을 하거나 사격을 할 때면
조준점을 이동시킬 충분한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앞으로 쏘려면 말의 머리 때문에 방해를 받고 사각지대가 생긴다.
그러므로 말을 타고 사격할 때는
목표를 측면에서 뒤로 가도록 하고 쏘는 게 시야도 넓고 효율적이다.
신체 구조상으로도 앞으로 쏘기보다 뒤로 돌아 쏘는 경우가
사격 자세도 안정적이어서 명중률도 높다.
좌우간 이 기술 덕분에 기병들은 말을 타고 달리면서
360도 어느 방향으로든 화살을 날릴 수 있었다.
고구려인을 포함해서 한예족(韓濊族)은
아주 오래 전부터 활 쏘는 솜씨가 매우 뛰어났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예족의 장기(長技)였던 신기(神技)의 궁술(弓術)은
맥궁(貊弓)이라는 활을 사용했기에 가능했던 측면도 있었다.
물소의 뿔로 만들어졌다는 맥궁의 전통은 조선왕조 시대에도 이어졌다.
당기기가 무척 힘든 이 활은 크기가 작아도
화살을 날리는 힘이 보통 강력한 게 아니다.
조선에서는 서로 상대방의 활시위를 당겨 보면서
누구 활이 더 센가를 가지고 힘자랑을 하는 풍습이 있었고,
명중률이 좋아도 활 힘이 약하면 일류 궁사로 쳐주지 않았다.
신기의 활 쏘는 솜씨와 기마술,
강력한 활로 무장한 경기병대는 적진의 주변을 돌며 화살을 날린다.
밀집대형의 약점은 언제나 측면과 후면이므로 경기병대도 이곳을 주로 노렸을 것이다.
피로해진 적군의 대형이 빈틈이 생기면 중장기병대가 돌격한다.
경기병대가 비록 갑옷을 입지 않고 활 하나 이외에는 아무런 무기를 지니지 않아서
백병전 능력은 제로라고 해도 기동력은 우수하기 때문에
중장기병대는 경기병대를 쉽게 잡지 못한다.
그리하여 중장기병대는 반드시 경기병대의 엄호를 받아야만
적군의 대형을 부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고구려의 군대하면 흔히 기병을 연상하지만,
사실 기병들의 역할은 제한적이며 전투의 일부분만을 담당할 뿐이다.
어느 지역, 어느 민족에게서나 보병이 없는 군대는 없으며
보병의 불행은 흔하고 신분이 낮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병은 기병의 보조부대로만 존재한 것이 아니다.
기병의 전투력이 보병과 비교해 절대 우위라는 생각은 상당한 오류이며
기병은 절대 단독으로 전투를 할 수가 없다.
중장갑을 하고 훈련이 잘 된 보병대열은
제 아무리 중장기병대라 하더라도 결코 만만히 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로마의 카이사르는 숙적 폼페이우스를 패퇴시킨 기원전 48년 파르살루스 전투에서
고참병만으로 구성한 2천여 명의 중장보병으로 7천 기병대의 돌격을 가로막게 했다.
고구려군도 무모하게 기병부대만으로 싸우지 않았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기병·보병 혼합전술을 구사했을 것이며,
중장기병대가 단독작전을 구사하는 것은 위험하기에
경기병을 내보내 사격전을 하고 밀집대형을 이룬 중장보병대끼리 접전을 펼치면서
상대방의 빈틈을 노리다가 중장기병대에게 돌격을 감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적진을 돌파한 기병은 적진의 중심부로 진격할 수도 있고,
측면과 후면에서 수비군을 압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느 경우든 보병이 그 틈에 진격하여 적군을 완전히 허물어뜨려야 한다.
기병돌격은 일종의 쐐기다.
쐐기를 꽂았다고 벽이 허물어지지는 않는다.
금이 간 벽을 때려 벽을 허무는 최후의 일격은 보병이 담당한다.
기병이 적진을 돌파하고 중장보병이 적군을 밀어붙여 대형이 허물어지면
적군은 전투를 포기하고 달아날 것이다.
전투는 이기는 것 못지않게 적군에게 최대한의 타격을 가해
적군의 전력을 소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완전히 이기려면 추격해서 적군에게 회복 불능의 타격을 주어야 한다.
도주하는 적군을 추격하여 섬멸하는 것은 기병의 몫이다.
빠른 속도로 뒤에서 쫓아가 헤집고 치는 것이므로 적군은 숨을 돌릴 여유가 없다.
기병이 빠르게 압박할수록 적군의 대형은 더 심하게 흩어진다.
훈련과 경험이 부족한 군대일수록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구 달아나다가 대량살상을 당하는 것이다.
고구려는 풍부한 철광을 보유했던 나라로서 군인들의 무장에 있어서
백제나 신라보다 앞서고 병력이나 전술운영 능력에서 우위를 보였기에
예성강·한강 유역에 오직 공격만을 예상한 소규모 보루만을 설치하였다.
반면 백제나 신라는 고구려의 남침을 방어하기 위해
요새화된 산성과 장성을 많이 쌓았다.
3. 군대와 전쟁의 나라 고구려
한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의 전사(戰史)를 살펴봐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단한 전공(戰功)을 세웠던 을지문덕(乙支文德)은
명림답부(明臨答夫)·광개토호태왕(廣開土好太王)·장수태왕(長壽太王)·
연개소문(淵蓋蘇文) 등과 더불어 후대에 고구려를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막강한 국력을 과시했던 나라로 인식시켰던 인물들이었다.
우리가 로마(Rome)제국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고대 국가들 가운데 국력의 막강함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군사력이다.
로마 제국은 강한 군사력이 있었기 때문에 괄목할 만한 영토 확장을 이룩할 수 있었고
이는 오랜 세월 로마에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주었다.
고구려 역시 세월이 지나며 잘 단련된 군사력을 바탕으로 영토를 확장해
4세기에는 동아시아 최고의 강대국 지위에 오를 수 있었다.
중국인들이 보기에 고구려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기마술(騎馬術)과 궁술(弓術)을 익히고,
의자에 걸터앉아 외국의 사절을 맞이하거나 설 때는 꼭 팔짱을 끼고 턱을 들어
한껏 거드름을 피우고 인사할 때는 한쪽 무릎을 꿇은 채 구령을 붙여 인사하며,
평소에도 천천히 걸어가는 법이 없어서 걸음걸이가 달음박질치는 것 같다고 하였다.
이런 기록들은 고구려의 사회 분위기가 상무적이며 무사풍에 젖어 있었음을 알려준다.
그렇다면 고구려의 군대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어떤 방식으로 싸웠을까?
황해도 안악군에 있는 안악 3호분의 행렬도(行列圖)에 그 단서가 남아 있다.
무덤의 주인공은 수레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 중인데
그 주위를 고구려의 완전무장한 군인들이 에스코트하고 있는 모습의 그림이다.
벽화는 너무나 사실적이어서 기병·보병·궁수·도부수·군악대·의장대등
다양한 병사들의 무기와 장비를 그대로 묘사했을 뿐 아니라
이들 간의 수적 비율까지도 맞추어 놓았다.
이 벽화에 등장하는 기병과 보병의 비율은 1대3 정도인데,
이는 사료에 등장하는 기병과 보병의 비율과 일치한다.
그러니 사진이나 다름이 없다.
이 무덤의 주인공은
묵서명(墨書銘)을 통해 중국인 망명객인 동수(冬壽)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자치통감(資治通鑑)에 의하면 동수는
고구려의 숙적이던 전연(前燕)의 고위관료였는데,
서기 336년에 고구려로 망명했다가 357년에 사망했다고 전한다.
그러나 무덤의 주인공을 동수가 아니라
미천왕(美川王) 혹은 고국원왕(故國原王)으로 보는 이론(異論)도 있다.
그 유력한 근거가 벽화에 나타나는 주인공의 복장,
특히 머리에 쓴 관이 고구려 국왕이 썼다는 백라관(白羅冠)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주인공이 누구든 간에 이 무덤의 주인공이
국왕이나 한때 국왕과 거의 동렬에 선 귀족층의 인물임에는 틀림없다.
그리고 국왕이든 고급귀족이든
그들이 거느리는 부대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같았던 게 분명하다.
그러니 그림 속의 군대는
고구려가 중원 왕조와 일전을 벌이던 고국원왕에서 장수태왕(長壽太王)대,
즉 4~5세기의 고구려군 편제를 보여준다는 점에는 틀림이 없다.
고구려의 중장기병(重裝騎兵)은 말과 사람이 갑옷으로 중무장을 한다.
갑옷은 미늘갑옷으로 가죽 편에 철판을 댄 미늘을 가죽 끈으로 이어 붙인 것이다.
투구, 목가리개, 손목과 발목까지 내려덮는 갑옷을 입으면
노출되는 부위는 얼굴과 손뿐이다.
발에도 강철 스파이크가 달린 신발을 신는다.
말에게도 얼굴에는 철판으로 만든 안면갑(顔面甲)을 씌우고,
말 갑옷은 거의 발목까지 내려온다.
벽화의 기병은 방패가 없는데,
신라의 중장기병을 형상화한 기마형 토기는 방패도 들고 있다.
최강의 공격력과 장갑을 자랑하는 중장기병의 주 임무는 적진돌파와 대형 파괴다.
중장기병은 밀집대형 혹은 쇄기꼴 대형으로
기마장창(騎馬長槍)을 앞으로 내밀고 돌격하여 적진을 허문다.
기병들의 장창은 보병들의 장창보다 길고 무겁다.
기마장창을 한자로는 삭(槊)이라고 한다.
중국의 삭은 보통 4미터 정도인데,
고구려군은 길이 5·4미터에 무게 6~9킬로그램 정도 되는 삭을 사용하기도 했다.
기병의 또 다른 무기는 칼이다.
고구려군의 칼은 그림으로 보아서는 직도(稙刀)인지
칼날이 약간 휘어진 곡도(曲刀)인지 판별하기가 곤란하다.
유물 중에는 당나라에서 유행하던 곧은 환두대도(環頭大刀)가 많다.
기병들이 쓰는 칼 가운데에는 끝이 약간 넓고 뭉특하게 보이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끝부분이 무거워져 내려치고 베는 데에 유리하다.
말을 타고 휘두르는 것이므로 찌르기는 포기하고 치고 베는 데에 중점을 둔 무기이다.
이런 칼은 적의 대형을 돌파하고 난 다음의 백병전(白兵戰) 때,
도주하는 적군을 추격하여 뒤에서 내리치면 아주 효과적이다.
중장기병이 활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긴 갑옷이 사격할 때는 불편하므로
활은 개인적으로 근접전(近接戰)에서 적군을 쓰러뜨릴 때나
갑옷을 벗고 경기병(輕騎兵)전술로 전환했을 때 주로 사용했고
중장기병의 집단전술에서는 사격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던 것 같다.
중장기병은 다른 병졸보다 신분이 높다.
말과 갑옷은 매우 비싼 장비였고,
기마술(騎馬術)은 상당히 전문적이고 오랜 훈련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배층이 아니면 중장기병이 될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병사 개개인의 전투력도 중장기병이 탁월하게 높았다.
아마도 중장기병이 전장(戰場)에 나갈 때는 최소한 군마(軍馬)에게 먹이를 주고
말발굽을 손질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기에 종자를 데리고 나갔을 것이다.
쇠의 약점은 녹이므로 갑옷도 매일 닦고 기름치고 조여야했다.
그런데 철판을 연결한 가죽 끈은 기름에 절면 쉽게 약해진다.
그러니 갑옷은 상당히 섬세하게 손질하고 관리해야 했을 텐데,
사람 갑옷의 몇 배가 되는 말 갑옷까지 있었다.
중장기병의 단점은 기동력과 고비용이다.
말 갑옷의 무게만 40킬로그램이 넘으며, 병사의 무장도 20킬로그램은 족히 된다.
그래서 중장기병은 속도와 이동거리에 제한을 받는다.
특히 도주하는 적군을 추격할 때 낮은 기동력은 안타까운 단점이 된다.
전투에서 적군에게 최대한의 손상을 가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이 때이기 때문이다.
적에게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히면 전쟁은 그것으로 끝나지만
추격전의 기회를 놓치면 전력을 회복한 적군은 다시 공격해 올 것이다.
고비용과 전문성 때문에 중장기병은 병력 수에 제한을 받는다.
그래도 초원이라는 지리적 여건과 만주 일대의 풍부한 철광 덕분에 고구려를 비롯하여
북방의 기마민족은 중국에 비해 훨씬 많고 우수한 중장기병을 확보할 수 있었다.
기병의 중요한 역할은 수색·정찰·적진교란·적진돌파와 대형파괴 및 추격이다.
그런데 중장기병은 느려서 돌파와 대형파괴 이외의 항목에서는 효용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기병을 사용할 때는
중장기병과 장갑(裝甲)을 가볍게 한 경기병(輕騎兵)을 사용해야 효과적이다.
그런데 고구려군의 병종(兵種)에서 가장 애매모호한 부분이 이 경기병이다.
경기병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데, 이들의 실체가 분명하지 않다.
벽화에는 갑옷을 전혀 입지 않고, 말에는 화살만 장착한 기병도 등장하는데,
과연 전투 때에도 이런 무장과 장비로 참전했는지는 의문이다.
장창(長槍)을 든 경기병은 대동강 하구의 남포시에 있는 약수리 벽화에 등장한다.
장창을 든 경기병이 중장기병대의 앞에서 행군하는데,
장창에 군기(軍旗)가 달려있어 이들의 무장이 일반 무장 상태인지 의장대인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정통 기마민족의 후예로
수 백년 후에 세계를 정복하는 몽골 제국 군대의 경우도
그들의 자랑인 경기병대는 갑옷을 전혀 입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들의 주 임무가 사격이었기 때문이다.
최고의 기동력과 놀라운 궁술(弓術) 능력으로 그들은 중장기병의 돌격을 엄호하고,
적진을 초토화했다.
특히 적진의 측면과 후면으로 돌아서 날리는 화살은 적진을 교란하고
대형을 허무는 데에는 가공할 효력이 있었다.
그렇다면 고구려군의 경기병대 역시 갑옷을 입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다.
경기병의 약점은 백병전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다.
중장기병이든 보병이든 이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고,
괜히 공격하다간 화살세례를 받는다.
이들에 대한 화살 공격도 별로 유용하지는 않다.
장갑은 없지만 대신 피할 수 있는 능력이 극대화되어 있다.
원거리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이들을 화살로 맞추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더욱이 원거리 사격은 곡사이며, 화살의 위력은 급격히 떨어진다.
경기병의 진정한 약점은 백병전 중에서도 일부 상황 즉
적진돌파와 충격작전을 감행할 수 없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 임무는 중장기병만이 감당할 수 있었다.
안악 3호분 벽화 좌측상단과 하단에는 중장갑을 한 보병의 행렬이 있다.
갑옷은 기병과 마찬가지로 미늘갑옷인데, 소매가 반팔이고 상의만 입었다.
중장기병의 갑옷은 보병이 입기에는 너무 무겁기 때문이다.
그들은 한 사람의 몸을 겨우 가리는 가늘고 긴 방패와
갈고리 모양의 창인 예과(銳戈)로 무장했다.
보병 개개인의 전투력이 기병보다 떨어지고 기동력이 낮지만,
산악지형에 취약한 기병과는 달리 어떤 지형에서든 위력을 발휘한다.
중장보병(重裝步兵)의 밀집대형은 수비와 공격,
대보병전(對步兵戰)이나 대기병전(對騎兵戰) 어느 경우든 상당한 위력을 발휘한다.
잘 훈련된 밀집보병대는 중장기병도 함부로 돌파할 수 없다.
이들의 예과는 기병을 마상(馬上)에서 떨어뜨리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기병과 달리 보병은 무장과 무기의 종류가 다양하며
한 사람이 오직 한 가지 무기만 들었다.
그것은 갑옷과 무기가 부족하며, 걸어 다녀야 하는 보병의 특성상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무기를 착용하기가 곤란했던 탓도 있겠지만,
그만큼 보병의 역할이 세분화·전문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행렬도를 보면 행렬의 바깝 부분은 중장보병과 기병이 서고
안쪽과 후미에는 경보병과 경기병대가 선다.
이를 전투대형으로 즉 횡대로 환원하면
경보병(輕步兵)은 중장보병의 뒷 선에 배치한다는 뜻이 되겠다.
경보병대의 주력은 도끼를 멘 도부수(刀斧手)로서 갑옷을 전혀 걸치지 않았는데,
전투력과 신분이 낮다는 증거다.
그들은 길을 내거나 목책 혹은 녹각과 같은 방어기구를 설치할 때,
공성구(攻城具)를 만드는 사역(私役)에 동원된다.
그러나 이들의 무기인 무거운 도끼는 내려치는 힘이 매우 강해
투구를 쪼개고 미늘갑옷을 찢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이들은 중장보병의 이선에 서 있다가 갈고리 창에 걸려 넘어진 기병이나
부상으로 넘어진 중장보병을 공격했을 것이다.
어깨에 활을 메고, 허리에 전통(箭桶)을 찬 병사들은 바로 궁수(弓手)다.
동양에서 가장 유명했던 활은 동이족(東夷族)의 비밀병기 맥궁(貊弓)이었다.
기병용은 보통 80센티미터, 보병용은 120~127센티미터 정도였는데,
이 활은 작아서 다루기가 편리하며, 크기에 비해서 위력이 대단하다.
위력은 사수(射手)의 힘에 따라 큰 차이가 나지만
가까운 거리에서는 갑옷도 궤 뚫는다.
고구려의 용장 고노자(高奴子)가 293년 신성(新城)에서
모용외(慕容廆)의 군대를 격퇴할 때,
화살 한 발로 적병과 군마와 안장을 함께 궤 뚫었다고 한다.
궁수는 공격 때는 아군을 엄호하고, 수비 때는 돌격해 오는 적군을 공격한다.
특히 쳐들어오는 적군의 중장기병이나 보병을 저지하는 데는
궁수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적군이 원거리에 있을 때는 진형의 앞에 나가서 혹은 중장보병의 엄호를 받으면서
사격하고 적군이 접근하면 이선으로 후퇴하면서 사격한다.
공격군도 엄호사격을 받으면서 전진해 오므로
사격전에서 궁수를 보호하기 위해 이들에게도 갑옷을 입혔다.
단 사격을 해야 하므로 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이들의 갑옷은 반팔인 중장보병과 달리 팔이 아주 없다.
투구도 쓰지 않았는데, 이는 머리를 자유롭게 해서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인 듯하다.
투구는 무거워서 고개를 잘 돌리지 못하게 되고
시야도 가려 좌우의 시야를 좁히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4. 단재(丹齋)가 평가한 을지문덕(乙支文德)
고구려(高句麗)가 중원 통일제국인 수(隨)와의 전쟁에 승리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공헌을 했던 612년 살수대첩(薩水大捷)의 주역인 을지문덕(乙支文德)에 대해 역사인물평전(歷史人物評傳)을 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을지문덕의 출생지·성장 과정·부친이나 조부의 이름 등을 기록한 문헌은
현재 전하지 않는다.
김부식(金富軾)의『삼국사기(三國史記)』「열전(列傳)」에도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전개 과정이 전부이며,
그것도 중국 사서(史書)의 기록을 재편집한 것에 불과하다.
김부식은 신라중심사관(新羅中心史觀)으로『삼국사기』를 저술했기 때문에
고구려·백제 인물의「열전」은 너무 간략하게 서술하고 소흘히 다루었다.
을지문덕이 천수(天壽)를 누리고 죽었는지,
아니면 한창 일할 젊은 나이에 요절(夭折)한 건지 알 수는 없지만
그의 역사적 수명은 단 7개월에 불과하다.
을지문덕의 개인 사료는 사실상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그래서 을지문덕의 일대기를 책 한권으로 써서 펴낸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다.
글 쓰는 사람의 상상력을 더해 소설의 형식을 빌려 쓰지 않으면
을지문덕의 전기(傳記)는 도저히 나오지 않는다.
분명히 우리 민족의 역사에 실재했던 영웅인데도
마치 전설 속의 인물인 것처럼 우리에게서 멀어져만 가는 을지문덕!
그래도 그 어려움을 딛고
불가능에 가까운 그의 전기를 지어 세상에 발표했던 사람이 있었다.
단재(丹齋) 신채호(申采浩) 선생이
1908년에『을지문덕전(乙支文德傳)』을 탈고했던 것이다.
단재가 당시 만28세의 젊은 나이에 완성한『을지문덕전』을 읽어본
산강재(山康齋) 변영만(卞榮晩) 선생은
“이 책은 우리나라 출판서적계의 효시(嚆矢)다”고 극찬하였다.
산강재가
“무애생(無涯生)이 귀신을 울리고 신령을 불러오는 그의 필력(筆力)으로
경천동지(驚天動地)한 위인(偉人) 을지공(乙支公)의 수염과 눈썹을 그려내고
그 목소리와 안색까지 모두 생생하게 그려내었는바,
저 살수(薩水)에서의 전투는 더욱 생생하여 삼라만상은 모두 그 빛을 잃고
천지간의 모든 구멍에서는 귀신이 우는 소리를 지르는데,
내 그로 인하여 고개를 숙였고, 원기가 생겨났고, 미친 듯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고,
슬퍼 눈물을 흘렸는바,
나도 몰래 온갖 종류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서 뒤범벅이 되었다”
고 표현할 정도로 단재가 쓴『을지문덕전』은 전설 속의 인물로 뒤바뀐 을지문덕을
다시 역사속의 영웅으로 부활시킨 훌륭한 걸작이었다.
그러나 지금부터 약100년 전에 출간됐던 단재의『을지문덕전』은
강산이 수십 번도 더 바뀌는 세월이 흐르면서
어문교육의 변화로 오늘날에 청소년들이 이 책을 도저히 읽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현대적인 문장 구조로 고구려의 전쟁 영웅 을지문덕을 재해석한
21세기판『을지문덕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동북공정(東北工程)의 영향력이
우리나라의 미래에 심각한 파장을 몰고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더욱 그렇다.
그렇다면 어느 누구보다 을지문덕을 존경하고
그에 대해 집중적인 연구를 펼쳤던 단재는 을지문덕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
단재의『을지문덕전』은
“땅의 넓이는 그 십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고,
인구는 그 백 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는 고구려가 저 수나라를 대적하였으니,
그 기개는 비록 장하나 그 방도는 심히 위태로웠다.
그 당시에 ‘하루살이가 큰 나무를 흔들려한다’는
국외자(局外者)들의 비판을 면하기 어려웠을 텐데도,
을지공은 홀로 의연히 그러한 비판을 못 들은 척하고 적국에 대항하였으니,
과연 무엇을 믿고 그러하였던가?
말하자면, 오직 독립정신(獨立精神) 단한가지였다”면서
을지문덕을 자주의식(自主意識)의 상징적 인물로 표현하였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후세 사람들이 만약 그의 머리털 하나만큼만 닮더라도
그 나라의 독립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며,
그의 한두 마디의 말만 잘 거두어 간직하더라도
그 나라의 역사를 채워 넣을 수 있을 것이니,
을지문덕이란 사람은 우리 대동국(大東國) 4천년 역사에서 유일한 위인일 뿐만 아니라
또한 전 세계 각국에도 그 짝이 드물도다”
라고 칭송하면서 당시 대한제국이 일본 제국주의 세력의 침략으로
국체(國體)를 보존할 수 없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조선왕조 시대의 사대모화사상(事大慕華思想)에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단재에게 있어 을지문덕이란 역사인물은
민족자존(民族自存)과 독립정신(獨立精神)의 표상이었고, 신(神)과 같은 존재였으며,
일본인들이 한국에 대한 식민지화정책을 합리화하려고 내세운
한국인들의 타율적(他律的) 종속성(從屬性) 이론을 논파하는데
롤 모델이 되었던 것이다.
도산(島山) 안창호(安昌浩)는『을지문덕전』의 서문(序文)에서
“내가 해외 각국을 여행해보니,
그 나라 영웅이 칼을 휘두른 곳에서는 수십만의 사람들이 그를 노래하고,
그 영웅이 피를 흘린 곳에서는 수천만의 사람들이 춤을 추는데,
몸이 있는 자는 그 몸을 영웅에게 바치고,
재주가 있는 자는 그 재주를 영웅에게 바치며,
학문이 있는 자는 그 학문을 영웅에게 바쳐서
한 나라 전체가 영웅을 부르면서 같이 나아가기 때문에
영웅이 배출되어, 워싱턴 이후에도 허다(許多)한 워싱턴이 나왔고,
나폴레옹 이후에도 허다한 나폴레옹이 나왔던 것이다”
고 논술했다.
한때 대한자강회(大韓自强會)의 회원이었으나
1910년 경술병탄늑약(庚戌倂呑勒約) 이후
조선총독부 소속 판사로 재임했던 이기찬(李基燦)은
“을지문덕은 우리나라 4천년 역사상 제일가는 위인이니,
그 독립적 기상(氣象)과 건투정신(健鬪精神)은
실로 우리 민족의 대표적 인물이며 모범적 인물이다.
그러므로 을지문덕의 기풍(氣風)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의존심(依存心)이 강하던 자라도 반드시 자립(自立)하게 되며,
의욕을 상실하고 물러서려는 성격의 사람이라도
반드시 떨쳐 일어나 앞으로 나가려고 하게 된다”
고 높이 평가하였다.
제1차 여수전쟁(麗隋戰爭)이 벌어지던 598년 무렵
수(隨)의 인구는 890만호였으니 1호에 5명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4천 450만 명이다.
고구려(高句麗)가 멸망할 때 가구수가 69만호라고 하였으니 대략 345만 명이다.
이 수치로 대비하면 고구려의 인구가 수에 비해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경제 수준은 인구의 대비보다 더 큰 격차가 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을지문덕은 누가 보아도 패색(敗色)이 짙은 이 전쟁을
고구려의 승리로 이끌었다.
평범한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내지 못할 일이다.
그런데 김부식은 이 위대한 인물을 단지 중국의 사료만을 베껴서
『삼국사기』「열전」에 간략하게 기록해 놓았다.
신라의 김유신(金庾信)에 대해서는 세밀한 부분까지 자세히 기록하면서도
을지문덕은 살수대첩의 과정만 서술한 김부식의『삼국사기』편찬 방식은
당연히 단재에게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어떤 연구자들은 을지문덕이 장영실(蔣英實)처럼 귀족이 아니라
낮은 신분의 사람으로서 우연히 국왕의 눈에 띄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 출장입상(出將入相)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한다.
그의 내력은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도저히 접근할 수조차 없다.
5. 수(隨)문제(文帝)의 등극과 남북조시대(南北朝時代)의 통일
6세기말 중원 대륙은 여전히 남북조(南北朝)로 갈라져 있었는데,
북쪽에서는 유목민족인 돌궐(突厥)과 거란(契丹)이 세력을 떨치고 있었다.
고구려는 남북조의 국가들과 등거리 외교를 벌이고 유목민족들과 힘을 겨루며
옆구리에 붙어 있는 말갈(靺鞨)을 거느렸다.
동북아시아는 이때 팽팽한 세력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북주(北周)가 575년 북제(北齊)를 아우르고
중국의 북쪽지역을 거의 통일하였다.
북주의 개국공신(開國功臣)인 양충(楊忠)은
문제(文帝) 우문태(宇文泰)에게 공로를 인정받아
수국공(隨國公)이라는 공신 칭호를 받았고,
양충이 죽자 그의 첫째 아들인 양견(楊堅)이 작위를 이어받았다.
양견은 무장(武將)으로서 북주의 기반을 다지는 데에 수훈(殊勳)을 세우고
무제(武帝) 우문옹(宇文邕) 재위기에 자기 딸을 태자비(太子妃)로 들여앉혔다.
무제의 뒤를 이어 즉위한 양견의 사위인 선제(宣帝) 우문빈(宇文贇)은
용렬하고 어리석은 황제였기에 폭정을 일삼고
주지육림(酒池肉林)에 빠져 백성들의 원성을 샀다.
양견은 선제를 끼고 모든 권력을 휘어잡아 정사(政事)을 제멋대로 처리했다.
선제가 죽자 양견의 외손자인 정제(靜帝) 우문천(宇文闡)이 제위에 올랐다.
양견은 한 점 꺼릴 것 없이 국정을 장악하고 세력을 키워나갔다.
581년 2월 양견은 어린 정제를 협박하여 제위에서 물러나게 하고
스스로 황제가 되어 국호를 수(隋)로 정했다.
그가 제위에 오를 때 일부 반대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큰 어려움은 없었다.
그만큼 북주가 나약하였고,
양견이 오랫동안 자기 세력을 키우며 신망을 얻었기 때문이다.
수황(隨皇) 문제(文帝) 양견(楊堅)은 북주(北周)의 흔적을 싫어하여
북주의 수도(首都)였던 장안(長安)을 파괴해버렸다.
그리고 원래 위치를 약간 틀어서 새 수도를건설한 뒤
이름도 장안에서 대흥(大興)으로 바꾸었다.
문제는 부역을 감면하고 법령을 간소하게 만들었으며,
제도를 정비하는 등 선정을 베풀어 민심이 상당히 안정되었다.
그는 삼국시대(三國時代) 이후 약 400년 동안
온갖 부역과 형벌에 시달려온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다.
문제는 또 돌궐의 침략에 대비하여 북쪽의 장성을 수리하였다.
돌궐에서 내분이 일어나 585년에 동돌궐(東突厥)과 서돌궐(西突厥)로 분열되자
수는 서돌궐이 동돌궐을 공격하도록 부추겨 동돌궐을 굴복시켰다.
이제 강남에서 수(隨)와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왕조는 진(陳)뿐이었다.
문제가 대신들을 불러모아 진국(陳國)을 칠 대계를 의논하였다.
이에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 고경(高熲)이 이렇게 말했다.
“진국(陳國)을 치려면 먼저 진국이 저장해두고 있는 식량부터 없애버려야 합니다.
강남의 집과 식량창고들은 거의 참대나 볏짚으로 되어 있기에
불만 놓으면 잿더미가 될 것입니다.
식량이 떨어지면 그들이 어찌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벼 수확을 할 때 우리는 군사를 풀어 그들을 교란하고,
그들이 병력을 집중시키면 우리는 군사를 거두어들입니다.
몇 번만 이렇게 거듭한다면
그들은 우리가 진짜로 싸우려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방비를 늦추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기회를 봐서 장강(長江)을 돌파한다면
강남 땅의 절반은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 말을 듣고 몹시 기뻐하며 군사를 풀어 강남을 교란하도록 하는 한편,
개봉자사(開封刺史) 양소(楊素)에게 전쟁에 쓸 배를 정비하여
강을 건널 준비를 하라고 명령하였다.
이때 진국(陳國)의 군주인 후주(後主) 진숙보(陳叔寶)는
대대적으로 공사를 벌여 정자와 누각을 건축하고,
옥석으로 깐 층계와 황금으로 된 벽으로 궁전을 치장하고는
온종일 자기가 사랑하는 장귀비(張貴妃)·공귀빈(孔貴嬪)에게 파묻혀 지냈다.
그는 누런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담벼락을 둘러싸고 있는 꿈을 꾸었다.
그러자 사람들을 시켜 담벼락 부근의 귤나무들을 베어내게 하였다.
꿈에 여우를 보고는 요귀의 작당이 틀림없다고 하면서
자기가 절간의 노예로 팔려가는 광대극을 벌이고는 겨우 재앙을 면했다고 좋아했다.
588년 10월에 문제는 후주의 죄악을 낱낱이 폭로하는 조서(詔書)를 내리고
그것을 30만부나 베끼게 한 다음 강남의 여러 지방에 살포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인 진왕(晋王) 양광(楊廣)을 대원수(大元帥)로 임명해
50만 대군을 거느리고 진국(陳國)을 정벌하게 했다.
급보를 알리는 글이 눈송이처럼 건강(建康)에 날아들자
당황한 후주는 대신들을 모아놓고 대책을 의논했다.
도관상서(都官尙書) 공범(共犯)이 짐짓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다.
“장강은 예로부터 천연요새로 알려져 있으므로
날개가 돋치지 않는 한 수나라의 군사들이 이 강을 건널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변방을 지키고 있는 장령들이 상금을 타먹기 위해서
적국의 정세를 거짓으로 보고한 것이니,
그 몇 놈의 목을 잘라 버린다면 다시는 거짓말을 꾸며대지 못할 것입니다!”
미련한 후주는 공범의 말에 기가 살아나서
가슴을 쭉 내밀며 머리를 쳐들고 이렇게 말했다.
“그 말에 일리가 있구나!
건강은 자고로 제왕의 도읍이었으니
하늘의 명을 받고 황제가 된 짐(朕)은 두려울 게 없다.
이전에 북제(北齊)가 세 번이나 쳐들어왔으나 매번 패배했고
북주(北周)도 두 번이나 침입했으나 두 번 모두 실패했거늘
오늘 하잘것없는 양견이 다 무엇이냐!”
589년 정월이 되자 하약필(賀若弼)과 한금호(韓擒虎)가 인솔하는
수군(隨軍)의 선봉부대가 빠른 속도로 장강을 건너 건강성을 포위했다.
그 때 건강성에는 전투가 가능한 진국(陳國)의 병력이 10만 명이나 있었다.
게다가 성의 지세가 험준하여 조직력을 잘 정비하고 적극적으로 수비만 했다면
건강성은 적군에게 쉽사리 함락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적병들이 성 밑에 들이닥치자 후주는 눈물만 흘릴 뿐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했다.
이 때 표기장군(驃騎將軍) 소마가(蕭摩訶)가 수나라의 군사들이
발을 튼튼히 붙이기 전에 즉시 군대를 출동시켜 격퇴시켜야 한다고 제의했다.
<공범>도 후주에게
“신(臣)은 군대를 출동시켜 결전을 벌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싸움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청사(靑史)에 이름을 남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했다.
후주는 마침내 출전을 허락했고, 소마가는 중랑장(中郎將) 임충(任忠)과 함께
진군(陳軍)을 이끌고 성 밖에 나가 결전을 벌였다.
그러나 훈련이 제대로 안 된 진군(陳軍)의 병사들은 싸움이 시작되자마자
수군(隨軍)의 한 번 공격에 대열이 무너지며 꽁무니를 뺐다.
<임충>은 수장(隨將) <한금호>에게 투항하여
건강성의 정문인 주작문을 통과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진국(陳國)의 문무백관들은 저마다 꽁무니를 빼고
후주만은 여전히 궁전에 앉아 승리의 소식을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수군(隨軍)이 성 안으로 쳐들어온 것을 뒤늦게 알고 겁에 질려 보좌에서
뛰어내려 후당에 달려가 장귀비와 공귀빈의 손을 잡고 궁전에서 빠져 나가려고 했다.
그들이 경양전에 있는 말라 빠진 한 우물가에 이르렀을 때 앞에서 함성이 울려왔다.
더는 빠져나갈 길이 없다고 생각한 후주는
두 명의 첩과 함께 우물 속으로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월 스무 이튿날에 진왕 양광이 건강에 입성함으로써
진국(陳國)은 수국(隨國)의 침략을 받은 지 넉 달 만에 멸망하게 되었다.
문제(文帝) 양견(楊堅)은 검소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관중(關中)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겨에 콩가루를 섞어 먹는 것을 알고
황족 들 뿐만 아니라 대신들까지 재해가 끝날 때까지
술과 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엄명을 내렸다.
또 셋째 아들인 진왕(秦王) 양준(楊俊)이 수하의 사람을 사주하여 고리대를 놓게 하고
협잡을 일삼게 하여 많은 하급관리와 백성들의 재산을 탕진시키고,
궁전을 화려하게 지어 외국에서 공물로 바친 향료를 벽에 바르는가 하면
황금으로 층계를 장식하고 궁전의 벽마다 체경(體鏡)을 걸었으며,
수많은 미녀들을 불러 모아 황음무도(荒淫無道)한 생활을 즐기는 등
국법을 어기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사치스러운 행동을 일삼자
문제는 양준을 파직하고 감옥에 가두게 하여 음식도 대주지 못하게 했다.
대장군(大將軍) 유승(劉昇)과 상서우복야(尙書右僕射) 양소(楊素)가
양준의 죄를 사면해줄 것을 권유했으나 문제는 듣지 않았고
결국 양준은 병을 얻어 죽고 말았다.
문제는 진국(陳國)을 정벌할 때 얻은 전리품을
공로가 있는 신하들에게 나누어주지 않았고
진국(陳國)의 영토를 떼어 신하들에게 식읍(食邑)으로 주지도 않았으며
약탈도 금지시켰다.
진국(陳國)의 멸망으로 중원 천하는 이제 수국(隨國)의 것이 되었다.
백제(百濟)의 위덕왕(威德王)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수국(隨國)에 사신(使臣)을 보내 중원통일을 축하하고
고구려(高句麗)가 차지하고 있는 요동(遼東) 지역을 정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실에 대해 단재(丹齋) 신채호(申采浩)선생은
『을지문덕전(乙支文德傳)』제3장에서
“저 신라와 백제는 순망치한(脣亡齒寒)의 이치를 생각지도 않고
수국(隨國)에 고구려 침벌(侵伐)하기를 청하러 가는 사자(使者)가
길 위에 연속하였으며, 고구려의 동정을 염탐하는 간첩들이 사방에 늘어섰다.
아, 슬프다. 형제가 집안에서 다투다가 감정이 상하여
밖의 도적을 청해 와서 보복하려는 것은 진실로 더할 수 없이 애석한 일이다”
고 비판하였다.
그 무렵에 동돌궐의 한 세력인 계민가한(啓民可汗)이 수국(隨國)에 투항하여
문제(文帝)는 중국 북방의 초원지대도 자국의 세력권에 거의 편입시켰다.
이제 남은 것은 고구려였다.
문제는 동방의 맹주를 자처하고 있는 고구려를 복속시키지 않고서는
수국이 진정한 ‘천하의 중심’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고구려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킬 명분을 만들려고 골몰했다.
6. 영주(營州) 공격
홍양호(洪良浩:1724년~1802년)의『해동명장전(海東名將傳)』에는
저자가 평양에서 전해지는 전설(傳說)을 통해
을지문덕이 석다산(石多山)에서 수련했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다.
석다산에는 태학(太學)의 교수를 지내다가 은퇴하고
산 속에서 초막 한 채를 짓고 살아가던 나이 1백세가 넘은 학자이며 도인(道人)인
고박아당(高朴兒堂)이 있었다고 한다.
을지문덕은 고박아당을 찾아가 자신을 제자로 거두어주기를 간청했다.
그러나 고박아당은 자신이 곧 선계(仙界)로 들어가야 할 몸이기 때문에
속세(俗世)의 사람과 인연을 맺을 수 없다면서 거절했다.
그런데 어느 날,
좌정(坐定)한 채로 참선(參禪)에 들어간 고박아당은
자신도 모르게 속세의 경계를 넘어 선계의 아름다운 풍광을 보고 있었다.
뭉실하게 말린 잎들이 달린 가지를 사방으로 내뻗은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오색구름이 피어오르고 만 가지 꽃잎이 바람을 타고 흩날렸다.
어느새 은은한 달빛이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고, 그 틈에서 별들이 속삭이고 있었다.
서늘하면서도 따뜻한 기운이 좋아서 두 팔을 벌리고 있는데,
갑자기 사방이 깜깜해지더니 날개가 달린 커다란 말이 하늘을 유영해 갔다.
그 때 천마(天馬)의 뒤를 따라 오른손에는 깃발을 들고
왼손에는 화반(花盤)을 든 옥녀(玉女)들이 헤엄쳐 가는데,
그 모습을 보고 기분이 좋아진 고박아당은 바람을 타고 그녀들의 뒤를 따랐다.
그러나 갑자기 섭선(葉扇)을 든 선인(仙人) 하나가 나타나 그의 앞을 가로막으며,
“그대는 아직 속세에 있으니 이곳으로 들어올 수는 없으므로 어서 돌아가시오!”
라고 소리치며 섭선으로 고박아당을 내리쳤다.
고박아당은 크게 놀라 참선에서 깨어났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이 꿈을 꾼 것을 깨달았다.
고박아당은 초막 밖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던 을지문덕을 바라보며,
“내가 선계(仙界)에서 거부당한 이유는 아직 속세에서 할일이 남았기 때문이로구나”
하고 중얼거리고는 을지문덕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기로 하였다.
을지문덕은 꼬박 삼년 동안 석다산에서
고박아당으로부터 천문·지리·병법을 비롯한 학문과 무예를 배웠다.
고박아당의 해박한 지식과 깊이 있는 식견,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열정은
을지문덕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유능한 길잡이는 어떤 방향으로든 목적지를 찾아낼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순발력과 담력이 있었다.
을지문덕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스승의 가르침을 흡수해서 자신의 내면을 채웠다.
제자의 일취월장(日就月將)하는 모습은 어느새 스승의 삶에 활력소가 되고 있었다.
고박아당이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을지문덕은 어느새 약관의 청년이 되어 있었다.
그의 맑고 총기가 흐르는 눈에는 나이답지 않은 진중함이 서렸고,
행동거지에 기품(氣品)과 절도(節度)가 풍겼다.
고박아당은 을지문덕에게
“이제 네가 세상으로 나갈 때가 된 듯하구나.
이제 당대에 너를 능가할 자는 없도다.
네가 칼을 들면 군사들이 힘을 얻을 테고,
네가 붓을 들면 온 백성이 편안해지리라”
면서 자신이 태학에서가르침을 주었던 국내성주(國內城主) 환당(桓堂)에게
을지문덕을 천거하는 서찰을 써 주었다.
고박아당이 홀연히 사라진 뒤 을지문덕은 스승의 명을 받들어 국내성으로 갔다.
국내성주 <환당>은 을지문덕을 보자 한눈에 반해 버렸다.
환당은 을지문덕을 파격적으로 자신의 부관으로 삼았다.
을지문덕은 환당의 휘하에서 국내성의 치안을 유지하고 민생을 살피는 일을 맡았다.
을지문덕은 모든 일들을 추호도 사심없이
공명정대(公明正大)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의 칭송이 자자해지자,
환당은 태왕에게 품의(稟議)하여 그에게 소형(小兄)의 관급(官級)을 받게 했다.
이로써 을지문덕은 본격적으로 관로에 발을 들여 놓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왕명을 받고 변경 순시에 나선 병마원수(兵馬元帥) 강이식(姜以式)이
잠시 국내성에 들렀다.
환당은 강이식이 국내성에 머무는 동안 을지문덕으로 하여금 그를 보좌하게 하였다.
강이식은 을지문덕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가 병법과 전략에 능통한 인재라는 것을 한 눈에 알아보았다.
강이식은 을지문덕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기로 결심했다.
590년 수황(隨皇) 문제(文帝) 양견(楊堅)은
문하성(門下省) 판관(判官) 소적기(邵積基)를 고구려의 평양성(平壤城)으로 보내
영양태왕(嬰陽太王)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국서(國書)를 전하게 했다.
‘짐(朕)이 천명(天命)을 받아 온 천하를 사랑하고 기르는 가운데,
고구려왕(高句麗王)에게는 바다 한편 구석을 맡겨서 조정의 교화를 선양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저마다의 뜻을 이루게 하였다.
태부(太府)의 공인(工人)은 그 수가 적지 않으니,
고구려왕이 정녕 필요하다면 짐에게 요구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몰래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익으로 노수(弩手)를 움직여 사사로이 데리고 달아났다.
이 어찌 병기(兵器)를 수리하려는 의욕이
밖으로 소문이 날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훔친 것이 아니라 하겠는가?
때때로 사자(使者)를 보내어 번국(蕃國)을 위무한 것은
본래 그대들의 인정(人情)을 살펴 정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자 함이었다.
그런데 왕(王)은 사자를 텅 빈 빈관(賓館)에 앉혀 두고는
삼엄한 경계를 통해 눈과 귀를 막아 듣고 보지 못하게 했다.
무슨 음흉한 계획이 있기에 남에게 알리기를 꺼리고
관리를 막으면서까지 그 살핌을 두려워하는가?
또한 자주 기마병(騎馬兵)을 보내 변경 사람을 살해하고,
여러 차례 간계를 부려 사설(邪說)을 지어 냈으니,
애초부터 사신을 영접할 마음이 없었도다.
왕은 요수(遼水)의 폭이 장강(長江)과 견줘 어떠하며,
고구려(高句麗)의 인구가 진(陳)과 비교하여 어떠하다고 생각하는가?
짐이 만약 품어 기르려 하지 않고 왕의 지난 허물을 문책하려 했다면
한 명의 장수(將帥)에게 명하면 그만이지, 어찌 많은 힘이 필요하겠는가?
다만 고구려왕이 스스로 깨우쳐 새로워지길 간절히 바랄 뿐이니,
마땅히 짐의 뜻을 알아서 스스로 많은 복을 구하라.”
이 국서에는 문제의 자기 과신과 공갈과 회유가 어우러져 있다.
문제는 이 글에서 고구려(高句麗)가 수국(隨國)에게 저지른 죄를
몇 가지로 나누어 질책하고 있다.
첫째는 고구려가 말갈(靺鞨)과 거란(契丹) 등 여러 부족을 핍박하여
그들이 수국에 귀복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고구려에서 말과 수레를 준비하는 데에 많은 기술자를 투입하고 있는데
왜 실정을 보고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셋째는 지난날 몰래 재물을 풀어서
쇠뇌를 제작하는 전문가를 데리고 간 일을 꾸짖었다.
넷째는 수국에서 온 사신을 빈 관사에 앉혀놓고 꼼짝도 못하게 하여
아무런 사정도살피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다섯째는 군사를 풀어서 수국 변방의 사람들을 죽이고
외국인을 고용하여 유언비어(流言蜚語)를 퍼뜨렸다는 것이다.
여섯째는 첩자를 수국에 보내 몰래 정보를 수집했다는 것이다.
문제가 고구려 측에 보낸 국서를 보면
고구려는 겉으로는 사신를 보내 수국과 우호관계를 맺으려 했으면서도
끊임없이 전쟁준비를 서둘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수국의 사신이 왔을 때 고구려의 실정을 하나도 알아내지 못하게 통제하였고,
또 수국에 첩자를 보내 사정을 알아보고 그 쪽의 무기 기술자를 빼내오기도 하면서
때로는 변방지대에 들어가서 교란작전을 폈다는 사실도 드러난다.
고구려는 결코 만만하게 심복하지 않으면서 수국을 상대로 일전을 벌일 작정이었다.
고구려는 단독으로 일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말갈·거란과의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진행시키려 하였고
돌궐까지 끌어들이려는 계획을 세웠다.
수국에서 안하무인(眼下無人)격으로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자
영양태왕은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당장 무례한 국서를 가지고 온 수국의 사신을 끌고 나가
목을 베라는 명령이 떨어질 듯했지만
영왕태왕은 일단 문하성 판관 소적기를 객관으로 안내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곧바로 편전(便殿)에서 어전회의(御前會議)를 열었다.
“수주(隨主) 양견(楊堅)이 이렇게 불손한 내용의 국서를 보낸 것은
아국(我國)에 대한 선전포고(宣戰布告)라고 생각하오.
짐은 서토(西土)와의 전쟁이 곧 임박하였다고 생각하는데
경들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시오.”
그러자 영양태왕의 아우이자 수군원수(水軍元帥)를 역임하고 있는
태제(太弟) 고건무(高建武)가 반열에서 나와 태왕에게 읍하며 아뢰었다.
“수국(隨國)은 진국(陳國)을 멸망시키고 중원을 통일했을 뿐 아니라,
돌궐(突厥)까지 굴복시켜 자못 기세가 대단합니다.
정면으로 부딪친다면 이긴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안국병법(安國兵法)에 이르기를,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비록 수주의 국서가 모욕적이긴 하지만 사직과 백성의 안위를 생각한다면
그들을 달래어 화평을 유지해야 합니다.
저들도 오랜 전쟁으로 인해 지쳤을 터이니,
섣불리 새로운 전쟁을 일으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일단 수국의 사신을 돌려보내어 저들이 쳐들어 올 빌미를 없애십시오.
다만 용간(用間)의 죄는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
수사(隨使)의 수행원 한두 명을 참수(斬首)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으면 될 것입니다.”
병마원수(兵馬元帥) 강이식(姜以式)은 태제의 소심한 의견을 반박하고 나섰다.
“추모성왕(鄒牟聖王)께서 나라를 세우신 이래로,
우리 고구려의 무사들은 적을 앞에 두고 물러난 일이 없습니다.
또한 광개토태왕(廣開土太王)께서 사방의 못된 무리들을 물리치신 이후로
고구려라는 이름은 천하 만백성들에게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헌데 이제 와서 무엇을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이런 오만무례한 글은 붓으로 화답할 것이 아니라 칼로 화답해야 할 것입니다.”
강이식의 불꽃 같은 기상이 편전 안을 압도하고 있었다.
영양태왕은 강이식의 주장에 공감하며 이렇게 말했다.
“짐의 생각 또한 강원수와 다르지 않소.
짐은 이 자리에서 수국과의 전쟁을 선포하겠소.”
영양태왕이 단호히 결단을 내리자 그 누구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어전회의가 끝난 뒤에 영양태왕은 강이식을 따로 불러 독대했다.
“수국과의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강 원수의 구상은 무엇입니까?”
태왕의 질문에 강이식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그는 이미 전쟁에 대비해 여러 계책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저들에게 우리 고구려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먼저 객관에 머물고 있는 수국의 사신을 곧바로 본국으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러면 저들은 분명 우리를 얕잡아보고 방비를 소흘히 할 것입니다.
그때 폐하께서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요서의 영주를 공격하십시오.
이는 바로 오만한 국서에 대한 화답(和答)이자 선전포고가 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기선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강이식은 개전(開戰)이후의 계책까지 상세히 아뢰었다.
이를 들은 영양태왕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었다.
“강 원수의 말씀대로만 된다면 수국은 결코 우리 군대를 당해낼 수 없을 것이오.”
영양태왕은 강이식을 믿었다.
병마원수(兵馬元帥) 강이식(姜以式)은
국내성(國內城)에 있던 을지문덕(乙支文德)을 불러
함께 서북변의 방비태세를 살펴본 뒤 그를 데리고 궁궐에 들어갔다.
편전(便殿)에 들어가 영양태왕(嬰陽太王)을 알현한 강이식은
태왕에게 을지문덕을 소개했다.
“폐하, 여기 이 청년은 국내성에서 소형으로 재직하는 을지문덕이라고 합니다.
아직 젊은 나이지만 폭넓은 시야와 사물을 궤 뚫어 보는 통찰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폐하께서 곁에 두시고 중용하신다면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울 만한 인재입니다.”
영양태왕이 을지문덕을 유심히 살펴보니
훤칠한 키에 번뜩이는 까만 눈이 인상적이었고,
긴 눈썹이 학자와 같은 인상을 풍기게 하는 훤칠한 미장부(美丈夫)였다.
태왕은 을지문덕을 시험해 보고 싶었다.
그래서 그를 그윽히 바라보며 이렇게 물었다.
“많은 대신들이 여전히 수나라와 전쟁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이에 을지문덕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다.
“소신이 이미 접수한 정보에 의하면
수국(隨國)은 이번에 우리나라에 사신을 보내기 전에
이미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산동(山東)의 내주(來州)에서는 병선(兵船)의 건조가 마무리되었고,
장안(長安)과 탁현(琢縣)의 군기고(軍器庫)에는 신병기들이 가득 쌓여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한다 한들,
저들은 무슨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에 대한 대비를 소흘히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전쟁이라면 반드시 싸워 이겨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영양태왕의 곁에서 시립하고 있던 고건무(高建武)가
서슬 푸르게 을지문덕을 꾸짖었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얕은 생각을 떠벌린단 말이냐?
아직 백제와 신라의 위협이 가시지 않은 마당에 수나라의 대군을 상대할 수는 없다.
먼저 수나라와 화친을 하여 서변을 안정시킨 다음에 남방을 제압하는 것이 상책이다.”
고건무는 태왕이 자신보다 강이식을 신임하는 것이 못마땅한 참이었기에
이름도 들어 보지 못한 애송이가 나서서 잘난 체하는 꼴을 두고 보지 못했다.
하지만 고건무의 꾸지람을 듣고도 을지문덕은 미동조차 하지 않고
대담하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다.
“나제동맹(羅濟同盟)이 깨진 이후로 신라와 백제는 서로 반목하느라
미처 북방으로 눈을 돌릴 겨를이 없습니다.
신라는 예전 진흥왕(眞興王)이 통치하던 시절이나 흥(興)하였지,
지금은 간신히 명맥이나 유지하는 정도가 아닙니까?
백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들은 한쪽이 올라서려 하면
다른 쪽에서 다리를 잡아끌어 주저앉히고 있습니다.
사신을 보내어 경쟁을 부추긴다면 서로 견제하느라
우리 국경을 침입해 오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수나라의 군사들은 여러 차례의 전쟁으로 지친 상태이며
주변 이민족들의 침입에도 대항해야 하므로
실제로 가용(可用)할 수 있는 병력은 그리 많지 않으니
우리가 정예병으로 적의 전진기지를 공격하여 기선을 제압하고,
서변의 굳건한 성에 의지하여 승부를 겨룬다면
우리가 승리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건무는 을지문덕의 명철한 안목에 말문이 막혔다.
영양태왕은 이를 지켜보다가 유쾌하게 웃음을 터뜨리고는 을지문덕을 가리키며
“마치 을파소(乙巴素)가 환생한 것 같구나” 하고 칭찬하였다.
서력 598년 정월(正月) 고구려(高句麗) 영양태왕(嬰陽太王)은
어영전대장(御營全隊長) 모달(模達) 유여(柳呂)와
소형(小兄) 을지문덕(乙支文德)을 대동하여
휘하에 근위병 삼백명 만을 거느리고 요동 순행(巡幸)에 나섰다.
이때,
주위에는 변방 지역의 민심을 둘러보고 백성들을 위무하기 위한 출행이라 밝혔지만
실은 수국(隨國)이 은근 슬쩍 차지하고 있는 영주(營州)를 공격하기 위해서였다.
영양태왕은 수군(隨軍)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오골성(烏骨城)·건안성(建安城)·안시성(安市城)·요동성(遼東城)·백암성(白巖城) 등을
차례로 방문하여 군민(軍民)들을 격려하고 변경 방비의 상황을 직접 점검하였다.
태왕을 친견(親見)할 기회를 갖게 된 성민(城民)들은
영양태왕의 관심과 격려에 감복하여 태왕의 은덕을 찬양하고 충성을 맹세하였다.
태왕의 행차는 평양성(平壤城)을 출발하여 개모성(蓋牟城)에 도착하였다.
개모성에는 말갈(靺鞨) 경기병을 거느린 막리지(莫離支) 연자유(淵子遊)와
평원태왕(平原太王) 재위기에 고구려 최고의 용장(勇將)으로 이름을 날렸던
온달(溫達)의 아들인 북군총병관(北軍總兵管) 대모달(大模達) 온준(溫俊),
그리고 모달(模達) 재증협무(再曾協武)와 말객(末客) 어사곤(於使困) 등
여러 장수들이 이미 도착해서 태왕의 행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개모성주(蓋牟城主) 모달(模達) 손자연(孫子然)의 영접을 받고
성 안으로 들어선 영양태왕은
성청(城廳)에 들어가자마자 자신의 충직한 심복인 연자유를 먼저 찾았다.
연자유는 그동안 태왕의 밀명을 받고 신성(新城)에서 말갈인(靺鞨人)들을 끌어 모아
최강의 경기병으로 조련시키고 있었다.
말갈 경기병의 전력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올랐다는 보고를 전해들은 영양태왕은
연자유의 노고를 크게 치하하였다.
이튿날에 국조(國祖)인 추모성왕(鄒牟聖王)에게 출정을 알리고
승리를 기원하는 천제(天祭)를 올린 영양태왕은 군사들을 사열한 후에 결의를 다졌다.
“이번 영주부에 대한 선제공격을 시작으로 우리는 수국과 전면전을 펼치게 된다.
저들의 오만한 태도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우리 조상들의 위업(偉業)에 누를 끼치는부끄러운 일이다.
이번에야말로 고구려의 기상과 용맹을 드러내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다는 진리를 알게 해주리라.
자랑스러운 용사들이여! 그대들에게 추모성왕의 가호가 있을지어다.”
군사들의 함성소리와 발 구르는 소리에 개모성이 들썩거렸다.
영양태왕은 연자유가 인솔하는 말갈 기병들을 선봉으로 삼아
영주부로 호호탕탕 쳐들어갔다.
본디 요하(遼河) 서쪽 일대는 고구려와 중원 왕조들 사이에 충돌이 잦았던 곳이었다.
광개토태왕(廣開土太王)대에 와서 고구려가 이곳을 평정했지만
북연(北燕)의 멸망 이후에는
중원 왕조가 잠시 영주 인근까지 세력을 뻗치기도 했다.
그 후, 고구려는 지속적인 서진정책(西進政策)을 펼침으로써 이들을 몰아냈다.
그런데 북주(北周)의 뒤를 이어 수국(隨國)이 들어서자
요서(遼西) 지역은 다시 양대 세력간 분쟁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문제(文帝)는 용성에 영주부(營州府)를 두고 군대를 주둔시켜
틈틈이 거란족을 포섭하려고 하였다.
영양태왕 입장에서는 요서 지역에서의 힘의 우위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수국이 점령하고 있는 용성을 제압해야 했다.
영주도독(營州都督) 위충(韋沖)은
고구려군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놀랐다.
고구려의 선제공격은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영주부의 군사들은 수국의 동북방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군량창고를 건설하는 일을 담당했기에 제대로 전투 훈련을 받지 못했다.
게다가 오랫동안 전쟁을 치르지 않았기에 군기가 흐트러져 있었다.
그르므로 병력은 7만여 명 정도 되었지만 오합지졸(烏合之卒)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군인으로서 자국의 영토에 외국의 군대가 침범하는 것을
그대로 방관할 수는 없는 일이었기에 위충은 부하들에게 출병을 명했다.
고구려군은 북소리에 맞추어 성(城)을 향해 조금씩 다가서고 있었다.
고구려의 선두에 선 장수가 앞으로 나서며 외쳤다.
“나는 대고구려의 막리지 연자유다! 이곳은 본디 우리의 땅이거늘,
어찌 무단으로 들어와 점거하였는가?
폐하께서 직접 이를 심문하고자 오셨으니 어서 성문을 열고 영접하도록 하라.”
고구려의 국왕이 친히 왕림(枉臨)했다는 말에 위충은 기겁을 했다.
고구려왕이 나섰다는 것은 최소한 오만 이상의 정예군이 움직였다는 의미였다.
예상했던 일 가운데 최악이었다.
그러나 영주부의 군사들도 만만치 않은 수효였기에
전의(戰意)만 상실하지 않는다면 해볼만한 싸움이라고 생각되었다.
위충은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려 군사들을 인솔하여 성문을 열고 달려 나갔다.
이제는 고구려 장수의 말이 허풍이기를 바랄 뿐이었다.
이때 고구려군 진영에서 다시 북소리가 울리며 오색의 깃발이 펄럭였다.
그러자 방진(方陳)을 취하고 있던 고구려의 군진이 다섯 대로 나누어지더니
순식간에 다섯 개의 대열로 변했다.
성 밖으로 나가 군사들을 도열시킨 위충은
고구려군의 일사분란한 움직임을 보고 정신이 아득해졌다.
정신을 가다듬고 자세히 살피니
고구려군은 대별로 각기 다른 색의 천을 허리에 두르고 있었다.
고구려군 진영의 중앙에서 흑색 깃발이 나부끼자
흑색 띠를 두른 선봉군이 일제히 말을 제쳐 수군의 진영으로 내달렸다.
연자유가 지휘하는 흑기군(黑旗軍)이 수군의 진영을 돌파하니,
순식간에 수군의 대열이 둘로 쪼개졌다.
다시 고구려군의 진영에서 백색 깃발과 청색 깃발이 동시에 흔들리자
좌군과 우군이 일시에 양쪽 측면에서 수군을 공격해 들어갔다.
고구려군의 빠른 공격이 계속되자
위충의 군사들은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고 갈팡질팡했다.
비록 수효는 수군이 월등히 많았지만
이미 사분오열(四分五裂)한 상태에서는 수적 우위가 힘을 발휘할 수 없었다.
뒤이어 홍색 깃발과 황색깃발이 동시에 흔들리니
영양태왕이 직접 지휘하는 중군이 마치 태풍과 같은 기세로 돌격해왔다.
고구려의 기병들이 진영을 종횡무진(縱橫無盡) 누비는 가운데
수군(隨軍) 병사들은 점점 싸움에 자신감을 잃었다.
북소리가 그치고 겨우 정신을 수습한 위충은
자신이 이미 고구려의 군사들에게 포위되었음을 깨달았다.
마상(馬上)에서 궁시(弓矢)를 들고 수군(隨軍)을 에워싸고 있는
고구려의 군사들 사이로 영양태왕이 모습을 나타냈다.
“너희 수주(隨主)가 보낸 국서에 대한 우리의 답이다.
목숨은 살려 줄 테니 장안으로 돌아가 양견(楊堅)에게
‘사직(社稷)을 보전하려거든 경거망동(輕擧妄動)하지 말라’고 전하라.”
위충은 오금이 저려서 간신히 고개만 숙였을 뿐
입 밖으로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다.
다시 북소리가 울리며 고구려 군사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자
위충은 마침내 큰 한숨을 토해 냈다.
사상자를 살펴보니 겨우 1백여 명에 지나지 않았다.
철저히 농락당한 것이었다.
고구려군은 영주부를 함락시키러 온 것이 아니었다.
힘의 차이를 확인시켜 영주를 지키고 있는 수군들에게
고구려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해 왔을 뿐이었다.
전쟁에서는 공포심을 갖게 하는 것이 적군을 죽이는 것보다 효과적일 수 있었다.
영주에서 한바탕 무력시위(武力示威)가 끝난 후,
군사를 수습하여 도성으로 귀환 길에 오른 영양태왕은
본격적인 전쟁에 앞서 을지문덕에게 북방의 동요에 대비하도록 하는 임무를 맡겼다.
태왕은 주변정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기에
을지문덕의 역할이 전쟁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었다.
“을지문덕을 제형(諸兄)의 관등으로 승급(昇級)시키고
부여성(扶餘城)의 성주로 임명할 것이니
수주가 말갈이나 실위(室韋)를 부추겨 우리의 후방을 교란하지 못하도록 하라.”
을지문덕은 태왕의 명령을 받고 편전을 물러나와
그 즉시 부임지로 떠나려고 길을 재촉했다.
7. 고구려로 진격하는 수나라의 30만 대군
고구려의 국왕이 직접 1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영주(營州)를 선제 공격했다는 보고를 받은 수황(隨皇) 문제(文帝) 양견(楊堅)은
이를 수국(隨國)의 주권과 자신의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간주했다.
사백여년간의 분열과 갈등을 겪었던 중원을 힘들게 통일시키고
질서와 권위를 찾았기에 이를 다시 잃고 싶지는 않았다.
중원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고구려(高句麗)와 같은 강국은
애초부터 꺾어두어야만 했다.
그래야만 훗날 수국이 자손만대까지 번창할 수 있었다.
때마침 고구려를 침공할 명분을 찾고 있었던 문제는
고구려 측의 영주부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좋은 기회로 여기고
고구려정벌을 위한 거병(擧兵)을 단행하였다.
“고구려가 감히 천자국(天子國)을 거역하니 이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
당장 군사들을 집결시키고 출진을 준비토록 하라.
한왕(漢王) 양량(楊諒)은 이번 원정의 지휘를 맡고
왕세적(王世績) 장군은 그를 보필하라.”
문제는 양량과 왕세적에게 30만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임유관(臨渝關)을 거쳐 요동으로 나아가라고 지시했다.
또 수군총관(水軍總管)의 자격으로 강남의 수군을 모아서 조련하는 임무를 맡았던
주라후(周羅候)를 편전(便殿)으로 불러 비사성(卑沙城) 쪽으로 방향을 잡고
항해하는 척 하다가 곧바로 고구려의 패수구로 향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첩자들로부터 수군(隨軍)의 동향이 속속 보고되자,
고구려의 요동성(遼東城)에서는
병마원수(兵馬元帥) 강이식(姜以式)의 주도하에 전략회의가 열렸다.
강이식의 직책인 병마원수는 오늘날의 육군참모총장과 같은 것이었다.
강이식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첩보에 의하면 수나라의 군사들이 수륙 양면으로 진군하고 있다 하오.
한왕 양량과 왕세적이 이끄는 30만의 육군은 임유관으로 향하고 있고,
주라후가 이끄는 5만의 수군은 산동의 동래(東萊)에서 출항을 준비하고 있다 하오.
그렇다면 그들의 목표는 분명 요동성과 비사성일 것이오.
두 성의 성주(城主)들은 특히 이에 대비함에 있어서 소흘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오.”
요동성주(遼東城主) 대모달(大模達) 이중손(李重孫)이
호언장담(豪言壯談)하고 나섰다.
“아무리 대군이 쳐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성들은 높고 견고하여 쉽게 함락시킬 수 없습니다.
더구나 성(城)끼리 긴밀하게 연계하면
저들을 궁지에 몰아넣는 일도 그리 어렵지 않소이다.”
이중손의 말에 다른 성주들 또한 동의를 아끼지 않았다.
강이식은 좌중을 진정시키고 다시 말을 이었다.
“양량은 수주(隨主)가 아끼는 왕자이기는 하지만 출전 경험이 없을 뿐 아니라
성미가 급하고 독단적인 인물이오.
그러니 양량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이오.
문제는 그를 보좌하고 있는 왕세적이란 자요.
그는 수나라를 대표하는 명장으로
진(陳)을 정벌하는 데 많은 공(功)을 세웠던 인물이니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오.
하지만 왕세적이 아무리 지략이 출중하다고 해도
요택(遼澤)을 무사히 빠져나오기는 어려울 것이오.
곧 장마가 닥쳐서 요택이 진창길이 되면
그들은 별 수 없이 자멸(自滅)의 운명을 맞게 될 것이오.
오히려 걱정이 되는 쪽은 주라후가 이끈 수군이외다.”
이에 비사성주(卑沙城主) 제형(諸兄) 길정충(吉定忠)이
위풍당당(威風堂堂)하게 말했다.
“비사성은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조련해온 막강한 수군(水軍)이 물샐 틈 없이 지킬 뿐 아니라
저의 군사들 또한 모두 일당백의 용사들이니
저들의 침입을 추호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꼭 비사성으로 올지는 모르는 일이오.
수주는 지략이 뛰어난 인물이니 필시 다른 꿍꿍이가 있을지도 모르오.”
길정충이 궁금해서 강이식에게 물었다.
“다른 꿍꿍이라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수군(隨軍)이 비사성을 노린다는 소문이 퍼지면
우리의 수군(水軍)이 비사성 앞으로 집결할 것이 아니오?
그때 적군은 비사성을 치는 척하다가
슬쩍 뱃머리를 돌려 곧바로 패수구로 진격할 수도 있지 않겠소?
그러면 우리로서는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니 쉽게 당할 수밖에 없소이다.”
막리지(莫離支) 연자유(淵子遊)가 고개를 끄덕였다.
“원수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비사성이 아니라 직접 평양성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저들의 수군력이라면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또한 충분히 대비하고 있는 일이니 그리 걱정하실 것은 없겠습니다.”
강이식이 껄껄 웃으며 말했다.
“전쟁에 임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오.
좌우간 평양에 파발을 넣어 폐하께 예상되는 적군의 진격로를 품하겠소.”
연자유가 활짝 웃으며 강이식에게 말했다.
“과연 강 원수께서는 빈틈이 없으시구려.”
강이식은 겸손하게 대답했다.
“나의 신조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된다는 것이오.”
연자유는 신이 나서 자신이 생각했던 전략을 풀어놓았다.
“그렇다면 수나라의 육군(陸軍)에 대한 대비를 먼저 세워야겠소.
나는 이대로 적을 기다리느니 차라리 먼저 선제공격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오.”
“그렇다면 유성에 주둔한 영주부의 군사를 다시 치시겠다는 말입니까?”
강이식은 연자유의 의도를 간파하고 있었다.
연자유는 새삼 강이식의 뛰어난 통찰력에 감탄했다.
“그렇소.”
“그 일은 폐하께 재가를 얻어야 할 일입니다. 차후에 의논하도록 합시다.”
언제나 명쾌한 강이식답지 않게 석연치 않은 대답이었다.
이미 태왕으로부터 전권(全權)을 위임받은 입장이었으므로
강이식의 머뭇거림은 더욱 의아하게 여겨졌다.
“그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소.
각자 맡은 바 위치로 돌아가서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오.”
이때 강이식은 연자유를 향해 남아 있으라는 눈짓을 보냈다.
이를 알아차린 연자유는 다른 사람들이 다 나간 후에도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자, 연자유가 다그치듯이 물었다.
“원수님께서 저에게 무슨 할 말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막리지께서 영주부에 대해 복안(腹案)이 있으신 것 같아서 이리 따로 모셨습니다.”
“영주부 문제는 강원수가 폐하께 재가를 받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단지 다른 사람들의 이목(耳目)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번 작전에 있어서는 보안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연자유는 그제야 강이식의 의도를 파악하고 자신의 계책을 털어놓았다.
“내가 지난날 폐하를 모시고 영주부의 유성을 쳤을 때
적과 혼전을 치르는 와중에 수나라 군사로 위장한 수십 명의 첩자를 침투시켜 두었소.
그들은 지금까지도 유성에 머물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유언비어(流言蜚語)를 퍼뜨려 성을 수비하는 적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소.
이번에 내가 휘하의 경기병을 이끌고 유성으로 달려가 그들과 내통한다면
힘들이지 않고 성을 빼앗을 수 있소.”
“막리지의 용의주도(用意周到)함에는 나도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내일이라도 당장 유성으로 가십시오.
나는 그저 막리지의 승전보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강이식은 진심으로 연자유에게 존경의 뜻을 표했다.
연자유는 뛰어난 지략가인 강이식에게 인정을 받으니 기분이 한없이 유쾌했다.
다음날 연자유는 자신의 휘하 군사들을 이끌고 요동성을 떠났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자유가 신성(新城)으로 돌아간다고 여겼다.
고구려의 영주(營州) 공략 작전은 그만큼 극비리에 수행되었다.
강이식은 연자유의 불같이 급한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에
혹시나 일을 그르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그가 떠나기 전에 이렇게 신신당부(申申當付)했다.
“왕세적은 백전노장으로 노련하고 간계가 뛰어난 자입니다.
우리가 유성을 점령하면 한왕 양량은
분명 왕세적을 유성으로 보내 공격해 올 것입니다.
유성을 탈환하면 지키기만 하고 절대 성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왕세적이 화를 돋운다 해도 절대 말려들지 마십시오.
막리지의 임무는 성을 지킴으로써
수군의 진군 속도를 늦추는 일이라는 것을 부디 명심하십시오.”
요동성을 출발한 연자유의 기마병들은 무서운 속도로 유성으로 달렸다.
상대의 허를 찌르기 위해서는 한시도 지체할 수 없었다.
닷새 만에 유성에 이른 연자유는
성에서 동쪽으로 십여 리 떨어진 곳에 진영을 만들었다.
이를 보고 놀란 영주부의 수국 군사들이 성문을 굳게 닫고 움직이지 않자,
연자유 역시 진영에 눌러 앉았다.
연자유가 적을 눈앞에 두고도 관망만 하고 있자, 부하 장수들은 모두 의아하게 여겼다.
평소 연자유의 급한 성격을 생각하면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었다.
보다 못한 모달(模達) 재증협무(再曾協武)가 연자유의 막사로 찾아갔다.
“저들은 구원군이 당도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첩보에 의하면 탁군(琢郡)을 떠난 수나라의 군사들이 이미 당하를 건넜다고 합니다.
이런 마당에 시간을 끄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 불리합니다.
수나라의 구원군이 당도하기 전에 총력을 기울여 성을 함락시켜야 합니다.
제가 선봉에 서서 성을 공격하겠습니다.”
혈기왕성한 재증협무가 공을 세우고 싶은 욕심에 공격을 재촉했지만
연자유는 여전히 여유로웠다.
“염려하지 마라. 오늘밤 네가 원 없이 활약할 무대가 준비되어 있으니.”
어둠이 소리 없이 찾아들었다.
연자유는 재증협무를 비롯한 부하 장수들을 불러 모았다.
“때가 왔다. 유성은 오늘 밤 우리의 수중에 들어올 것이다.
성 안에서 불길이 오르면 즉시 성문을 향해 달리도록 하라.
우리를 위해서 성문이 열리리라.”
장수들은 영문을 몰라 서로의 얼굴만 빤히 쳐다볼 뿐이었다.
이때서야 연자유는 수십 명의 첩자들이 성안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그들이 오늘 성안에 불을 놓고 성문을 열기로 했다는 사실도 알려 주었다.
재증협무를 비롯한 장수들은 그제야 얼굴이 밝아졌다.
사흘 동안 고구려군이 움직이지 않자
긴장감 속에서 비상경계 태세를 취하던 수군(隨軍) 병사들은 피곤에 지쳐 있었다.
밤이 이미 깊은 축시(丑時) 무렵에 북쪽의 건초장과 마구간에서 갑자기 불길이 일더니,
곧이어 동쪽의 무기고와 양곡창에서도 붉은 화광(火光)이 솟아 올라왔다.
사방에서 불길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자 당황한 영주도독(營州都督) 위충(韋沖)은
성벽을 지키던 군사들 중 일부를 차출하여 진화(鎭火)에 나섰다.
수군 병사들이 불을 끄느라 경황이 없는 가운데
수군의 복장을 한 고구려의 첩자들이 서쪽 성문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서문(西門)을 경비하던 수병(隨兵)들을 참살하고 재빨리 성문을 열었다.
서문 밖에서 군사를 거느리고 숨어있던 재증협무는
성문이 열리자 환도(環刀)를 높이 치켜들고 성안으로 말을 달렸다.
고구려군 병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그의 뒤를 따랐다.
갑자기 서문이 열리며 고구려군이 침입하자
위충은 부랴부랴 군사들을 보내어 그들을 막으려고 했다.
하지만 고구려군은 이미 성문을 점거하고 성벽 위로 뛰어 올라오고 있었다.
고구려군의 출현에 겁을 집어먹은 유성의 수비병들은
이제 무기를 든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았다.
저항하던 몇몇 수병(隨兵)들이 고구려군사들의 창에 찔려 쓰러지자,
남은 군사들은 무기를 버리고 앞 다투어 항복했다.
사세가 돌이킬 수 없게 되자, 위충은 몸을 빼내어 북문(北門)을 통해서 달아났다.
그의 뒤를 따르는 군사는 겨우 천 명 남짓밖에 되지 않았다.
8. 수군(隨軍)에게 지옥으로 변한 요택(遼澤)
한왕(漢王) 양량(楊諒)의 군대가 임유관(臨渝關)을 돌파해
영정하 하류에 당도했을 무렵,
유성이 고구려군에게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고구려가 유성을 손쉽게 장악한 것은 이번 전쟁의 양상을 바꿀만한 큰 사건이었다.
수국(隨國)은 유성을 고구려 원정의 전진기지로 삼고
군량과 장비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 마당에 유성이 떨어졌으니 수국은 조급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양량은 급히 행군을 멈추고 장수들을 모아 작전회의를 했다.
“불과 며칠 만에 유성이 함락되었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소.
아무리 고구려군의 전력이 막강하다고 하지만 위충이 많은 군사로 성을 지켰는데
어찌 그리도 쉽게 패배할 수 있단 말이오?”
전쟁에서의 경험이 부족한 양량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
“분명 저들의 계책에 빠져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성을 넘겼을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고구려의 병마원수가 지략이 뛰어나다 하더이다.
아마도 그가 내놓은 계책이 아닐까 합니다.”
부원수 왕세적(王世績)의 조카인 중군장 왕식충(王息忠)이
아는 체를 하며 끼어들었다.
그는 양량에게 수족과 같은 인물이었다.
왕세적이 고개를 저으며 양량에게 말한다.
“이번에 영주부를 함락시킨 고구려 장수는 연자유라 합니다.
그는 지난번 고구려의 국왕이 몸소 영주성을 쳤을 때, 선봉에 섰던 인물입니다.
소장의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 자가 지난날 영주성이 혼란한 틈을 타서
미리 손을 써 둔 듯합니다.”
“그 자가 강이식 못지않게 뛰어난 지략을 가지고 있단 말이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자유는 용맹스러운 장수이기는 하지만
성미가 급하여 생각보다는 행동이 앞섭니다.
이번 영주의 패배는 그 자가 의외의 실력을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전장(戰場)에서의 오랜 경험이 그를 노련(老鍊)하게 만들었나 봅니다.
하지만 사람의 성품이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의 약점을 이용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제압할 수 있습니다.”
왕세적의 머릿속에는 이미 연자유를 잡을 방책이 들어 있었다.
곰이 백 년을 묵는다고 해서 여우가 될 수는 없었다.
이제 함정을 파고 적당한 미끼를 던진 후에 기다리면 될 일이었다.
“그렇다면 나는 이번 일을 부원수에게 맡기기로 하겠소.
꼭 유성을 탈환하기를 바라겠소.”
양량은 연자유와 같은 하찮은 장수는 왕세적에게 맡기고
자신은 고구려의 영토 안으로 진격할 계획을 세우기로 하였다.
요택은 요하 하구의 낮은 땅으로 강물이 범람하며 만들어진 습지였다.
요택의 땅은 대부분 진흙이나 늪지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이 지역을 오가던 사람들은
수월한 왕래를 위해서 흙과 돌을 이용해 길을 닦았다.
“각 길마다 판석(板石)을 깔아 정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유실될 경우를 대비해서 아군만 알 수 있는 표식을 해두었습니다.
여기 지도에 상세히 표시해두었으니
길이 진흙에 묻혀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강이식은 부하 장수인 말객(末客) 고이중(高利重)의 보고를 들으며
지장도(地場圖)를 살펴보았다.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되면
이 땅은 제단으로 변하여 무수히 많은 수병(隨兵)의 피를 들이마시게 될 것이다.
저들은 분명 이 요택을 통과할 것이지만
내가 미리 쳐놓은 그물에 걸려들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다.
낙수계곡(落水溪谷)이 그의 무덤이 되리라.”
강이식이 말하는 낙수계곡은 개모성 부근에 있는 계곡으로
특히 폭포의 절경으로 유명한 곳이었다.
“그대는 이 길로 태제(太弟) 전하(殿下)에게 달려가 내 말을 전해라.
내가 어제 천문(天文)을 보니, 남두육성(南頭六星)의 빛이 흐려지고 있었다.
이는 필시 용왕(龍王)의 진노가 일어날 조짐이다.
그러니 전선(戰船)들을 단속하여 바다로 나가는 일을 금해야 할 것이다.
말을 전한 후에는 그 곳에 머물며 전하를 돕도록 하라.”
용왕의 진노라 하면 엄청난 태풍을 뜻하는 것이었다.
강이식의 지시를 받은 고이중은 재빨리 준마(駿馬)에 올라 패수구 쪽으로 달려갔다.
강이식은 자신이 치밀하게 짜놓은 전략을 다시 상기하면서
건안성을 향해 말머리를 돌렸다.
언덕에 올라 유성(柳城)을 바라보던 수장(隨將) 왕세적(王世績)은
성벽을 지키고 있는 고구려 군사들의 절도 있는 모습에서
군기가 정연함을 알 수 있었고,
공성전(攻城戰)을 펼쳐 성을 탈환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고구려군을 성 밖으로 끌어내는 것뿐이었다.
왕세적이 거느린 5만의 수군(隨軍)은 유성을 향해 쇄도(殺到)하여
고구려군에게 싸움을 걸었다.
“천자(天子)의 군대가 왔으니 적장 연자유(淵子遊)는 성문을 열고 항복하라.
그리하면 지난날의 죄과를 묻지 않겠다.”
연자유의 마음을 흔들어놓기 위한 외침이었다.
그의 됨됨이로 볼 때 항복을 권유하는 말은 모욕과 다르지 않았다.
“웃기고들 있구나. 하늘의 아드님이 세우신 나라는 오직 우리 고구려뿐이다.
천제(天帝)께서 하늘의 아들[天子]을 사칭하는 너희들에게
천군(天軍)을 보내 징벌하실 것이다.”
연자유는 부하들을 시켜 대거리를 할 뿐 미동도 하지 않았다.
왕세적은 욕 잘 하는 병사들을 뽑아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쏟아내게 하여 충동질을 계속하였다.
하지만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심한 욕을 해도
연자유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왕세적은 단순히 연자유의 성질을 자극해봤자 소용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을 공격하면서 고구려군의 허실을 탐색하기로 했다.
수나라 군사들은 일만 명씩 대를 나누어 번갈아가며 유성을 공격했다.
공격하는 쪽이 전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한시도 긴장을 풀 수 없었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이어지는 수군의 공격은 고구려군의 기운을 빼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수군의 피해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왕세적은 이에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공격을 퍼부었다.
그러다 보면 고구려군의 피곤이 쌓여 갈 것이고
연자유의 참을성도 한계를 드러낼 것이었다.
한편, 왕세적이 연자유가 점령한 유성을 공략하는 사이
한왕 양량은 무얼 하고 있었는가?
한왕 양량은 왕세적에게 유성 탈환의 임무를 맡기고
일언반구(一言半句) 상의도 없이 나머지 군사들을 거느리고 요하로 향했다.
왕세적은 양량과 헤어지면서 요택을 조심하라고 누누이 알렸지만
양량은 자신이 전쟁을 주도하여 공훈을 세우고 싶다는 욕심에
왕세적의 조언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자신만만하게 요택으로 향했던 양량은
금방이라도 요하를 건너 요동성으로 내달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욕심은 종종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양량은 욕심이 앞선 나머지 장마철에 요택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요택에 들어온 지 사흘 만에 습기가 찬 바람이 불더니
마침내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면서 비가내리기 시작했다.
비가 그치지 않고 하루종일 내리니
눈앞에 보이던 길이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사라져 버렸다.
늪이 점점 입을 크게 벌려 주위를 삼켰고,
사방은 점차 거대한 진흙의 바다로 변해갔다.
수나라 군사들은 나아갈 방향을 잃었다.
마치 망망대해(茫茫大海)에서 풍랑을 만나
돛과 닻을 잃고 표류하는 난파선 같은 신세였다.
많은 비로 인해 불어난 요하가 범람하면서 요택의 수위가 점차 높아졌다.
군량미를 실은 수레는 진흙탕에 빠져 꼼짝하지 못했고,
지대가 낮은 곳에서는 이미 수나라 군사들의 허리까지 물이 차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양량은 쉽게 굴복하지 않았다.
양량은 오랜 시간 차가운 비를 맞으며 걷기도 어려울 정도로 빠져 들어가는
진창길을 헤쳐 오느라 지친 군사들을 독려하여 진군(進軍)을 거듭했다.
기진맥진한 군사들이 하나둘씩 쓰려져 갔다.
길이 없어져서 군량미를 실은 수레는 더 이상 군사들의 뒤를 따를 수 없었다.
그래서 결국 보급은 끊겼고 군사들이 소지한 군량미조차 바닥을 드러냈다.
배고픔과 무리한 행군,
그리고 청결을 유지할 수 없는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해
군사들 사이에 전염병이 돌았다.
병마(病魔)는 마치 매복하고 있던 적군처럼 삽시간에 수군을 덮쳤다.
보급이 끊긴 상황이었기에
많은 병사들이 제대로 치료 한 번 받아 보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다.
요택에 갇힌 지도 열흘이 지나자 군사들은 물론이고 양량조차 버틸 힘이 없었다.
이러다간 고구려 군사들은 구경도 하지 못하고 전멸할 지도 몰랐다.
양량은 왕식충을 불러 의논했다.
“아무래도 군대를 철수하고 훗날을 기약해야겠네.
이런 식으로는 고구려군과 싸워 보기도 전에 군사들을 모두 잃겠어.”
그러나 왕식충은 목표를 정하면 절대 포기를 모르는 우직한 사람이었다.
“어차피 물러나려 해도 물러날 수 없습니다.
제가 아직 여력이 남아 있는 군사들을 모아 길을 열고,
요하를 건너 교두보를 만들겠습니다.
전하께서는 이곳에 머무르시다가 저의 연락을 받으면 요하를 건너오십시오.”
절망에 빠진 양량은 충복의 무모함에라도 기대고 싶었기에 왕식충의 청을 받아들였다.
이미 군사의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남은 군사들도 많이 지쳐있었지만
그나마 상태가 양호한 군사 삼만을 뽑아 왕식충에게 맡겼다.
“내 오직 그대만을 믿겠다.”
왕식충이 이끄는 선봉부대는 추위와 배고픔을 무릅쓰고
비가 쏟아지는 지옥 같은 진흙길을 지나 요하에 다다랐다.
많은 비로 인해 불어난 강물은 거칠게 강변을 집어삼키고 있었으며,
결코 도강(渡江)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듯이 세차게 꿈틀거렸다.
이를 바라보는 군사들의 얼굴 위로 차가운 빗방울이 떨어졌다.
하지만 의지로 굳게 뭉쳐진 왕식충은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쓰디쓴 고통조차도 달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왕식충은 군사들을 다독여 주변에서 나무를 구해오게 해서 뗏목을 만들고
빗방울이 잦아들기를 기다려 강물 위에 뗏목을 띄웠다.
급한 물살을 이기지 못한 뗏목들이 하나둘 씩 뒤집히고
그 위에 타고 있던 군사들이 강물에 쓸려 내려갔다.
그러나 왕식충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물에 빠진 군사들이 허우적거리며 살려 달라 외쳤지만
누구도 구할 엄두를 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물살이었다.
왕식충의 군대는 많은 대가를 치른 뒤에야 간신히 요하를 건널 수 있었다.
군사들은 전우를 잃은 슬픔보다 살아남은 기쁨이 더 크다는 사실에
한동안 온몸을 떨어야했다.
왕식충은 군사들을 추슬러 진군을 했다.
그는 이 지긋지긋한 고생도 언젠가는 그 끝을 보이리라 확신했다.
그러나 하늘은 수군(隨軍)을 돕지 않는지
그쳤던 비가 다시 세상을 메울 듯이 쏟아져 내렸다.
그리고 왕세적의 군사들은 천신만고(千辛萬苦) 끝에 요하를 건넜지만
수군의 움직임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던 고구려군이 그들을 그대로 놓아 둘리 없었다.
대모달(大模達) 이중손(李重孫)이 이끄는 요동성의 고구려군이
왕식충 휘하의 수군을 기습 공격한 것이다.
폭우 속에서 피로감과 더불어 시야를 제대로 확보할 수 없었던 수군은
자신들이 고구려군에게 포위당한 건지도 모른 채 행군을 계속하다가
느닷없이 화살 세례를 받았다.
바람처럼 달려든 고구려군사들에게서 도망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고구려 군사들은 수군과의 거리가 좁혀지자
일제히 궁시(弓矢)를 당겨 집중사격을 전개했다.
수나라 군사들은 화살에 맞아 진흙탕에 얼굴을 묻고 쓰러졌다.
왕식충은 참혹하게 무너져 내리는 부하들을 보며
이번 원정에 참가한 자신의 선택을 저주했다.
날카로운 파공음이 선명하게 들리더니 왕식충의 몸이 휘청거렸다.
이어서 고구려 군사들의 요란한 함성소리가 들렸다.
9. 사련교(思戀橋)에서 전사한 연자유(淵子遊)
왕세적의 군대는 쉬지 않고 연속적으로 공성전(攻城戰)을 펼쳤으나
연자유 휘하의 고구려군은 더욱 유성(柳城)에 대한 방비를 견고히 하며
끈질기게 저항했다.
게다가 쉽게 그치지 않고 날마다 계속 내리는 빗줄기는
수나라 군사들에게 심상치 않은 병증을 안겨주었다.
오랜 시간을 차가운 빗속에서 보낸 수군(隨軍) 병졸들 가운데
오한과 발열, 설사 등을 일으켜 탈진해 쓰러지는 사람이 날이 갈수록 늘어갔다.
환자들은 따로 격리해서 치료를 했지만
습기가 많고 후덥지근한 막사에 변변한 약조차 없다보니 하나둘씩 쓰러지고 있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오히려 공격하는 수군 쪽이 먼저 지칠지도 몰랐다.
왕세적은 심사숙고(深思熟考) 끝에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는 계책을 짜냈다.
만일 이 계책이 실패한다면 수군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왕세적은 별장(別將) 장덕평(張德平)을 은밀히 불러 지시를 내렸다.
“이곳에서 남쪽으로 오십여 리 떨어진 곳에 사련교(思戀橋)라는 다리 하나가 있다.
너는 군사들을 이끌고 그곳으로 가서 주변의 갈대밭과 숲 속에 군사들을 매복시켜라.
적장 연자유도 요택에서 아군이 곤경에 처해있다는 소식을 접한다면
우리가 후퇴하더라도 의심 않고 추격해올 것이다.
고구려군이 사련교에 이르면 일제히 갈대밭에서 뛰쳐나와서 그들을 치면 된다.
내가 연자유를 유인하겠다.”
사련교는 호타하 지류위에 놓인 다리로 남쪽으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했다.
다리 주변의 강가에는 갈대가 우거져 군사들이 매복하기에 용이했다.
다음날 수나라 군사들은 왕세적의 퇴각명령에 따라
일사불란(一絲不亂)하게 후퇴할 준비를 시작했다.
성 위에서 이를 지켜보던 연자유는 뛰어나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수나라 군사들이 지금 도망치려고 하지 않는가?
드디어 그동안 당한 모욕을 시원히 되갚아 줄 수 있겠다.
어서 군마를 준비해라. 내 당장 뛰어나가 왕세적의 목을 베리라.”
이에 기총(旗總) 소우겸(昭禹兼)이 반대하고 나섰다.
“아군은 가까스로 적군의 맹렬한 공격을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세적이 갑자기 군사를 물리다니,
이는 필시 모종의 계략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소우겸의 말을 듣고 보니 그도 그럴듯했다.
연자유는 나가서 적군을 쫓고 싶은 충동을 가까스로 참아 냈다.
이때 마침 숙군성주(宿軍城主) 가라달(可邏達) 두요상(杜曜祥)이
보낸 전령이 당도했다.
“지금 한왕 양량이 이끄는 수군은 요택에 고립되어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연자유는 전령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
왕세적은 양량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군사를 후퇴시키는 것이므로
다급한 상황에 빠져 있으니 적군은 간계(奸計)를 부릴 정신이 없을 것이었다.
이는 수군을 섬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때를 놓치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연자유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군사들을 소집하고
성 밖으로 나가 수군(隨軍)의 뒤를 쫓으며 군마(軍馬)를 몰았다.
고구려의 추격병을 본 수군 병사들은 뿔뿔이 흩어져 급히 달아났다.
연자유는 수나라의 부원수기(副元帥旗)를 바라보며
침착하게 추격전(追擊戰)을 펼쳐 거리를 좁혔다.
고구려군에게 쫓긴 수나라군사들은 강을 건너기 위해 사련교 주위로 몰려들었다.
하지만 다리는 겨우 대여섯 명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지날 수 있는 너비였으므로
한꺼번에 몰려드는 많은 군사들을 감당할 수 없었다.
미처 다리로 건너지 못한 수군 병사들은 갈대숲을 헤치고 물로 뛰어들었다.
이를 본 연자유는 의심을 거두고 수나라 군사들에게 달려들었다.
달아나던 수나라 군사들이 뒤돌아서서 고구려군과 접전을 벌이는 순간,
갈대숲에 숨어 있던 장덕평 휘하의 수군이 함성을 지르며 튀어나오더니
고구려군을 에워싸고 공격을 개시했다.
예상치 못했던 기습을 받은 연자유는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어디에 숨어 있다가 나타난 건지 수나라 군사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만 갔다.
결국 연자유는 수군에게 여러 겹으로 포위되는 절박한 신세가 되었다.
연자유는 군사들을 독려하며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함정에 빠지면 호랑이라도 빠져나오기 어려웠다.
많은 고구려 군사들이 수군의 창과 칼 아래 쓰러져 갔다.
왕세적이 연자유에게 항복을 권유한다.
“나는 수나라의 행군부원수 왕세적이다.
그대의 용맹은 익히 들었지만 이 정도로 오래 버텨 낼지는 몰랐다.
더는 아까운 부하들의 목숨을 희생시키지 말고 항복하기 바란다.
항복한다면 우리나라의 황제께 주청하여
그대를 높은 관직에 등용하도록 천거할 것이다.”
그러나 연자유는 대노하여 왕세적을 꾸짖었다.
“네놈의 꾀에 넘어가 이 지경에 처했다만
고구려의 무사로서 부끄러운 짓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내 죽을지언정 네놈을 반드시 저승길의 동무로 삼을 것이다.”
연자유는 몸을 날려 왕세적에게 달려들었다.
왕세적은 크게 놀라서 황급히 뒤로 물러났다.
왕세적의 호위병들은 연자유를 향해 일제히 화살을 날리고 창을 던졌다.
연자유가 아무리 용맹스러운 장수라 한들
한꺼번에 날아오는 수십 발의 화살을 피할 수 없었다.
몸에 수십 개의 화살이 꽂힌 연자유는
수나라군사들을 향해 두 눈을 부릅뜨며 숨을 거두었다.
왕세적은 이 전투에서 고구려군 3천여 명을 참살하고
5백여 명을 사로잡는 전과를 올렸다.
유성을 탈환한 왕세적은 급히 군사를 몰아 요택으로 달려갔다.
이제 기나긴 장마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는지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었다.
수나라 군사들은 흙과 돌을 운반하여 길을 만들면서 앞으로 전진해 갔다.
척후병을 보내 요택의 지형을 세심히 살핀 왕세적의 군대는
길가에 드러난 표식 아래서 고구려군이 깔아 놓은 연석(緣石)을 발견할 수 있었다.
왕세적의 군대는 연석을 따라 양량이 고립되어 있는 곳까지 내달렸다.
왕세적이 양량의 진영에 도착해보니 그야말로 비참하기 이를 데 없었다.
굶주림과 수인성(水因性) 전염병으로 인해 이미 군사의 반수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살아남은 군사들 역시 움직이기조차 힘들 정도로 지쳐 있었다.
군진(軍陳)이라기보다는 병자(病者)들의 수용소처럼 보였다.
왕세적은 요하 쪽에서 도망쳐오는 패잔병들을 통해
조카인 왕식충이 무모하게 도강을 시도하여 고구려의 국경을 넘다가
적군의 기습공격으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일지군(一枝軍)의 지휘관으로서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서는 안 되었지만
형의 유일한 피붙이인 왕식충의 시신을 두고 갈 수는 없다는 생각에
왕세적은 위험을 무릅쓰고 요하를 건너기로 결정했다.
급히 뗏목을 만들어 한결 물이 줄어든 요하를 건넌 왕세적의 군대는
개모성으로 방향을 잡았다.
한편 주라후(周羅候)가 총지휘하는 수국(隨國)의 수군(水軍)은
내주(萊州)를 출발하여 발해만을 항해하고 있었다.
남동풍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여서 노를 쓰지 않고 돛만으로도 항해가 가능했다.
장마철에 접어들자 바다의 일기 역시 평탄하지 않았다.
파도가 높고 바람이 거센데다가 비까지 오락가락하여 항해에는 적당치 않은 날씨였다.
그러나 주라후는 오히려 해상의 기후가 좋지 않은 이때에 항진한다면
고구려 쪽에서도 바다에 대한 경계가 소흘해 질 것이라고 생각하여
예정된 일정대로 출항을 명령했던 것이었다.
주라후의 선단은 새롭게 건조한 군선을 비롯해서
인근 해안 지역에서 차출한 어선까지 합쳐 1천여 척에 이르렀다.
겉으로 드러난 주라후 선단의 임무는 비사성을 공격하고,
해안선을 따라가며 육군에게 식량과 건초,
병장기 등의 군수품을 지원하는 역할이었다.
그래서 수나라의 수군은 묘도군도(廟島群島)를 거쳐 비사성으로 방향을 잡았다.
연안을 따라 움직이는 항해였으므로 고르지 않은 일기에도 불구하고
큰 탈 없이 항해할 수 있었다.
비사성이 가까워질 무렵, 주라후는 수하들을 불러 명령했다.
“뱃머리를 동쪽으로 돌려라.”
뜻밖의 명령에 장수들은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의 목표는 비사성이 아닙니까?”
부총관 <단천향段天響>이 당황하여 물었다.
“우리는 지금 패수구(浿水口)로 향한다.”
패수구라면 평양으로 통하는 수로(水路)의 입구가 되는 셈이다.
패수구로 향한다는 것은 직접 고구려의 도성을 치겠다는 의도였다.
이에 단천향이 난색을 표했다.
“이런 날씨에 항해를 계속하는 것은 무모합니다.”
일개 수부로 시작해서 많은 전장을 누비며 공을 세워 지휘관의 자리까지 오른
<단천향>이었으므로 위험에 대한 직감만큼은 누구보다 날이 서 있었다.
<주라후>가 손사래를 치면서 <단천향>의 말을 끊었다.
“이것은 폐하께서 내린 황명(皇命)이니라.
그리고 기후에 대해서는 그리 걱정할 일만은 아니다.
이제 장마도 거의 끝나서 바다가 평온을 되찾고 있다.
남동풍이 잦아들 때를 노려 서둘러서 노를 젓는다면 무사히 패수구에 당도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남동풍의 계절입니다.
당장 바람이 불지 않는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 태풍이 불어올지 모릅니다.
게다가 저들이 우리가 선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비사성에 있는 고구려의 수군이 아군의 후미를 공격한다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하게 됩니다.”
동래의 수군도독인 중랑장(中郞將) <상관요上觀曜>가 볼멘소리로 말했다.
“나에게 저들을 속일 계책이 있다.”
<주라후>는 그 자리에서 <상관요>에게 군선 2백 척을 거느리고
비사성으로 가라 명했다.
“공격하는 시늉을 하면서 저들의 시선을 끌면 충분하다.
고구려 수군의 전력은 가벼이 여길 수 없으니 절대로 정면으로 맞붙어서는 안 된다.
고구려군이 지치면 치고, 반격하면 그만큼 거리를 두고 물러나라.
우리는 그 틈을 노려 패수구로 접근할 것이다.”
장수들은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주라후>의 명령을 받아들여야 했다.
먼저 <상관요>가 동래부(東萊府) 소속의 선단을 이끌고 비사성으로 출발했다.
그 속에는 <주라후>의 대장기가 나부끼는 지휘선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주라후>의 선단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함이었다.
때를 같이하여< 주라후>는 <상관요>의 배인 적함(赤艦)에 올라간 후 패수구로 향했다.
수국의 선단이 내주를 출항했다는 척후선의 보고를 받은 고건무(高建武)는
긴급히 장수들을 소집했다.
장수들이 수군원수부(水軍元帥府)에 모이자 고건무는 좌중을 둘러보며 말했다.
“주라후의 선단이 내주를 출발했다니 어디로 향할 것 같소?”
“그들은 비사성으로 항로를 잡았다고 합니다.
비사성으로 올라가서 <양량>의 육군과 요동성에서 조우하려고 할 것입니다.”
고건무의 측근인 대모달(大模達) 고승(高勝)이 답변했다.
고건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석에 앉아 있는 말객(末客) 고이중(高利重)에게 물었다.
“자네의 의견은 어떠한가?”
“소장이 듣기로 동래를 떠난 수의 선단은 1천 척이 넘을 정도로 대규모라 합니다.
비사성 정도를 취하려고 그 많은 군사를 동원했을 리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저들은 비사성을 공격하는 척해서 우리의 시선을 끈 뒤
정작 주력 부대는 패수구로 향해 평양성을 치려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고이중>은 <고건무>가 자신의 생각을 정확히 읽어내고 있음을 깨닫고
속으로 크게 찬탄했다.
역시 <고건무>는 단순히 왕제(王弟)란 이유만으로
수군원수의 직책을 맡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우리의 주력이 요동에 집결해 있는 상황에서
수나라의 수군이 패수구로 쳐들어온다면 이것이야말로 낭패가 아닌가?”
<고건무>가 근심스러운 표정을 짓자 <고이중>이 자신있게 말했다.
“그건 크게 염려하시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도원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가 굳이 손을 대지 않아도 수군이 자멸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건 무슨 소린가?”
“도원수께서 천문을 보셨는데 닷새 후에는 엄청난 태풍이 불어 닥쳐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배란 배는 모두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해상에서 전투를 치르지 않고도 저들을 수장(水葬)시킬 수 있습니다.”
“도원수께서 그리 말씀하셨다면 내 무엇을 걱정하겠는가?”
<고건무>는 <강이식>의 지략과 예지력이 신통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금새 편안한 얼굴로 되돌아왔다.
한편 2백 척의 군선을 이끌고 비사성 앞바다까지 접근한 중랑장 <상관요>는
해안가에 정박한 고구려 함선을 항해 화살공격을 퍼부었다.
그러자 고구려 함선에서도 기다렸다는 듯이 불화살을 날렸다.
미끼의 역할인 동래부의 수군은 굳이 싸울 필요가 없었기에
뱃머리를 돌려 바다로 물러났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갈 무렵,
패수구가 보이는 바다에 당도한 주라후는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을 함락시키고
고구려 국왕을 발아래 무릎 꿇릴 생각에 저절로 입가에 웃음이 배어 나왔다.
평양성의 성민들은 앞으로 닥쳐올 재난을 모른 채 마음을 놓고 있을 것이었다.
이제 내일 아침 패수를 따라 오르면
점심 쯤에는 유명한 평양성의 화려한 성곽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다.
이물에 서서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눈앞에 펼쳐져 있는 육지를 바라보던 <주라후>가
고개를 돌려 부총관 <단천향>에게 말했다.
“어떤가? 하늘조차우리의 편이지 않는가?
콧대 높은 고구려가 고개를 숙일 날도 얼마 남지 않았도다.”
부총관 <단천향>은 할 말이 없었다.
어쨌든 험한 바다를 무사히 건너오지 않았던가?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속의 불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패수구 앞바다는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았다.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단천향>의 조바심은 더욱 심해졌다.
<단천향>은 <주라후>에게 후퇴하자고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군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질책을 받을 것이 뻔했기에
애써 입을 다물었다.
<주라후>는 눈길을 거두어 뒤를 따르는 선박들을 응시했다.
1천여 척에 달하는 선박들이 산이라도 집어삼킬 기세로 물살을 가르며
달려오고 있었다.
주라후는 마음이 든든해져 다시 정면을 바라보았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바람에서 비린내가 느껴졌다.
전함의 돛이 찢어질 정도로 부풀어 올랐다.
먹장구름이 순식간에 푸른 하늘을 집어삼켰다.
사방이 컴컴해졌다.
천둥이 진군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번개가 금방이라도 배를 쪼개버릴 듯이 번쩍였다.
잔잔했던 바다는 어느 틈에 안면을 바꾸고 미친 듯이 날뛰었다.
배는 키의 움직임과는 상관없이 강풍에 떠 밀려 갔다.
파도가 점차 몸집을 불리더니
어느새 나뭇잎처럼 떠나디는 수나라의 전함들을 뒤덮었다.
간신히 태산 같은 파도에서 벗어난 배들도 앞뒤 가리지 않고 몰아치는 비바람 속에서
돛대가 꺽이고 고물이 파손되어 침몰해 갔다.
폭풍우는 죽음을 부르는 망나니처럼 춤을 추며 밤이 새도록 몰아쳤다.
바람소리가 군사들의 절규를 앗아갔다.
배 위에서는 혀를 날름거리는 파도에 의해 무언(無言)의 살육극(殺肉劇)이 벌어졌다.
부서진 배의 파편과 물에 빠진 군사들이 서로 뒤엉켜 검은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이튿날 아침,
요행히 파도에 떠밀려 상륙한 수나라의 군사들은
해안가를 지키고 있던 고구려군의 사냥감으로 전락했다.
개펄은 순식간에 갈대밭으로 변했다.
수병(隨兵)들의 시체가 패수구의 해안을 까맣게 뒤덮었다.
10. 왕세적(王世績)을 패배하게 한 강이식(姜以式)의 뛰어난 지략
왕세적이 이끄는 수군(隨軍)이 개모성(蓋牟城)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성주인 모달(模達) 손자연(孫子然)은
행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성문을 걸어 잠그도록 하였다.
병마원수(兵馬元帥) 강이식(姜以式)은
장수들을 불러 모아 자신의 전략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모달(模達) 재증협무(再曾協武)를 돌아보며 말했다.
“치욕을 씻을 기회를 주겠다.
자네에게 일만의 군사를 내줄 테니, 낙수계곡(落水溪谷)으로 가서 매복하고 있거라.
내가 왕세적을 그쪽으로 유인하겠다.”
재증협무는 강이식의 마음씀씀이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부장(副將)으로서 주장(主將)을 지키지 못하고
혼자만 살아 돌아왔다는 자책감이 그의 마음속에서 생채기를 내고 있었다.
패잔병을 거느리고 개모성으로 도망쳐 왔을 때,
사람들이 자신을 경멸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듯해서
그만 그 자리에서 칼을 빼어 자진(自盡)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지만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다.
그는 죽음조차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으리라는 사실을 알았다.
연자유의 복수는 그가 완수해야할 의무였기 때문이었다.
고구려의 무사에게 있어 패배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다.
만일 누군가 대신 그 고통을 적군에게 되돌려 주지 않는다면
그의 영혼은 안식(安息)을 얻을 수 없었다.
재증협무는 연자유가 영계(靈界)에서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했다.
그러니 강이식은 재증협무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준 것이었다.
강이식은 이어서 개모성주 <손자연>에게 명령했다.
“성주께서는 개모성을 지키며 저항하다가
적당한 때에 패전한 척 북문으로 달아나시오.
왕세적은 의심이 많아 쫓으려 하지 않을 테니,
북림(北林)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수군(隨軍)이 도망쳐 오면 그들의 퇴로를 막으시오.”
모든 장수들에게 할 일을 일러준 강이식은 출전 준비를 위해서 처소로 돌아왔다.
왕세적의 군대가 성 앞에 도착하자
개모성에서도 고구려 군사들이 성문을 열고 달려 나와 대형을 갖추었다.
개모성은 험한 산 위에 위치한데다가 요동성이나 신성에 비해
주둔한 군사가 그리 많지 않은 규모가 작은 성이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수성전(守城戰)으로 이점을 취하는 것이 병법의 기본이었다.
그러나 왕세적은 개모성 안에 있는 고구려군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대항해 오리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적잖이 당혹스러웠다.
강이식이 마상(馬上)에서 등편(藤鞭)으로 적진을 향해 내뻗으며 공격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고구려군은 요란하게 말발굽 소리를 내며 수군을 향해 돌격해 들어왔다.
왕세적도 응전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좌우에서 깃발이 흔들렸다.
수군의 진영이 두 대로 갈라지고
선두에 선 수군의 경기병(輕騎兵)들이 고구려군의 측면으로 달려들었다.
고구려군의 중장기병(重裝騎兵)들이 이에 맞섰다.
하지만 수군의 경기병들은 이들을 지나쳐
고구려군의 보병(步兵) 부대가위치한 후미를 쳤다.
이곳이 바로 고구려군의 허점이었다.
고구려 중장기병은 무거운 철갑을 두른데다가 전속력으로 내닫고 있었기에
방향을 전환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날렵한 수군의 경기병은 수적 우세를 이용해서
고구려군의 후미를 무력화시키고 있었다.
전세는 순식간에 뒤바뀌었다.
중장기병의 뒤를 따르던 고구려군의 보병들은 제대로 저항도 못해 보고
수군의 경기병들에게 쫓겨 달아났다.
강이식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동쪽으로 달아나는 것을 본 왕세적은
별장 <장덕평>에게 개모성을 공격해서 탈취하라 명하고,
자신은 주력군을 이끌고 달아나는 고구려군을 추격하였다.
장덕평의 부대가 개모성을 공격해오자 개모성주 손자연은 강이식의 지시대로
한동안 교전하다가 못 이기는 척 성을 버리고 북문을 통해 달아났다.
왕세적은 강이식이 뛰어난 양장(良將)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기에
그를 한시라도 빨리 자신 앞에 굴복시키고 싶었다.
전장(戰將)에서 호적수(好敵手)를 만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고,
그런 상태와 맞붙어 완벽하게 무릎을 꿇리는 것은
장수(將帥)로서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왕세적은 흥분에 들떠있었다.
그런 허영심은 왕세적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다.
평소대로 냉정을 유지했다면
자신이 너무 깊숙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달아나는 강이식의 뒤통수만 보일 뿐이었다.
한참을 쫓다 보니 울창한 숲이 나타났다.
고구려 군사들은 숲 속으로 뛰어 들어가 모습을 갑추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왕세적은
자신이 어느새 산 속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전나무가 우거진 숲길이 점점 좁아지더니 어느덧 계곡으로 변했다.
어찌나 좁은지 두 사람의 기마병이 나란히 걷기도 어려울 지경이었다.
왕세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숨이 막히고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홍건하게 배었다.
왕세적은 말을 세우고 주변을 살피며 놀란 가슴을 진정시켰다.
아무래도 더 이상 고구려군을 쫓는 것은 위험했다.
고구려 군사들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지도 않았다.
마치 봄날의 안개처럼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왕세적은 군사들에게 그만 추격을 단념하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려는 지시를 내리려고 했다.
그런데 어디선가 함성과 더불어 수백 대의 화살이 수병(隨兵)들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왕세적은 당황하는 부하들을 진정시키고
고구려군의 위치를 파악하여 다시 추격을 명령했다.
고구려 군사들은 몇 차례 화살을 날리다가
이내 등을 보이며 계곡의 바위들을 뛰어 건넜다.
인근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수나라 군사들은 고구려군을 따라잡기 어려웠다.
고구려 군사들은 수군과의 간격을 점차 벌리더니 결국 종적을 감추었다.
초저녁 때에 이르자 어둠이 깔려오기 시작하더니
앞사람조차 분간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다.
낭장(郎將) 악소부(岳素浮)가 상관인 왕세적에게 간했다.
“이곳에 계속 머물다가는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 숲을 벗어나야 합니다.”
왕세적이 주변을 둘러보니 계곡에 가득 찬 부하 군졸들이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고 갈팡질팡하고 있었다.
왕세적은 자신이 부하들을 사지(死地)로 끌여 들였다는 생각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현실을 직시하고 군사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사방을 경계하라! 계곡을 따라 내려간다.”
수나라 군사들은 명령에 따라 횃불을 들고
계곡의 하류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한참을 내려갔는데 군사들의 발걸음이 더뎌졌다.
선두에서 전령이 달려와 계곡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군사들이 술렁였다.
하류로 갈수록 계곡이 넓어지는 것이 보통인지라, 왕세적은 적이 당황스러웠다.
만일 자신이 적장이라면 이곳에 복병을 숨겨 두었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제는 최대한 이 험지를 빠져나가는 수밖에 없었다.
왕세적의 예상은 불행히도 적중하고 말았다.
수군(隋軍)이 좁은 계곡을 힘겹게 빠져나가고 있을 때,
갑자기 계곡 양쪽의 높은 절벽 위에서 통나무와 염초뭉치들이 굴러 내리더니
곧이어 불화살이 소낙비처럼 쏟아졌다.
재증협무가 강이식의 지시를 받고 미리 절벽 위에 매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나라 군사들은 좁은 계곡에 호박 속처럼 꽉 들어차 있었기에
몸을 돌리기조차 어려웠다.
군사들은 비명소리와 더불어 통나무와 바위에 깔리고
불화살에 몸이 관통되어 처참하게 죽어나갔다.
왕세적은 천신만고 끝에 간신히 낙수계곡을 빠져나왔다.
그는 패잔병들을 거느리고 서쪽으로 달렸다.
한참을 달리다 보니 앞에서 한 떼의 군사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아이고, 이제는 죽었구나.”
왕세적은 그 순간 살고자하는 마음을 버렸다.
그가 넋을 잃고 마상에 앉아있는데 낭장 악소무가 기쁨에 들떠 외쳤다.
“저것은 고구려군이 아니라 장덕평이 이끈 아군입니다.”
왕세적은 그제야 눈을 뜨고 앞을 바라보았다.
개모성을 공격하라고 보냈던 장덕평의 부대가 분명했다.
장덕평의 믿음직한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장덕평이 달려와 왕세적을 위로했다.
“부원수께서 낙수계곡에 갇히셨다 해서 이렇게 군사를 끌고 오는 길입니다.
조금만 가면 개모성입니다. 우리 군사가 개모성을 점령했습니다.”
간신히 기운을 차린 왕세적은
장덕평이 거느리고 온 군사들과 합세해 개모성으로 나아갔다.
개모성으로 가는 길에 울창한 수풀이 있는데
인근 백성들은 이를 북림(北林)이라 불렀다.
왕세적 일행이 북림의 길을 지나는데,
갑자기 함성이 울리더니 좌우에서 화살이 빗발치듯 날아왔다.
화살은 사정없이 수나라의 군마를 덮쳤다.
여기저기에서 수병(隨兵)들이 고통스럽게 죽어나갔다.
낙수계곡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수나라의 패잔병들은
기진맥진해서 더는 저항할 힘이 없었다.
간신히 장덕평이 거느린 군사들이 고구려군에 대항해 싸우려 했지만
불가항력(不可抗力)이었다.
화살 세례가 그치더니,
북소리가 우렁차게 울리면서 매복하고 있던 개모성주 손자연의 군사들이 달려들어
간신히 살아남은 수병들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낙수계곡에서 구사일생(九死一生)으로 목숨을 건진 왕세적은
눈앞에 선 고구려 군사들이 저승에서 온 사자처럼 여겨졌다.
그는 타고 있던 군마(軍馬)조차 잃고 호위 무사의 부축을 받으며
간신히 몸을 지탱하고 있다가 다리의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다.
“수나라의 명장 왕세적이 바로 그대인가? 이곳까지 오느라 노고가 많았다.”
위압적인 기세로 버티고서 있는 고구려의 군마 사이로
봄바람처럼 살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왕세적이 힘겹게 고개를 드니 칠십대 후반의 기품이 흐르는 노인 하나가
미소를 띠며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왕세적은 강이식을 굴복시키겠다고 다짐했건만,
오히려 그의 계책에 놀아나다가 비참한 꼴이 됐다고 생각되니
참담한 패배감이 밀려 왔다.
일이 이쯤 되니 왕세적도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패장에게는 오로지 죽음만 있을 따름이었다.
왕세적은 바닥에 주저않은 채 칼을 뽑아 자신의 목을 겨누었다.
이를 본 강이식은 황급히 맥궁(貊弓)을 들어 왕세적의 오른팔을 향해 쏘았다.
바람을 가르고 날아간 화살이 왕세적의 오른팔에 적중했고,
왕세적은 비명을 지르며 칼을 놓쳤다.
“이곳은 네놈이 죽을 자리가 아니다.
내 너를 살려 줄 터이니 장안으로 돌아가서
너의 주군에게 고구려 공격을 단념하라고 일러라.
만일 헛된 야욕을 버리지 않고 다시 쳐들어온다면,
그때가 바로 수(隋)가 멸망하는 날이 될 것이다.”
강이식의 호통 소리에 왕세적은 넋을 잃고 그 자리에 널브러졌다.
이렇게 하여 고구려를 침범하여 개모성을 공략하던 왕세적의 군대는
강이식의 뛰어난 전술과 주도 면밀한 계략에 말려들어
2만에 이르는 병력을 잃고 쓸쓸히 요하를 건너,
기다리고 있던 한왕 양량의 군사들과 함께 장안으로 철수했다.
그리하여 고구려 침략을 시도하던 삼십만 수군(隨軍) 가운데
삼만 명 남짓 되는 패잔병만 살아 돌아갔던 것이었다.
이로써 제1차 여수전쟁(麗隨戰爭)은 고구려의 대승으로 끝났다.
제1차 여수전쟁 때에 고구려군을 총지휘하여 수군의 침략을 물리친 강이식(姜以式)은
진주(晉州) 강씨(姜氏) 가문의 시조로 알려져 있다.
단재(丹齋) 신채호(申采浩)선생의 최고 저작『조선상고사(朝鮮上古史)』에 의하면
「서곽잡록(西郭雜錄)」이라는 문헌을 이용해 강이식의 전공(戰功)을 전하고있는데,
『수서(隨書)』의 기록에는 고구려를 침략한 수군이
고구려군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태풍과 전염병 때문에 많은 인명피해를 입고 철수한 것임을 강조한
왜곡된 서술로 중국사의 치욕을 은폐하고 있다며 비판하였다.
강이식의 묘는 만주의 심양현(瀋陽縣) 원수림(元帥林)에 있었다고 전하는데,
봉길선(奉吉線) 원수림(元帥林)역 앞에 병마원수강공지총(兵馬元帥姜公之塚)이라고
새겨진 큰 비석이 있었으나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 때에 소멸되었고,
묘역에는 돌조각과 거북좌대만 남아 있다고 한다.
11. 유목민족을 고구려의 편으로 돌린 을지문덕의 외교전술(外交戰術)
송화강(松花江)을 따라 하류로 내려가다가 보면
속말말갈(粟末靺鞨)이 사는 땅이 나오고,
이를 지나쳐 오백 리쯤 가다보면 흑룡강(黑龍江)과 맞닿는다.
이곳에 이르면 송화강을 따라 빽빽이 들어서 있던 삼림이 사라지고
퇴적토가 쌓여 검은 색을 띠고 있는 평지가 모습을 드러낸다.
이 지역은 예로부터 흑수말갈(黑水靺鞨)의 본거지였다.
부여성주(扶餘城主) 제형(諸兄) 을지문덕(乙支文德)은
집순(執順) 두 명과 군졸 이십여 명의 호위를 받으며 흑수말갈의 경계에 들어섰다.
흑수말갈의 군마 삼백여 기가 쏜살같이 달려와 을지문덕 일행을 에워쌌다.
흑수말갈의 전사들 가운데 수염이 덥수룩하고 광대뼈가 튀어나온 사내가
화등잔만한 눈을 부라리며 다그쳤다.
“너희들은 누군데 허락도 없이 우리 흑수부의 땅을 침범했느냐?”
이에 을지문덕이 나서며 침착하게 대답했다.
“나는 고구려에서 온 부여성주 을지문덕이다.
그대들의 부족장을 만나러 왔으니 안내하라.”
고구려 성주라는 말에 말갈족 전사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저를 따라오십시오.”
처음에 을지문덕에게 말을 건넸던 두목인 듯한 사내가 앞장을 섰다.
을지문덕 일행은 말없이 그의 뒤를 따랐다.
그렇게 긴장된 상태로 한나절을 달린 끝에 마침내 부락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부족장으로 보이는 인자하게 생긴 노인이 나서서 을지문덕 일행을 맞이했다.
“나는 이곳의 부족장인 평당명로(坪黨明露)요.
그래, 대고구려의 성주님께서 이 먼 곳까지 나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오?”
“이곳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오.”
“그렇다면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흑수말갈의 부락에는 가옥들이 수백 채가 모여 있는데,
하나같이 흙으로 벽을 두르고 그 위에 가죽을 둘러 지붕을 만든 집들이었다.
평당명로는 그 가운데서 을지문덕을 가장 넓어 보이는 집으로 데려갔다.
방안으로 들어서니 부락의 원로로 보이는 노인들이
방안 가득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할 말이 뭔지 들어봅시다.”
“흑수부의 백성들이 잘살 수 있는 길을 일러 드리러 왔소.”
평당명로의 인자한 얼굴이 굳어졌다.
“어찌 고구려에서 우리의 생계를 신경 쓰는지 모르겠구려.”
“고구려와 말갈은 본디 한 겨레나 다름이 없소.
속말부(粟末部)나 백돌부(伯咄部) 등 다른 말갈 부족들은
이미 우리와 뜻을 함께하고 있소.
그로 인해 그들은 풍족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
유독 흑수말갈만은 우리와 거리를 두려 하니 안타깝소.”
평당명로는 어느새 냉담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말은 따뜻하나 실은 우리에게 복속하라는 뜻이 아니오?
다른 말갈 부족들이 고구려에 복속한 대가로 배를 불리고 있다는 소리는
내 진작 듣고 있었소.
그렇지만 우리는 남에게 얽매여서 잘 살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소.
계속 사냥이나 해서 먹고 사는 것이 오히려 홀가분하오.”
평당명로의 반응이 싸늘했지만 을지문덕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흑수말갈의 약점을 꼬집기 시작했다.
“이곳 흑수 주변은 기온이 낮아 농사를 짓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목축에 적합한 초지가 있는 것도 아니오.
오직 수렵이나 어로를 통해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 또한 날이 추워지면 어려워지게 되오.
그렇다면 결국 끼니를 이을 방법이라고는 이웃 부락을 약탈하는 것뿐이오.
하지만 흑수부 이외에 다른 부락들은 모두 고구려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쳐들어갔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오.
무엇이 현명한 선택인지는 명백하지 않소?”
흑수말갈의 부족장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을지문덕의 말이 옳았다.
평당명로는 한풀 꺾인 음성으로 물었다.
“성주께서 말하는 방법이라는 걸 들어보기나 합시다.”
을지문덕은 주위에 앉아있는 흑수부의 원로들을 둘러보더니 천천히 말을 이었다.
“흑수부가 살 길은 교역뿐이오.
지금 흑수부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라면 사냥을 해서 얻은 짐승의 가죽과
숲 속을 주름잡고 다니는 돼지가 있소.
여우나 담비의 가죽은 가공만 잘 한다면 상품으로 비싸게 팔 수 있고,
이곳의 돼지는 지방이 적고 육질이 좋게 때문에
부여성으로 끌고 와 판다면 많은 이득을 남길 수있을 것이오.
이런 식으로 특산품의 가치를 높이고 이를 교역하여 이문을 남긴다면
흑수부의 백성들도 얼마 안 가서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오.
그에 필요한 기술은 고구려에서 지원해줄 것이니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소?”
을지문덕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다.
그 자리에 모인 원로들은 구미가 당기는지 심하게 술렁거렸다.
“지금껏 고구려는 우리를 소흘히 대했는데, 이제 와서 친근한 척 하는 이유가 뭐요?”
우락부락하게 생긴 젊은이가 반열에서 나와 항의조로 말했다.
그는 부족장 평당명로의 아들인 평당사요(坪黨使尿)로
한눈에 보아도 말갈족의 전사임이 확연히 드러났다.
을지문덕은 웃으면서 말했다.
“우리나라의 태왕(太王) 폐하(陛下)께서는
흑수부(黑水部)가 변방에서 자주 소요를 일으키는 이유가
너무 가난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소.
폐하께서는 그대들이 걱정스러워 나를 보내신 것이오.
물론 우리도 변방에서 소란을 일으킨 벌로 돌궐(突厥)처럼 그대들을 핍박할 수 있소.
하지만 그것은 패도(覇道)의 길로,
천하의 주인이신 고구려의 태왕 폐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오.
폐하의 배려를 생각해서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이길 바라오.”
을지문덕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 자리에 모인 흑수말갈의 원로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평당명로 역시 을지문덕의 설득에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속말말갈을 비롯한 이웃을 약탈하지 마시오.
대신 고구려와의 교역을 통해
곡식과 베, 철제품 등 생필품을 받아들임으로써 이익을 얻으시오.
그대들이 약탈을 해서 얻는 이익보다
고구려와의 교역을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클 것이오.”
“그대의 말처럼만 된다면 우리에게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소?
허나 고구려도 틀림없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을 터, 말씀을 해보시오.
요즘 수국(隋國)과의 관계가 껄끄럽다고 하던데
혹시 우리에게 군사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오?”
평당명로는 당장 일방적인 혜택을 받으면
훗날 더 큰 댓가를 지불하게 될까봐 걱정스러웠다.
을지문덕은 흑수말갈 부족장의 근심을 알아채고 웃으며 말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우리가 원하는 것은 복속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그저 양방이 서로 힘을 합쳐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제야 평당명로의 얼굴이 환해지면서 다시 말을 이었다.
“그렇다면 반대할 이유가 어디 있겠소?
우리도 고구려의 뜻에 따르겠소.
흑수부의 다른 추장들을 설득하는 일은 나에게 맡겨 주시오.”
평당명로와 을지문덕간의 대화를 경청하던 원로들의 얼굴에도 만족감이 나타났다.
이튿날부터 을지문덕은 흑수부의 여러 부락을 일일이 돌며
고구려의 입장을 밝히고 번영을 약속했다.
여기에 함께 간 평당명로의 설득까지 더해지니
흑수말갈의 여러 부족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두어 달쯤이 지나자, 흑수부의 모든 부락은 고구려의 편에 서게 되었다.
흑수부 일을 마무리지은 을지문덕은 홀가분한 기분으로
말갈 땅을 떠나 부여성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끝까지 외면하던 흑수부의 합류로 이제 모든 말갈족들이 고구려에 복속하게 되었다.
이로써 고구려의 북변은 안정을 되찾았고 더불어 든든한 후원세력을 얻게 되었다.
제1차 여수전쟁(麗隨戰爭)이 고구려의 승리로 끝나고
양국이 한동안 휴전(休戰) 상태에 놓이면서 평화가 찾아왔지만,
을지문덕은 결코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가 주목한 것은 서북방에서 세력을 떨치고 있던 돌궐(突厥)이었다.
이 당시 돌궐은 수국(隨國)과 힘을 겨룰 만큼 막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들은 강성해진 수국으로 인해 남방으로의 진출이 어려워지자,
송화강 서북쪽에 있는 실위(室韋)로 눈길을 돌렸다.
이 당시 실위 사람들은 돌궐과 수국, 고구려
삼국의 틈바구니에 끼여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다.
실위의 부족들은 서로 힘을 합치지 못했기에 돌궐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변변히 싸워보지도 못하고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거란에 이어 실위를 복속시킨 돌궐의 지도자 목간가한(木杆可汗)은
실위의 각 부족에 토둔(吐屯)을 두고 이들을 통치했다.
실위 사람들은 굴욕감을 느꼈지만 돌궐의 강압에 못 이겨 받아들여야했다.
을지문덕은 실위까지 제압한 돌궐이 고구려로 세력을 뻗쳐올까 우려했다.
돌궐은 양원태왕(陽原太王) 재위기인 551년에
고구려를 침범했던 전력(戰歷)이 있었다.
수국과 대립하고 있는 이때에 돌궐까지 가세한다면
고구려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을지문덕은 수국과 휴전을 하고 있는 동안 돌궐을 견제하기로 결심했다.
돌궐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양국 사이에 완충지대를 설정해 놓는 것이었다.
을지문덕은 그 역할을 실위가 할 수 있다고 여겼다.
그러기 위해서는 돌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실위를 해방시켜
고구려의 우방으로 만들어야 했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을지문덕은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만 한다는 사명감으로 각오를 단단히 하고
호위무사 삼십여 명만 거느린 채 실위 땅으로 말을 몰았다.
이때가 603년 가을 무렵이었다.
을지문덕은 먼저 부여성의 북쪽,
송화강 서쪽 건너편에 위치한 남실위(南室韋)의 오라호부(烏羅護部)를 찾았다.
그는 이제 갓 마흔을 넘긴 나이에 패기와 강단을 간직한 전사인
오라호부의 대추장 나단(羅檀)을 만났다.
“요즘 실위 땅에서 토둔의 횡포가 심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그들에게 당하고만 계실 겁니까?”
이 당시 돌궐이 실위 땅에 설치한 토둔의 임무는
여러 부족들로부터 공납을 거두어들이는 일과
돌궐에 저항하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지 감시하는 역할이었다.
그런데 이곳에 부임한 돌궐인 토둔은 가한에게 바치는 공납 이외에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많은 재물을 수탈했다.
이렇게 토둔의 착취가 점차 극심해지자 각 부족들의 반감도 차츰 커져 갔다.
“내 안 그래도 끓어오르는 분기를 간신히 참고 있소이다.”
나단은 아직 혈기가왕성하여 노기를 다스리기 어려운지 얼굴이 심하게 붉어졌다.
을지문덕은 나단의 속내를 간파하고 더욱 부추겼다.
“그렇다면 무엇을 망설입니까?
실위의 부족들이 힘을 합친다면 돌궐을 물리치는 일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실위의 부족들이 일어나기만 한다면
우리 고구려도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돌궐에 대한 나단의 적개심이 을지문덕의 부채질로 더욱 활활 타올랐다.
나단은 금방이라도 칼을 빼어들고 토둔에게 달려갈 것만 같았다.
그런데 그 순간 나단 옆에 있던 부족의 원로인 타보소초(打步素草)가 제지하고 나섰다.
그는 과열된 분위기를 가라 앉히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차분하게 말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돌궐의 세력을 몰아내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부족들이 힘을 합해 도우리라는 확신이 없는 마당에
어찌 경솔하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나단은 원로인 타보소초의 말을 듣고 마음을 진정시켰다.
“내 분한 마음으로 따지면 당장이라도 토둔의 목을 베고 싶지만
이 일은 나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오.
다른 부족장들이 이 일에 동의한다면, 내가 선봉에 서서 돌궐 놈들을 끝장내겠소.”
을지문덕은 원로의 방해로 나단이 거병(擧兵)하게 만드는 데는 실패했지만
그리 낙담하지는 않았다.
어차피 오라호부의 힘만으로
실위 땅에서 돌궐 세력을 몰아낼 수 있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그는 나단에게 자신이 설득에 나설 것이니 실위의 부족장들을 모아 달라고 부탁했다.
보름 후에 오소고부(烏素固部)·이새몰부(移塞沒部)·새갈지부(塞曷支部)·
화해부(和解部)·나례부(那禮部) 등 주변 부족의 추장들이
오라호부(烏羅護部)로 속속 모여들었다.
을지문덕은 회의 장소에 모여 앉은 추장들 앞에 나아가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다.
“어떤 무리든지 다른 민족에게 간섭받으며 노예처럼 사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시조이신 추모성왕(皺牟聖王)께서 나라를 건국하실 때만 해도
고구려는 비류수(沸流水) 가의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천하를 호령하는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백성들의 용기와 화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실위도 각 부족들끼리의 단합을 이루어 돌궐을 축출(逐出)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실위의 부족들은 대부분 수렵에 의존하고 있고
간간이 돼지와 소를 기르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래서는 부족민들이 생계를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더구나 돌궐의 토둔에게 착취를 당하니 당연히 부족민들이 굶주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돌궐 세력을 몰아내고 고구려와 교역을 한다면
수렵을 통해 얻은 짐승의 가죽과 사육한 돼지와 양을
실위에 필요한 철기와 식량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을지문덕의 말을 들은 실위의 추장들은 마침내 자신감을 얻었고
그 자리에서 돌궐을 몰아낼 항전을 봉기하기로 결의하였다.
“우리 함께 힘을 모아돌궐을 이 땅에서 몰아냅시다.
천하 만방에 우리 실위의 힘을 보여줍시다.”
을지문덕의 설득으로 남실위의 부족들은 하나로 뭉칠 수 있었다.
을지문덕은 실위 추장들에게 약속한 대로 군사 조련과 병장기 공급을 지원하였다.
이에 감복한 실위의 부족들은 그를 칭송하고 목숨을 바치겠다고 맹세했다.
이듬해,
나단이 이끄는 오라호부를 필두로 남실위의 부족들이 들고 일어나
그들의 땅에 뿌리 내리고 있던 토둔을 잡아 처형하고, 돌궐의 군대를 격퇴하였다.
남실위에서의 봉기는 북실위를 비롯한 주변 부족들에게 자극을 주었고,
그들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들의 땅에 자리 잡고 있던 토둔을 추방했다.
이로써 실위는 돌궐로부터 벗어나 자유와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12. 속말말갈의 배신행위를 응징하다
을지문덕이 말갈(靺鞨)과 실위(失韋)로부터 신망을 얻어 북변을 안정시키자,
영양태왕(嬰陽太王)은 그 공로를 높이 사서 을지문덕에게
북부욕살(北部褥薩)의 직책을 내려 부여성주(扶餘城主) 벼슬과 겸직하게 했다.
이로써 을지문덕은 북변을 총괄하는 막중한 직위에 올랐다.
을지문덕이 부여성주로 재직하는 동안
북변의 백성들은 유목민족의 침입에 대한 걱정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었으며,
말갈·실위 등과의 교역도 활기를 띠게 되었다.
그렇게 일 년이 지나자 백성들의 생활은 몰라보게 윤택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을지문덕이 부중에서 정사(政事)를 처리하고 있는데,
성주부의 입구를 지키는 군졸이 달려와 아뢰었다.
“대북진(大北鎭)에서 왔다는 상인이 성주님을 뵙겠다고 합니다.”
대북진은 오늘날 시베리아지역의 하바로브스크를 말한다.
“그렇다면 어서 들이도록 하라.”
을지문덕은 평소에 성주부의 문턱을 낮추어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했다.
잠시 후, 하얀 백곰 가죽을 짊어진 종자의 뒤를 따라
여우 가죽으로 만든 옷을 차려 입은 풍채가 좋은 사내 하나가 들어왔다.
눈이 시원하게 크고 수염이 무성한 것이 호남아라는 인상을 풍겼다.
“어서 오시오.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서 나를 찾아온 것이오?”
상인들이 성주를 찾은 것은 의례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였다.
을지문덕은 변방의 교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이들의 어려움을 돌봐주고 있었다.
“저는 대북진과 부여성을 오가며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이번에 대북진에 갔다가 기회가 닿아 북쪽에 흑수와 바다가 만나는 곳인
북빙해(北氷海)까지 가볼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날씨가 매우 추워서 사람이 살기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 순록(馴鹿)을 키우는 무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순록은 마치 사슴처럼 생긴 동물인데, 사슴보다는 몸집과 뿔이 훨씬 큽니다.
저는 이 동물이 하도 기이하여 가지고 있던 고구려의 물품을 건네주고
순록 한 무리를 샀습니다.
그것들은 지금 성주부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곰 가죽은 그들이 우정의 표시로 저에게 선사한 것입니다.
소인은 이 진귀한 것들을 태왕 폐하께 바치려고 하는데,
연줄이 없어 이렇게 성주를 찾아뵌 것입니다.”
을지문덕은 종자가 들고 온 백곰 가죽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과연 털이 희고 매끄러운 것이 고구려 땅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물건이었다.
이런 진귀한 물건을 구할 수 있다면
그곳까지 교역망을 넓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했다.
“순록은 나도 예전에 흑수부를 방문했을 때 본적이 있소.
그러나 백곰은 처음이오.
그 가죽이 참으로 아름답구려.
폐하께서 보시면 좋아하시겠소.
그대의 충심이 그러한데 내 어찌 돕지 않을 수 있겠소?
사람을 하나 붙여 줄 테니 그와 함께 따라 평양성으로 가시오.”
상인은 큰절을 올려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다음날 을지문덕은 말객(末客) 효농(效濃)을 불러 서찰을 건네주며 지시했다.
“왕궁에 도착하거든 이 서찰을 폐하께 올리거라.”
효농은 명을 받들고 상인과 동행하여 평양으로 향했다.
근 한 달이 지나서야 평양성에 도착한 효농 일행은
왕궁으로 가서 태왕께 알현을 청했다.
영양태왕의 허락이 떨어지자, 이들은 시종의 안내를 받아 편전으로 들어갔다.
“그래, 부여성에서 왔다고? 북부욕살은 무고한가?”
효농이 공손히 예를 갖추고 태왕에게 아뢰었다.
“예, 무탈하옵니다. 북부욕살이 폐하께 바치는 서찰이옵니다.”
시위가 나서서 효농에게서 편지를 받아 태왕에게 전했다.
서찰을 펼쳐 들여다보던 태왕이 상인에게 눈길을 주며 물었다.
“이 서찰에 따르면 네가 대북진보다 더 북쪽 지방인
북빙해에 다녀왔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태왕이 관심을 보이자, 상인은 금방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렇습니다. 정말 귀가 얼어붙어 떨어질 정도로 추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원하게 펼쳐진 푸른 바다와 눈 덮인 땅이 조화를 이루고 있고,
그 위로 사람과 털빛이 매력적인 순록이 어우러져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상인은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순록이 사는 부락을 아름답게 묘사했다.
북빙해란 오늘날 시베리아 오호츠크해와 캄챠카반도 지방을 말한다.
“그처럼 아름다운 곳이라면 짐도 한 번 가보고 싶구나.”
태왕이 관심을 보이자, 상인은 재빨리 백곰의 가죽을 펼쳐 보였다.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순백의 미는 사람들의 마음을 끌기에 충분했다.
“과연 호피에 비견할 만큼 돋보이는구나.”
태왕의 칭찬을 듣고 신이난 상인은 밖에 서 있던 다른 종자에게 눈짓을 해서
편전 앞마당으로 순록을 끌고 들어오게 했다.
기이한 모습의 짐승이 들어오자, 군신들이 함께 탄복했다.
“사슴 같지만 사슴은 아니구려.
마치 신선이 타고 다닌다는 전설의 신록(神鹿) 같구려.”
영양태왕은 한참 순록을 들여다보다가
좌우에 시립해 있는 신하들에게 시선을 주며 말했다.
“북부욕살 겸 부여성주 을지문덕은 서찰을 통해
대북진에 변민위로사(邊民慰勞使)를 파견하고,
흑수 하류에 살고 있는 부족민들과 교역을 권장함으로써
이들을 포용해야한다고 주청했소.
짐도 그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오.
이로 인해 우리 고구려의 힘이 더욱 멀리까지 뻗치게 될 것이오.”
신하들 역시 금방 그곳의 진귀한 특산물을 구경했기에
그들과 교류하는 것이 이득이 되리라 여겼다.
그래서 모두 태왕의 뜻에 찬성하였다.
영양태왕은 상인에게 큰상을 내리고 앞으로 북방 교역에 더욱 매진할 것을 부탁했다.
그리고 발위사자(拔位使者) 창평운(滄坪云)을 북방 변민위로사로 삼아
대북진으로 파견하였다.
<창평운>은 그곳에 부임한 이후, 북빙해까지 교류를 확대하였다.
이로써 고구려의 세력은 멀리 순록의 땅에까지 미치게 되었다.
이렇듯 변방 부족들에 대한 사전 정지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뜻하지 않은 사건이 터졌다.
송화강 중하류 유역에 있는 속말말갈(粟末靺鞨)이
난데없이 흑수말갈(黑水靺鞨)을 공격하여 십여 곳의 부락을 불태우고
1천여 명의 부녀자들을 포로로 잡아 갔던 것이다.
속말말갈은 송화강 강가의 산림지대에 살고 있던 말갈의 일종으로
그동안 고구려의 우방으로 충실하게 의무를 다해 왔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고구려는 든든한 후원자의 역할을 했다.
속말부는 고구려의 힘을 믿고 흑수부를 비롯한 이웃 부족들을 위협하여
가축들을 정기적으로 상납 받았다.
그런데 흑수부가 고구려 편에 서면서 동등한 입장에서 보호를 받게 되자,
속말부에게 바쳤던 공물을 중단했다.
이에 격분한 속말부가 흑수부를 쳤던 것이다.
흑수부의 전갈이 당도하자
을지문덕은 서둘러 영양태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다.
동시에 기총(旗總) 좌형도(左兄途)를 속말부에 보내
이 일에 대한 항의를 하도록 하였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흑수부를 약탈했는가?
이미 알다시피 저들은 우리의 충실한 속민이 되지를 않았느냐?”
평소에 고구려라면 쩔쩔매던 속말말갈족도 이번만큼은 강하게 반발했다.
속말부의 부족장 걸유서(乞由徐)를 대신해서
돌지계(突地稽)가 코웃음을 치면서 말했다.
“대국도 알다시피 다른 부족들은 넓은 초원에 위치하여 가축들을 쉽게 키울 수 있소.
허나 우리는 척박한 숲에서 근근이 살아가고 있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구려를 등에 업고 주위를 협박해서
가축들을 빼앗는 것이오.
그런데 부여성주 을지문덕이 흑수부와 통교함으로써 우리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소.
우리도 살아야 하니 어쩌겠소? 어디 마음대로 해보시오.”
돌지계는 원래 동옥저(東沃沮) 땅이었던
동해안의 해주(海州) 출신으로 신라로 귀화하여
제1차 여수전쟁(麗隨戰爭) 때에는 신라군의 밀정으로 활동하면서
신라가 고구려 남부 땅을 잠식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그러나 제1차 여수전쟁이 고구려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자
이에 위협을 느낀 신라는 602년에 군사를 간성으로 물렸다.
이때 돌지계도 같이 도망치려 했지만
신라 측으로서는 효용가치가 없어진 밀정을 더는 거둘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돌지계는 고구려나 신라 어느 쪽으로도 돌아갈 수 없는 신세가 되었다.
그후,
그는 혈혈단신으로 이리저리 떠돌다가 압록수를 넘어 송화강 유역까지 흘러들었다.
돌지계가 속말말갈족이 사는 땅에 도착해 보니 모든 것이 열악했다.
그들은 숲의 나무 위에 오두막을 만들고 싸리로 만든 화살로 멧돼지나 사냥하면서
근근이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기술과 지식을 동원하여 말갈 사람들을 깨우쳤다.
그러자 부족장은 크게 기뻐하며 자신의 딸을 내려 사위로 삼았다.
그리하여 돌지계는 금세 부족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송이버섯과 밤, 그리고 건어(乾魚) 등
그대들의 물품을 비싼 값에 구입하고 곡식과 베를 싸게 공급하고 있지 않는가?
이제는 흑수부도 한 식구가 되었으니 서로 다투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나?”
좌형도는 좋은 말로 설득했지만 쇠귀에 경 읽기였다.
“우리가 잡은 포로들을 노비로 팔면 곡식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소.
그러니 가서 성주님께 전하시오. 우리도 이제는 자립하겠다고.”
좌형도는 돌지계가 고구려에 반기를 들 요량임을 간파했다.
그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곧장 부여성으로 돌아왔다.
을지문덕은 이번 일을 절대 좌시할 수 없다고 여겼다.
고구려의 천하 질서를 어지럽히는 무리는 무력(武力)으로 응징함으로써
그동안의 유화책(宥和策)으로 인해 다른 마음을 품고 있을지 모를 변방의 부족들에게
경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었다.
때마침 영양태왕도 전령을 보내 5천명의 기병으로
속말부를 정벌하라는 어명(御命)을 내렸다.
을지문덕은 부하 장수인 효농과 좌형도를 데리고 3천여 명의 군사를 인솔하여
송화강의 중류에 있는 속말수(粟末水)로 행군하였다.
을지문덕은 화공(火攻)을 쓰면
숲에서 생활하는 말갈족에게 생활 터전이 없어진다는 우려에서
배를 타고 속말수를 따라 나아가 숲 속의 말갈 군사를 피하여
강가에 있는 마을을 점령하기로 하였다.
말갈족들이 살고 있는 숲에는
사람과 가축이 마실 물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이용하기로 한 것이다.
을지문덕의 전략에 따라 고구려군은 제때에 속말수에 도착한 흑수부의 전사들과 함께
신속하게 강을 거슬러 올라가 인근의 큰 부락 대 여섯 개를 일시에 들이쳤다.
강변 마을에 대한 고구려군의 기습적인 공격은
숲에서 전투를 치르려던 돌지계의 작전을 무력화시켰다.
본거지를 잃은 속말말갈의 부족장 걸유서는
할 수 없이 부하들을 이끌고 을지문덕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었다.
그는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빌었다.
한편 돌지계는 후환이 두려워 자신을 따르는 무리와 더불어
야음을 틈타 거란족이 모여 사는 요서의 송막을 향해 도망쳤다.
13. 아버지와 형제를 죽이고 황제가 된 양광(楊廣)
604년에는 수국(隨國)의 황실에 패륜적(悖倫的)인 사건이 일어났다.
문제(文帝) 양견(楊堅)이 아들인 양광에 의해 살해되고
폐태자(廢太子) 양용 역시 죽임을 당했던 것이다.
문제에게는 다섯 명의 왕자가 있었는데
첫번째 아들은 방릉왕(房陵王) 양용(楊勇),
두번째 아들은 진왕(晉王) 양광(楊廣),
세번째 아들은 진왕(秦王) 양준(楊俊),
네번째 아들은 촉왕(蜀王) 양수(楊秀),
다섯번째 아들은 한왕(漢王) 양량(楊諒)이었고그 외에 네 명의 딸이 더 있었다.
이들 가운데 가장 귀족들로부터 선망과 지지를 얻고 있었던 인물은 바로 양광이었다.
양광은 진국(陳國) 정벌전(征伐戰)을 총지휘했고,
북방 돌궐의 침입을 방어하는 전투에서 매번 큰 공을 세우면서
많은 인재들을 모을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일찍부터 맏형 양용이 차지한 태자의 자리를 엿보았다.
양용이 여색을 밝히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일삼아 점차 문제의 환심을 잃게 되자
양광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영역을 공고히 해 힘을 과시했다.
문제가 검소하고 소박한 생활을 하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양광은
거짓수작을 꾸며대면서 문제에게 잘 보이려고 애썼다.
문제가 진왕부로 올 때마다 그는 호화롭게 몸단장한 애첩을 숨겨놓고
무명옷을 입은 늙은 여인들만 자신의 시중을 들게 했다.
그리고 일부러 비파(琵琶) 줄을 끊어놓은 다음 비파에 묻은 먼지도 털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아두곤 했다.
문제는 그런 광경을 보고 양광이 여색을 즐기지 않으며
청렴한 성품을 지녔다고 칭찬하고는 흡족해했다.
황태자 양용은 어머니인 문헌황후(文獻皇后) 독고씨(獨孤氏)가 짝지어 준
태자비(太子妃) 원씨(元氏)를 사랑하지 않아 그녀와 마주앉아 식사하는 것도 꺼리고
단 한마디도 대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연히 만난 운소훈(韻蘇薰)이라는 기녀(妓女)를 사랑하여
밤마다 그녀를 자신의 침소로 불러 애정행각을 벌였으며
태자비와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태자비는 궁궐에 들어온 지 두 달만에 병사(病死)했는데
문헌황후는 양용이 태자비를 독살한 것이라고 여기며
태자를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양광은 어머니가 맏형을 미워한다는 것을 알고 문헌황후에게 더욱 곰살궂게 굴었다.
황제나 황후가 보내오는 사람이면
그 직위가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연회를 베풀고 처와 같이 동석하곤 했다.
그는 또 권세가 있는 대신들에게도 선심 베풀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대신들과 황실의 사람들은 저마다 진왕이야말로 인의 도덕이 있다고들 말했다.
이에 문헌황후는 양광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한번은 양광이 장안을 떠나 양주로 돌아가게 되었다.
문헌황후와 작별할 때 그는 능청스럽게도 이별하기 아쉬운 듯 눈물을 흘리면서
태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어머니를 다시 만나지 못할까 봐 걱정된다고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이에 황후는 몹시 격분했다.
“내가 살아 있는데도 그런 수작을 하니 내가 죽은 다음에는 무슨 짓인들 못하겠는가?”
문헌황후는 양광에게 자기의 부름 없이는 함부로 장안으로 올라오지 말고
동궁으로 아예 가지 말라고 당부했다.
양광은 문헌황후의 마음을 알고 은근히 기뻐했다.
양광이 양주로 돌아오자 우문술(宇文述)이 그에게 한 가지 계책을 말했다.
“태자를 폐하는 것은 아주 큰일이니 마땅히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 임금님과 대신들이 모두 다 양소(楊素)를 몹시 신임하고 있으므로
양소의 지지를 받는다면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소는 그의 아우인 양약(楊若)을 더없이 사랑하므로 저와 양약은 잘 알고 있는 사이니
제가 장안으로 가서 이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양광은 몹시 기뻐하며 우문술에게 금은보화를 주고 장안(長安)으로 보냈다.
우문술은 장안에 당도하자마자 양약을 초청해 주연을 베풀었다.
양약이 골동품을 아주 좋아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그는
미리 여러 가지 보물들을 객실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아두었다.
양약은 골동품들에 호기심이 끌려 이것저것 만져보면서 연신 감탄을 늘어놓았다.
술상을 물린 뒤 우문술은 보물을 걸고 바둑을 두며 일부러 몇 번 져주었다.
보물을 절반 이상 따게 된 양약은 기뻐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때 우문술이 입을 열었다.
“이 진주보물은 진왕께서 양공(楊公)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양약은 의아하게 여기며 물었다.
“무슨 뜻인지요?”
우문술은 웃으며 말했다.
“이만한 선물이 뭘 그리 대단하다고 그럽니까?
진왕께서는 양공과 월국공(越國公:楊素)이
부귀영화(富貴榮華)를 누릴 수 있게 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에 양약은 더욱 놀라며 물었다.
“내가 지금 부귀영화를 누린다 말할 수는 없지만
나의 형 양소는 부러울 게 없이 잘 살고 있소.
그런데 진왕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게 해 주신단말이오?”
우문술이 대답했다.
“두 분 형제가 지금은 비록 부러울 것 없이 잘 살고 있다 하지만
영원히 부귀영화를 누리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월국공은 오랫동안 권력을 쥐고 있어
숱한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태자께서 하는 일을 늘 반대하셨으니 태자께서는 월국공을 좋아하지 않지요.
만약 지금의 황제께서 붕어(崩御)하신 다음에 태자께서 즉위하면
월국공을 그대로 보고 있겠습니까?”
우문술의 말을 듣고 양약은 초조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렇다면 무슨 좋은 수가 없겠소?”
우문술이 양약의 귓가에 대고 말했다.
“지금 황제 페하내외께서는 태자를 폐하고 진왕을 신태자(新太子)로 세우려 하시지만
고경(高熲)과 하약필(賀若弼)이 강력하게 반대하여
쉽게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계십니다.
양공이 적절한 때에 거들어주시면 큰 공을 세우는 겁니다.
진왕께서 부귀영화를 약속하고 계신다니까요.”
양약은 연신 머리를 끄덕였다.
양약은 양소를 만나 우문술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전해주며 이해득실을 따져주었다.
양소도 쉽게 동의했다.
며칠이 지난 뒤 양소가 문헌황후에게 아뢰었다.
“진왕께서는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극진합니다.
평소에 검박하게 지내는 모습도 폐하를 우러러 뵙는 듯합니다.”
황후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옳은 말이지.
진왕은 효성이 지극하나 나와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가슴이 아프다네.”
양소는 붙은 불에 부채질하듯 태자를 헐뜯었다.
황후는 양소의 말이 자신의 마음과 꼭 들어맞는다고 생각하면서
태자 양용을 폐하고 양광을 태자로 세우도록
조정의 신료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얻는 일을 당부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양용은 몹시 두려움을 느꼈다.
이때 문제가 양소를 태자궁에 보내 치국(治國)에 대해 강의하게 했다.
양소는 태자의 마음을 건드리고자 동궁에 이른 뒤에
일부러 지체하면서 궁전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양소가 들어오지 않자 양용은 노발대발했다.
양소는 돌아가 문제에게 이렇게 말했다.
“태자께서는 폐하께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당도하자마자 화를 냈는데 아무래도 뜻밖의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폐하께서는 여러모로 방비를 강화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문제는 양소의 말을 곧이듣고 사람을 풀어 양용을 감시하도록 했다.
양광은 태자의 측근인 희위(希慰)를 매수했다.
희위는 태자를 고발하는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태자께서는 늘 점쟁이들을 찾아 점을치곤 하는데,
점괘에 나오기를 개황(開皇) 18년에 황제께서 눈을 감게 되니
때가 오래지 않았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글을 보자 문제(文帝)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양용이 이렇게도 지독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구나.”
문제는 드디어 양용을 체포하라는 어명을 내리고 나서
양소에게 책임지고 심문하게 했다.
600년에 문제는 양용을 폐위시켜 평민으로 강등시키고 난 다음
양광을 태자로 책봉했다.
양광이 태자의 자리를 차지한 지 4년이 지나 문제가 중병으로 눕게 되었다.
때가 돌아왔다고 생각한 양광은 문제가 죽은 후에 뒷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내용의 친필편지를 양소에게 보냈다.
그런데 양소의 회답편지가 그만 문제의 손에 들어가고 말았다.
문제는 편지를 본 다음 크게 노하여 양광을 불러 문책하려 했다.
그런데 문제의 애첩인 선화부인(宣華夫人) 진씨(陳氏)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당황한 기색으로 뛰어 들어왔다.
그러면서 문제의 침소 앞에서 엎드려 울면서
태자 양광이 자기를 성추행했다고 하소연했다.
문제는 침상을 탕탕 내리치며 분노를 터뜨렸다.
“이 짐승 같은 녀석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는 중책을 떠맡는다는 말이냐?
아, 황후가 대사를 그르쳤구나!”
문제는 곁에 서 있는 유술(劉述)과 원암(元巖)에게
폐태자 양용을 데려오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소식을 들은 양광과 양소는
급히 가짜 조서(詔書)를 작성하여 병사들을 거느리고 인수궁(仁秀宮)을 포위했다.
황제의 명을 받고 떠나려던 유술과 원암은 밧줄에 꽁꽁 묶여 감금되었다.
인수궁을 지키던 황제의 근위병들은 무장 해제되고
동궁의 보위병들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한참 뒤 문제의 침소에서 나온 사람은 양광의 측근인 장형(藏炯)이었다.
그는 한 곳에 몰려 꿈쩍거리지도 못하는 환관들에게 소리쳤다.
“폐하께서 운명하신 지 오래인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이때까지 품신(稟申)하지 않았느냐?”
궁전 안팎 사람들은 아연실색했지만 누구 하나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문제는 이렇게 둘째 아들인 양광에 의해 피살되고 말았다.
이어 양광은 자결하라는 황제의 명령이 담긴 칙서(勅書)를 꾸며 양용에게 보냈다.
양용이 대답하기도 전에 칙서를 가지고 간 우문지급(宇文智及)이
양용을 끌어내려 교살(絞殺)하였다.
그 해 7월에 양광이 드디어 수국(隨國)의 두 번째 황제로 등극하였으니
그가 ‘제2의 시황제(始皇帝)’로 일컬어지는 양제(煬帝)였다.
황위를 차지하기 위해 아버지와 형마저 서슴없이 죽인 양제였으니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잔혹했던지는 말하지 않아도 능히 알 수 있는 일이다.
14. 양제의 대운하 건설
수황(隋皇) 양제(煬帝) 양광(楊廣)은 수나라의 임금 자리에 오르자마자
자신의 독선적인 성격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나타냈다.
그는 자신이 황제로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가졌다고 여겼기 때문에
누구도 자신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양제는 605년에 1백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해
동도(東都) 낙양(洛陽)을 새롭게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 토목공사는 규모가 아주 방대했다.
매달 백성들에게 강남에서 희귀한 돌과 재료를 날라오게 했다.
목재는 강서로부터 운반해왔는데
나무기둥 한 대를 끄는 데만 해도 2천 명의 인부가 있어야했다.
나무기둥 전부를 낙양까지 가져오려면 수십 만 명이 필요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인부가 지쳐 쓰러지고 사고로 죽기까지 하였다.
농번기(農繁期)에도 부역(賦役)에 동원하고 각종 세금을 부과하여 고혈을 쥐어짜자
여기저기에서 백성들의 원성이 드높았다.
그러나 양제는 백성들의 숱한 희생에도 만족할 줄을 몰랐다.
그는 낙양 서쪽에 서원(西圓)이라고 하는 큰 화원을 수축하게 했다.
서원은 그 둘레가 자그마치 2백 리였고, 그 안에 인공호수를 만들고
그 호수 한가운데에 높이가 백여 자 되는 섬을 세 개나 만들었다.
섬에는 절묘한 형상을 한 정자와 누각을 세웠다.
호수 북쪽에는 굽이굽이 흘러 호수로 들어오는 용진거(龍進渠)라는 물도랑이 있었고,
그 용진거를 따라 별장이 열여섯 채나 지어졌다.
모두 황제의 첩들이 관리하는 이 별장은 저마다 화려함을 뽐내고 있었다.
서원은 짙은 봄기운이 자욱하도록 장식해놓았다.
가을에 궁전의 나뭇잎이 떨어지면
고운 비단으로 꽃잎을 만들어 나뭇가지에 달아놓았고,
겨울에 양제가 이곳에 오면 못의 얼음을 깎아내고
비단으로 연꽃과 연꽃잎을 만들어 물 위에 띄웠다.
또 원내에는 여러가지 기이한 조류와 짐승들을 길러서
황제가 그것들을 구경도 하고 사냥도 할 수 있게 했다.
밤이면 양제는 늘 수천 명의 궁녀들을 서원으로 데리고 가서
풍악을 울리고 술을 마시면서 달구경을 했다.
양광은 이에 그치지 않고 대운하(大運河) 계획을 발표했다.
남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남북 간의 물자교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진행하는 공사라고 밝혔지만 동도의 역사(役事)로 인해
부역과 조세에 시달리던 백성들에게 있어 대운하 건설은 재난이나 마찬가지였다.
맨 처음 통제거(通齊渠)가 개통되었다.
통제거는 낙양 서원에서 시작하여 동쪽으로 회하의 산양(山陽)에 이르러
낙수·황하·회하와 합수된 다음 춘추시대 오국(吳國)에서 개통한 한구(限勾)와 만나
장강으로 흘러들어갔다.
이 구간의 공사는 그 해 가을에 완공되었다.
운하의 수면 너비는 40보(步)였고 운하 양안에 대통로까지 만들었다.
대통로 양쪽에는 느릅나무와 버드나무를 심었는데,
낙양에서 강도(江都)까지의 2천여 리 길에 이 나무들이 무성했다.
운하의 언덕에는 두 개의 역사(歷舍)를 지날 때마다 황제가 휴식할 수 있도록
재궁(齋宮)을 한 채씩 지었는데 낙양과 강도 사이에 무려 40여 곳이나 세워졌다.
이어 또 남쪽과 북쪽 두 방향으로도 대운하를 뻗게 했다.
북쪽으로 뻗은 운하는 영제거(永齊渠)라고 했다.
심수(沁水)를 황하(黃河)로 끌어들인 영제거는 탁군(涿郡)까지 닿았다.
장강 남쪽에 뺀 운하는 강남하(江南河)라고 했다.
경구(京口)로부터 시작한 강남하는
장강의 물을 전당 강변의 여항(余杭)까지 들어가게 했다.
그 길이가 4·5천리에 이르며 해하, 황하, 장강, 전당강을 이어놓은 이 대운하는
6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전부 완성되었다.
남북 지역의 물류유통과 교통을 편리하게 해준 대운하는
남북의 경제, 문화교류를 촉진하는 데 기여했음은 말할 것도 없었다.
운하의 양안에는 번화한 도시들이 많이 들어섰다.
이 거대한 공사에는 무려 1억 5천만 명의 인원이 동원되었다.
그때 전국의 호수가 8백 90만 호였으니 호당 평균 20명의 노동력이 동원된 셈이 된다.
통제거를 구축하는데만 해도 1백여만 명의 인부가 동원되었는데
그 중에서 3분의 2가 공사장에서 죽었다고 전해진다.
양제는 운하가 완성되기도 전에 이미 배를 만들게 했다.
그는 605년 가을에 그 배로 숱한 수행인원을 데리고 강도(江都)에 가서 유람했다.
양제가 타는 배를 용주(龍舟)라고 했다.
길이가 2백자나 되며 4층으로 된 이 배에는 제일 위층에 정전(正殿)과 내전(內殿)
그리고 동서 조당(朝堂)이 있었고
중간의 두 층에는 환관이나 내시들이 드는 방이 있었다.
배를 끄는 사람을 전각(殿脚)이라고 했는데
용주를 움직이는 전각이 1천여 명에 달했다.
그 뒤로 비빈과 대신들, 승려, 도사들을 태운 수천 척의 화려한 배들이 뒤를 따랐는데,
그 행렬의 길이가 2백여 리에 달하고,
운하 양안에는 기병대가 배를 호위하며 줄지어 따랐다.
호위병들이 펄럭이는 깃발은 또 다른 수로를 만들었고,
색색의 물결이 요동치고 있었다.
양제는 낮에는 배 위에서 마음껏 노닐며 주위의 경관을 감상하고
밤이 되면 불을 대낮처럼 밝히고 연회를 베풀어 즐겼다.
흥을 돋우기 위한 북소리가 사방으로 울려 퍼져나가면
주변 오백여리 안에 사는 백성들은 그 지방의 진귀한 음식을 가져다 바쳐야 했다.
백성들은 이로 인해 가산을 탕진했지만 음식은 양제의 일행이 배불리 먹고 난 뒤에도
남아서 떠날 때 구덩이를 파고 묻어야만 했다.
완성된 수로를 직접 눈으로 살피고 지방의 민심을 파악하기 위해서
직접 대운하를 따라 순행(巡幸)에 나선 양제는 호화로운 유람을 즐기며
통제거를 지나 한구의 초입인 산양 부근에 이르렀다.
그런데 앞에서 길을 안내하던 선도선(先導船)이 갑자기 멈추어 서자
이에 자연히 뒤를 따르던 배들도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되었다.
용주가 멈추어 서자 한참 술잔을 기울이고 있던 양제가 의아하여 물었다.
“벌써 도착했을 리는 없을 텐데, 어찌하여 배를 세우느냐?”
대작을 하고 있던 대신들 역시 연유를 모르기는 마찬가지였다.
양제의 옆에 서 있던 시위장이 밖으로 나가 선도선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돌아와서 아뢰었다.
“수로의 깊이가 계획보다 얕아서 선체가 큰 용주는 지날 수 없다 하옵니다.”
그러자 술기운으로 붉었던 양제의 얼굴이 노기로 인해 검붉은 빛으로 변했다.
“아니, 짐이 지시한 일을 어찌 이리도 소흘히 할 수 있단 말이냐?
이는 곧 짐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다.
이러고도 저놈들이 정녕 살아남기를 바란단 말이냐?”
양제는 자신의 명령을 어기는 일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항상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지극히 엄격했다.
이때 양소(楊素)가 황급히 나섰다.
“이는 필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찌 감히 저들이 폐하를 능멸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간의 공사 책임을 맡고 있는 양산태수(陽山太守)는
그의 조카인 양각(楊覺)이었다.
양제의 포악하고 충동적인 성격을 잘 알고 있는 양소로서는
양각의 신상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미 양제의 귀에는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는 듯했다.
“지금 전국에서는 짐의 명에 의해 역사에 길이 남을 대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만일 저놈들처럼 짐의 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어찌 다른 지역에서 짐의 권위가 존중받기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이번 일을 거울로 삼지 않는다면 짐의 의지가 천하에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 없으리라.”
명령을 받고 출동했던 금위병들에 의해
양산태수를 비롯한 수십 명의 아전들이 끌려 왔다.
양제 앞에 무릎 꿇려진 양각의 얼굴은
핏기라곤 찾을 수 없을 만큼 하얗게 질려 있었다.
“네놈이 감히 짐의 명을 우습게 여기고도 살기를 바랐단 말이냐?”
양제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양각은 두려움으로 인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찌 소신이 감히 손톱만큼이라도 폐하를 능멸할 마음을 먹었겠습니까?
이는 수로 설계상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일입니다.
소신이 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기는 하지만 기술적인 문제는 전적으로
공부(工部)에서 파견된 기술 감독관의 일입니다.”
이 당시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대운하의 공사를 위해서 공부 소속의 관리들과
차출된 장인들이 각 지방에 파견되어 있었다.
금위병들에게 끌려온 무리들 속에는 이들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들도 섞여 있었다.
“저들 역시 책임을 면할수 없다.
이는 이번 역사에 참여했던 자들 모두의 잘못이다.
그중에서도 한 지방을 맡고 있는 관장으로서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네놈의 뻔뻔함은 정말 참기 어렵구나.”
양제는 도열해 있는 금위병들에게 명령했다.
“여봐라. 저놈을 비롯해서 이번 공사와 관계가 있는 자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산 채로 수장(水葬)시키도록 하라. 내 이번 일을 만천하에 본보기로 삼겠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대신들은 경악으로 인해 벌어진 입을 다물 수 없었다.
하지만 누구도 나서서 이를 말리지 못했다.
이리하여 양제의 명령에 따라 양산태수를 비롯해서 중앙에서 파견된 감독관과 장인들,
그리고 수로를 만드는 부역에 동원됐던 백성들까지
수만에 이르는 목숨이 수로 밑바닥에 수장되었다.
이에 양산 지역에서는 통곡 소리가 끊이지를 않았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각지의 백성들은 양제의 흉폭함과 잔인함에 치를 떨었다.
이사건 이후로, 양제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품고 있던 백성들조차
그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렸다.
하지만 이것은 백성들에게 있어 시련의 시작에 불과했다.
양제의 광기는 이미 고삐를 풀고 내달리는 야생마 그 자체였다.
양제는 민심의 동향과는 상관없이 고구려와의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있었다.
15. 돌궐 땅에서 양제와 논쟁을 벌인 을지문덕
『수서(隋書)』에는 수황(隋皇) 양제(煬帝) 양광(楊廣)이
돌궐(突厥) 땅을 순행(巡幸)하러 왔다가
계민가한(啓民可汗)을 만나러 왔던 고구려의 사신과조우(遭遇)하여
“너희 나라로 돌아가거든 고구려의 국왕에게 이렇게 전해라.
당장 입조(入朝)하지 않으면 너희 나라를 칠 것이라고”
하고 위협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고구려의 사신은 마치 양제의 경고에 아무 반박도 못한 채
쫓기듯이 돌궐 땅을 떠난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단재(丹齋) 신채호(申采浩) 선생은『을지문덕전(乙支文德傳)』에서
이때에 양제와 우연히 만난 고구려의 사신이 다름 아닌 을지문덕이며
『비망열기(備忘烈記)』를 인용해 을지문덕이 양제와 논쟁을 벌였다고 서술했다.
만약 단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을지문덕은 어떻게 돌궐 땅에서 양제와 만나게 되었던 것일까?
동돌궐(東突厥) 최고의 지도자인 계민가한(啓民可汗)은
실위(室韋)가 자신들을 배신하도록 조장했다는 이유로
607년에 좌현왕(左賢王) 처라(處羅)에게 3만 대군을 주어
고구려의 북변을 침공하도록 했다.
그러나 부여성주(扶餘城主) 겸 북부욕살(北部褥薩) 을지문덕(乙支文德)은
이미 실위의 부족들로부터 돌궐에 대한정보를 받아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방어전(防禦戰)을 준비하고 있던 터였다.
그는 자신이 고안해둔 검차(劒車)라는 병기(兵器)를 배치시킨 곳에
보병(步兵) 7천여 명과 중장기병(重裝騎兵) 3천여 명을 매복시킨 뒤
말객(末客) 효농(效濃)에게 이들의 인솔을 맡겼다.
그리고 자신은 보병 3천여 명과 기마궁수(騎馬弓手) 1천여 명을 거느리고
적군에게 싸움을 걸어 침착하게 돌궐의 기병들을 함정으로 끌어들였다.
돌궐군은 을지문덕의 군대에 기병의 수효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업신여기고
유인전(誘引戰)에 말려들어 추격해오다 검차를 앞세운 고구려군의 공세에
무려 1만 명 남짓한 사상자가 나오는 큰 타격을 받아 섬멸되었다.
좌현왕의 군대가 너무도 쉽게 대패하자,
돌궐의 군주 계민가한은 고구려의 막강한 군사력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래서 고구려와 싸우기보다는 우호 관계를 맺는 쪽을 택했다.
계민가한이 화평을 청해 오자,
영양태왕(嬰陽太王)은 을지문덕을 사신으로 보내 돌궐의 내정을 살피고
그들의 기를 꺾어놓게 했다.
태왕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을지문덕이 돌궐 칸의 장막에 당도하자,
계민가한이 몸소 나와 그를 맞이했다.
“먼 길을 오느라 고생많았소. 내 장군의 명성은 익히 듣고 있었소.”
계민가한은 애써 고구려사신의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을지문덕은 싸늘한 표정으로 힐난한다.
“돌궐의 군사들이 우리의 국경을 넘은 것은 명백한 도발 행위였소.
그런데 이제 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화평을 맺자는 것이오?
도대체 돌궐의 진심은 무엇이오?”
계민가한은 쩔쩔매며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것은 일부 부족장들이 나의 뜻을 곡해해서 생긴 어처구니없는 사건이었소.
그 일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하오.
내가 이 자리에서 명백히 밝히겠는데, 우리는 결코 고구려와 싸울 뜻이 없소.”
계민가한이 이처럼 저자세로 나오자, 을지문덕도 낯을 펴고 어조를 부드럽게 했다.
“우리 고구려도 돌궐과 싸우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돌궐이 다시는 우리의 땅을 침범하지 않겠다는 약조만 한다면
두 나라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 당장 약조하리다.
그러니 고구려로 돌아가거든 태왕 폐하께 말씀 좀 잘 해주시구려.”
을지문덕은 이 정도에서 계민가한의 마음을 풀어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더 다그치다가 자칫 계민가한이 모욕감을 느끼기라도 한다면
두 나라의 관계가 다시 적대시하는 지경에이를 수도 있었다.
수나라와의 전쟁이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돌궐을 끌어안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했다.
을지문덕은 적당히 계민가한의 기를 꺾어놓는 선에서 그와 타협을 보았다.
“좋습니다. 이번 협정이 앞으로 양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리하여 돌궐과 고구려는 상호불가침을 포함한 우호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를 했다.
계민가한은 성대한 연회를 열어 고구려의 사신으로 온 을지문덕을 극진히 대접했다.
을지문덕은 돌궐의 내정을 살피는 임무를 띠고 있었기에
계민가한 및 그의 신하들과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담소를 나누었다.
을지문덕이 계민가한의 장막을 찾은 지 나흘째 되는 날에
계민가한을 호위하는 무사인 판찰소탁(辦察昭拓)이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뛰어 들어 오더니 다급하게 말했다.
“수국(隋國)의 황제(皇帝)가 당도했습니다.”
계민가한이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
“아니, 기별도 없이 어쩐 일이란 말이냐?”
돌궐은 수나라와 동맹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앙숙인 고구려 사신과 함께 있는 모습을
수황(隋皇)에게 들켜서 좋을 것이 없었다.
“대인께서는 아무래도 이곳을 피하시는 것이 좋겠소.
수주(隋主)를 만나봐야 그대의 신상에 이로울 게 없지 않겠소?”
계민가한이 초조한 모습으로 말했지만 을지문덕의 표정에는 여유가 넘쳤다.
“진작부터 수주 양광을 만나보고 싶었는데, 잘 되었습니다.
저를 그에게 소개해 주십시오.”
계민가한은 난처했지만
을지문덕의 뜻을 꺾을 수 없어 그대로 장막 안에서 기다리게 했다.
계민가한은 장막 밖으로 나가 양제(煬帝)를 데리고 들어왔다.
양제의 뒤로 수행한 대신들이 줄줄이 모습을 드러냈다.
모두 수국(隋國)에서 고위급 관직을 지내는 인물들이었다.
계민가한은 양제에게 손님에 대한 예를 취하여 상석을 권했다.
그 옆에 계민가한이 앉고 양국의 신하들이 좌우에 도열했다.
을지문덕은 돌궐의 대신들 틈에 섰다.
“짐은 돌궐의 군대가 고구려와의 싸움에서 패배했다는 말을 듣고
위로도 할 겸 이렇게 찾아왔소.”
양제는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운을 떼었다.
“뭐 대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국경에서 작은 분쟁이 있었을 뿐입니다.”
계민가한은 말하면서 을지문덕의 눈치를 힐끔힐끔 보았다.
을지문덕은 매서운 눈길로 양제를 노려보고 있었다.
“우리나라 역시 고구려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았소.
동쪽에 고구려가 도사리고 있는 한 우리의 국경은 한시도 편할 날이 없을 것이오.
그러니 이번 기회에 서로 힘을 합쳐 고구려를 정벌해서
앞날의 근심을 더는 것이 어떻겠소?”
양제는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오싹할 정도로 차가웠다.
만일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돌궐을 먼저 칠 수 있다는 무언의 협박과 다름없었다.
계민가한은 두 마리호랑이 사이에 놓인 사슴처럼
어느 쪽을 선택할지 몰라 안절부절하였다.
그때였다.
돌궐 대신들 사이에 서 있던 을지문덕이 앞으로 나서며 양제를 보고 소리쳤다.
“말로는 화평을 주장하면서 뒤에서 흉계를 꾸미고 있으니
어찌 이를 올바르다고 할 수 있겠는가?”
좌중의 시선이 일제히 을지문덕에게 향했다.
계민가한은 눈이 휘둥그래지고 얼굴빛이 사색이 되어 금방 숨이 넘어갈 듯 했다.
그런데 양제는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이 이삼십 대 초반의 당돌한 청년을 쳐다보았다.
이때 수국의 황문시랑(黃門侍郞) 배구(裵矩)가 나서 을지문덕을 꾸짖었다.
“너는 누군데 건방지게 군주들의 대화에 끼어드느냐?”
을지문덕은 당당하게 대답했다.
“나는 고구려의 북부욕살인 을지문덕이라 하오.”
고구려의 관리란 말에 양제의 인상이 일그러졌다.
그는 힐난의 눈길로 계민을 쳐다봤다.
계민가한은 무척이나 당황했는지 애써 눈길을 피하며 헛기침을 했다.
양제는 다시 을지문덕에게 시선을 주며 물었다.
“고구려의 사신이 이곳에는 무슨 일로 왔는가?”
“태왕 폐하의 명을 받고 돌궐과 친선을 도모하고자 왔소.”
초원을 지배하는 돌궐의 지도자마저 수나라의 황제 앞에서 쩔쩔매는데,
이 고구려인은 당당한 기상을 드러내며 양제와 맞서고 있었다.
“사해 만국이 서로 화평을 도모하고 어려울 때 돕는 것은
아름다은 덕(德)이라 할 수 있다.
짐도 고구려와 돌궐이 사이좋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
허나 고구려의 지난 행적으로 볼 때 어찌 이를 선의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양제는 스스로 지혜가 넘친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세상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과 유려한 말솜씨로는 자신을 당할 자가 없다고 여겼다.
그래서 고구려의 사신을 변설로서 굴복시켜 보겠다고 마음먹었다.
“고구려의 지난 행적이라 함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오?”
양제는 목청을 가다듬고 포문을 열었다.
“고구려는 본시 비류수(沸流水)가의 작은 나라였는데,
담덕(談德)에 이르러 주변의 부족들을 무력으로 정벌하고 강제로 병합하면서
지금의 영토에 이른 것이 아닌가?
근래에 와서도 고구려는 형제나 다름없는 남방의 백제와 신라를 수시로 괴롭히고
하루도 손에서 창과 칼을 놓은 날이 없다고 하니
어찌 평화를 바란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번 돌궐과 화친을 도모하는 이유 역시
이들을 안심시킨 후에 불시에 치려는 의도일 것이다.”
을지문덕은 양제의 독설(毒舌)을 듣고 도리어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았다.
“그대의 말은 하나도 맞는 게 없소.
우리나라의 시조(始祖)이신 추모성왕(皺牟聖王)께서는 하늘의 뜻에 따라
조선(朝鮮)을 계승하는 고구려를 세우시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자 힘쓰셨소.
그 후 고구려의 역대 태왕들께서는 추모성왕의 뜻에 따라
백성들을 덕으로써 다스리고, 주변국들을 인의(仁義)로써 대하셨소.
그러다 보니 자연 이에 감복한 주변국들이 복속을 청해왔고,
고구려는 이를 매정하게 내칠 수 없어 받아들였던 것이오.
그리고 광개토태왕(廣開土太王)께서는
한 번도 대의(大義)에 어긋한 거병(擧兵)을 한 적이 없으시오.
단지 우리의 국경을 지키거나 소국의 간곡한 구원요청을 뿌리치지 못해
군사를 내었을 뿐이오.
그때 그분의 기상과 고구려의 앞선 문화에 매료된 그 지역의 군민들이
고구려의 보호를 자청했기에 이를 받아들였을 뿐이오.
광개토태왕께서는 늘 사해(四海) 만민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쓰셨던 분이오.”
을지문덕은 잠시 말을 멈추고 양제의 안색을 살폈다.
양제는 눈에 띄게 여유를 잃어가고 있었다.
을지문덕은 마지막 숨통을 끊어 놓는 일격을 가했다.
“근래에 와서 고구려는 주변국들의 침입으로 골머리를 썩이고 있소.
최근 백제나 신라와 충돌했던 것도 그들의 도발을 참다못해 일어난 것이오.
그 가운데서도 수국의 탐욕은 도를 넘어서고 있소.
진국(陳國)을 차지한 것도 모자라 쥐새끼처럼 몰래 군사를 움직여
우리의 땅을 빼앗으려 하지 않았소?
우리의 천군(天軍)이 격노하여 물리치기는 했지만
앞으로 또 다른 도발이 없으리라 장담할 수 있겠소?
이렇게 볼 때 돌궐이 조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 고구려가 아니라 바로 당신네 수국일 것이오.”
양제는 을지문덕의 정연한 논박이 할 말이 없었다.
이는 혹을 떼려다가 혹을 붙인 격이었다.
“내가 장담하건대,
만일 수국이 또 다시 고구려의 땅을 넘본다면 그때는 멸망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오.”
양제는 돌궐의 지도자와 많은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을지문덕에게 논파당한 것이 창피했지만 달리 반박할 말이 없었다.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을지문덕의 배포와 재주만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대와 같은 인재가 어찌 고구려와 같은 변방에서 썩고 있는가?
나와 함께 장안으로 간다면 천하를 호령할 수 있게 해주겠다.”
양제는 자신의 휘하에 을지문덕과 같이 담대한 인물만 있다면
온 천하를 제패할 수 있으리라 여기고 그를 회유했다.
이에 을지문덕은 가소롭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다.
“고구려는 신성한나라요, 천하의 중심이오.
내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천지신명(天地神明)께서 돌보아주셨기 때문이오.
수국의 친왕(親王)이 되느니 차라리 고구려의 개가 되겠소.”
양제는 부귀영화(富貴榮華)로도 을지문덕을 유혹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어느새 을지문덕에 대한 두려움이 싹트고 있었다.
“수국으로 돌아가면 전쟁에 대한 야욕을 버리고 백성들을 돌보는 일에 매진하시오.
백성들이 없고는 나라도 있을 수 없소.
그 점을 명심하면 수국은 오래도록 흥성할 것이오.
허나 만에 하나라도 잘못 마음을 먹고 고구려로 쳐들어온다면
돌이킬 수 없는 화를 당할 것이오. 내 충고를 가슴에 깊이 새기기를 바라오.”
을지문덕은 이제 할 말을 다 했다는 듯이 등을 돌리고 계민가한의 장막을 빠져 나갔다.
어느 누구도 그를 제지하지 못했다.
양제는 사라지는 을지문덕의 뒷모습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을 뿐이었다.
16. 강이식의 은퇴와 을지문덕의 막리지(莫離支) 임용
돌궐에서 돌아온 을지문덕(乙支文德)은 영양태왕(嬰陽太王)에게
양제(煬帝)를 만난 일을 상세히 보고했다.
영양태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전쟁의 기운이 무르익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태왕은 수국(隋國)이 고구려(高句麗)를 침략할 경우
돌궐(突厥)은 이번 전쟁에 중립을 지킬 것으로 짐작했지만
거란(契丹)이 걱정스러워 을지문덕에게 요서(遼西) 지역으로 가서 거란족들을 회유,
고구려 편으로 끌어들이라는 지시를 내렸다.
을지문덕은 여독을 풀 여가도 없이 다시 요서로 말을 달려
송막(松漠) 주변에 흩어져 살고 있는 거란의 부족을 찾아갔다.
거란족의 지도자인 <오사물悟砂物> 막하불(莫賀弗)은
고구려에서 사신이 온다는 통보를 받고 여러 추장들을 대동한 채
송막을 떠나 무려라성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막하불이란 거란족의 부족장에게 붙여주는 칭호였다.
“그대가 수주(隨主)의 높은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었다는 을지문덕 공(公)이시오?”
“그렇소. 고구려의 북부욕살(北部褥薩) 을지문덕이라 하오.”
“돌지계(突地稽)를 돌려보내라고 오셨나본데, 그는 이미 수국에 귀부(歸附)하였소.
괜히 헛걸음을 하셨구려.”
노회한 오사물은 을지문덕을 떠보았다.
“내가 돌지계같은 소인이나 찾으러 여기까지 왔겠소?
여러분들께 긴히 드릴 말이 있소.”
“보아하니 고구려에 귀부하여 같이 수국과 싸우자고 말하러 온 모양인데
우리는 그럴 힘도 없고 의욕도 없소이다.
수국과 고구려가 겨루어 누가 이기든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소이다.
그러니 그렇게 알고 돌아가시오.”
오사물이 퉁명스럽게 말했으나 을지문덕은 인내를 갖고 설득했다.
“막하불께서는 사세를 잘못 판단하고 계시오.
수국이 당장은 고구려를 두려워해서 거란에게 잘해주고 있지만
앞으로 벌어질 고구려와 수국 사이의 전쟁에서 수국이 이기게 되면
저들은 거란인 들을 노예로 삼을 것이오. 예전 돌궐의 예를 잊지 마시오.”
을지문덕은 십여년 전에서 돌궐에게 패배한 동돌궐 사람들이
수국에게 투항한 후에 벌어졌던 일을 상기시켰다.
그 당시 동돌궐인 들은 수국으로부터 노예와 다름없는 멸시를 당했다.
오사물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했다. 을지문덕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평화로운 세상을 이룩하자면 고구려가 수국을 이겨야만 하오.”
“그래도 수국은 우리에게 곡식과 재물을 원조하고 있소.
그에 비해 고구려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소?”
오사물 휘하의 추장 아율계(耶律契)가 나서며 을지문덕에게 따졌다.
을지문덕이 그를 쳐다보고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고로 ‘감탄고토(甘呑苦吐)’라는 말도 있지 않소?
수주 양광도 무언가 이득이 있으니 재물을 보내는 것이오.
수주는 지금 고구려와의 전쟁에 앞서 주변세력을 정지하는 작업을 하고 있소.
그렇지 않다면 얼마 전에 유성으로 쳐들어왔던 거란이
뭐가 예쁘다고 그처럼 선심을 쓰겠소?
수국이고구려를 제압하고 나면 거란족은 노예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이오.”
605년에 거란족이 유성을 공격한 일이 있었는데,
이때 수장(隨將) 위운기(韋雲起)는 수국에 복속된 돌궐족의 병사 2만 명을 동원하여
거란족을 격파했다.
을지문덕의 말이 채끝나기도 전에 술율적포(述聿赤抱)라는 젊은 추장이 나섰다.
“그렇다면 차라리 돌궐에 복속하는 것이 낫소.”
을지문덕은 껄껄 웃으며 말했다.
“돌궐은 가난한 부족이므로 그대들에게 소와 말 등의 가축들을 요구한 것이오.
그에 비해 고구려는 물자가 풍요로운 부국(富國)이오.
그러니 우리에게 협조한다면 곡식과 철제품을 지원해 주겠소.
그뿐만이 아니라 거란이 원한다면
예전에 우리가 사로잡았던 수인(隨人) 포로들도 보내줄 수 있소.”
을지문덕의 파격적인 제안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이때 소우창(蕭禹彰 )막하불이 자리에서 일어나 을지문덕을 도왔다.
“삼년 전 저 괘씸한 수주가 돌궐을 꼬드겨
우리를 짓밟았던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하오.
그때 얼마나 많은 형제들이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갔소?
수주 양광도 알고 보면 양털 냄새나 풍기던 자였는데
중원을 차지하고 나더니 올챙이 시절을 잊고 난리를 치고 있소.
나는 고구려에서 오신 을지문덕 욕살의 말씀을 따르겠소.
그러니 수국이 좋은 사람들은 수국에 붙고, 돌궐이 좋은 이들은 돌궐로 가시오.”
소우창은 수국과 돌궐 모두에 원한을 품고 있었다.
이처럼 하나 둘씩 을지문덕의 편에 서더니
결국 고구려에 귀부하자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을지문덕은 다시 한 번 외교적 역량을 훌륭히 발휘했다.
단재(丹齋) 신채호(申采浩) 선생은
『을지문덕전(乙支文德傳)』을 통해 을지문덕의 외교수완을 이렇게 칭송했다.
"…고구려의 지형을 보면, 동남쪽으로는 신라(新羅)와 백제(百濟)가 있었고,
서쪽으로는 수국(隋國)이 있었으며,
북쪽으로는 거란(契丹)·말갈(靺鞨)·돌궐(突厥)·선비(鮮卑) 등의 나라들이 있었다.
무슨 높은 산이나 큰 강도 없었고, 무슨 변경의 요새나 사막 같은 것도 없었으며,
그 강역(疆域)이 서로 이웃하여 가까이 붙어 있기가
마치 개의 어금니처럼 이어져 있어서 사방으로 적의 침입을 받는 곳에 놓여 있었다.
또한 이때에 이르러서는 수국의 기세가 열국들을 억누르고 굴복시켜서
모두 다 좌(左)로 돌라 하면 좌로 돌고 우(右)로 가라 하면 우로 갈 뿐
거역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던 그런 시대였다.
이런 점에서 보면 신라도 수국의 일부였고 백제도 수국의 일부였으며,
거란·말갈·돌궐도 또한 다 수국의 일부였으므로,
수국을 위하여 일하고 수국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사방에 벌려 있으면서
수(隨) 천자(天子)의 명령만 기다리고 있었다.
(생략)
아, 기이하구나, 을지문덕의 외교수완이여! 손뼉을 치면서 한 번 칭찬해줄 만하도다.
결국 말갈도 우리가 이용하는바 되었고, 거란도 우리에게 이용되는바 되었으며,
고구려를 같이 치자고 날마다 청하던 백제도 결국 양다리를 걸치고
국경에서 관망만 할 따름이었으며,
일찍이 수국(隨國)을 두려워하여 고구려의 사신을 붙잡기까지 하였던 돌궐도
수국을 도와서 같이 치는 일이 없었으니,
그 사이에 사신을 보내어 오고 간 비밀스런 꾀와 기이한 계책들은
역사상 전하는 바가 없으나,
한 모퉁이에 홀로 서서 훌륭한 외교수완으로 적국의 무리들이
서로 돕는 것을 와해시킨 것만은 분명하니,
오호라, 진정한 위인(偉人)이로다."
이듬해에 병마원수(兵馬元帥) 강이식(姜以式)은
영양태왕에게 고령(高齡)을 이유로 관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주청했다.
영양태왕은 그를 놓아주지 않으려 했지만 강이식은 한사코 떠나겠다고 고집했다.
결국 태왕도 강이식의 결심을 꺾을 수 없었다.
강이식은 평양을 떠나며 을지문덕을 자신의 후임으로 천거했다.
영양태왕도 을지문덕의 능력을 잘 아는 지라 쾌히 그러겠다고 약조했다.
강이식은 수레를 타고 부여성을 방문하여 을지문덕에게 자신이 은퇴했음을 알리고
오직 나라의 안위를 지키는데 힘써 달라고 당부한 뒤 백두산으로 떠났다.
강이식이 도성을 떠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영양태왕은
을지문덕을 막리지(莫離支)로 삼는다고 선포했다.
오늘날 국방부장관의 직책을 함께 내린 것이었다.
그러자 태제(太弟) 고건무(高建武)를 비롯해 태대형(太大兄) 부명호(扶明好),
조의두대형(皁衣頭大兄) 도병리(都丙利),
의후사(意候奢) 어문도(魚文道) 등이 격렬히 반대했다.
병권을 한 손에 거머쥔 막중한 자리를 근본도 알 수 없는데다가
관급이 대형(大兄)에 불과한 애송이에게 내어줄 수 없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영양태왕은 옳다고 여길 때는 결코 양보하지 않는 강단을 지니고 있었다.
태왕은 끝내 귀족들의 반발을 누르고 을지문덕을 막리지에 임명했으며
오늘날 육군참모총장 격인 병마원수의 직책도 겸직하게 했다.
이렇게 해서 을지문덕이 역사의 전면에 나서게 되었다.
을지문덕을 막리지로 임명하고 얼마 후, 영양태왕은 전국에 전시체제를 선포했다.
이때부터 고구려 사람들은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을지문덕은 먼저 전쟁에 쓰일 다량의 무기를 확보해야 했으므로
각 관청에 소속된 장인들에게 명을 내려 무기 생산량을 늘리게 했다.
이때부터 관청의 장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대장간에서 무기를 만들어 냈다.
그들의 소속 관청에서는 이에 대한 보상으로
두 배의 급료를 지급하여 사기를 끌어 올렸다.
관청에 속한 장인들 뿐 아니라 귀족들이 거느린 장인들도
밀려드는 주문을 감당해야 했기에 바쁘기는 마찬가지였다.
무기의 생산이 늘어나자 자연히 철의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이 당시 고구려에서 철의 생산량이 가장 많은 광산은 철산의 철광산이었다.
을지문덕은 철산에 위무사를 파견하여
광부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고취시켜 생산력을 향상시켰다.
광부들에 대한 대우가 좋아지자 국내는 물론
멀리 말갈이나 실위에서까지 사람들이 광부가 되겠다고 몰려왔다.
이리하여 생산량은 기대 이상으로 늘어나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매일같이 철괴(鐵塊)를 싣고
광산을 떠나 무기를 생산하는 군기처로 가는 소가 끄는 수레들이 줄을 이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무기 못지않게 많은 식량을 확보하고 있어야 했다.
아무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맹스러운 군사들이라도
먹지 않고는 싸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을지문덕은 각 지방관청에 명을 내려
곡식의 수확량을 늘릴 방책을 강구하고 전쟁을 수행할 때,
장기간 보관이 용이하고 휴대가 간편한 건량(乾糧)을 연구하게 했다.
농부들은 수확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락 하나라도 소흘히 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먹을 식량을 아껴 군량미로 내어 놓았다.
그리고 곡식을 말려 미숫가루를 만들고
고기를 제염처리하거나 건조시켜 육포를 만들었다.
이때 동해안에서는 명태를 말리는 작업이 한창이었는데
이 역시 군사들에게 더없이 좋은 건량이 될 것이었다.
장인과 농부 및 광부들이 이처럼 애쓰는 사이 상인들 역시 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을지문덕은 사방 곳곳에 닿아 있는 그들의 교역망을 이용해서
수국은 물론 주변국가 들의 동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상인들을 통해서 북방의 말을 비롯한 국내에서 부족한 전쟁 물자들을 입수했다.
17. 양제(煬帝)가 고구려침략에 동원한 수(隨)의 병력은 무려 1백 13만명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준비하는 일이 차질 없이 진행되자,
을지문덕은 각 지역의 욕살을 비롯해 처려근지(處閭近支),
루초(婁肖)등의 지방관들과 대모달(大模達)·모달(模達)·말객(末客) 등
주둔군을 이끄는 무관들을 모아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을지문덕은 이 회의에서 전국 5부의 욕살(褥薩)들에게 임무를 부여했다.
남부욕살은 백제와 신라의 침입에 대비한 방어 대책을 강구해야 했다.
동부욕살은 유사시 백성들의 피난 대책과 기밀문서의 관리를 책임져야 했고,
서부욕살은 서변에 대한 지원 대책을 내놓아야 했다.
더불어 을지문덕은 만일의 경우 수의 군대가 고구려 영토 깊숙이 쳐들어 왔을 때
각 지방의 군대가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 주었다.
을지문덕은 지방의 방어체제를 정비한 후에 변방의 부족들에게 눈길을 돌렸다.
수와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들이 어느 편에 서느냐가 큰 변수가 될 수 있었다.
을지문덕이 그동안 애쓴 덕분에 말갈과 실위는 고구려에 대한 지지를 밝히고 있었지만
정작 수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돌궐이나 거란의 여러 부족들은
아직 입장 표명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었다.
게다가 남방의 백제와 신라 역시 고구려와 불편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방치할 수는 없었다.
을지문덕은 영양태왕을 알현하고
이들 주변국들에 또 다시 사신을 보내 우호를 굳게 다져야 한다고 주청했다.
영양태왕 역시 철저한 대비만이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을지문덕의 유비무환(有備無患) 정신에 공감했기에 적극 동조했다.
영양태왕(嬰陽太王)은 여수전쟁(麗隨戰爭)에 앞서
북으로는 말갈족(靺鞨族), 서쪽은 돌궐(突厥)과 실위(室韋)·거란(契丹)을 포용했다.
이제 남은 일은 남쪽의 백제(百濟)와 신라(新羅)를 눌러 후방을 안정시키는 것이었다.
태왕은 백제와 신라를 군사력으로 압박하는 한편,
대대로(大對盧) 연태조(淵太祚)를 사신으로 파견해
백제를 달래는 강온정책(强溫政策)을 펼쳤다.
제1차 여수전쟁 때에 전사했던 연자유(淵子遊)의 외아들인 연태조는
태왕의 명을 받들어 백제의 사비성(泗沘城)에 당도했다.
고구려군의 공격을 받고 잔뜩 화가 나 있던 무왕(武王) 부여장(扶餘璋)이
고구려의 사신을 반갑게 맞이할 리 없었다.
무왕은 연태조를 보자마자 큰소리로 따졌다.
“대고구려의 지체 높으신 국상(國相)께서 무슨 일로 우리나라를 찾아왔소?”
연태조는 무왕의 냉대에 개의치 않고 부드럽게 말했다.
“제가 찾아온 목적은 백제와 친선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친선이라니? 우리의 송산성(松山城)과 석두성(石頭城)을 공격해서
백성들을 잡아 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무슨 말씀이시오?”
고구려는 607년 5월에 군대를 파견하여 백제의 송산성과 석두성을 공격하고
3천명의 포로를 끌고 간 적이 있었다.
“그것은 백제가 수국(隨國)과 통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수국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동족(同族)인 백제가 이민족(異民族)인 수국의 편을 들었으니
어찌 가만있겠습니까?
이번 변경의 두 성을 친 것은 단지 경고의 의미였을 뿐입니다.
우리나라의 태왕께서는 백제와 화친하여
다시는 동족끼리 싸우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무왕이 연태조의 말을 듣고 보니 고구려 입장 또한 이해 못할 바는 아니었다.
무왕은 인상을 펴며 말했다.
“고구려의 태왕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단지 화평뿐이오?”
“이미 다 짐작하고 계시는 듯하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수와의 전쟁이 다시 벌어지면 신라의 도발을 막아주십시오.”
“신라를 막아 달라?”
“그렇습니다. 이제껏 신라의 기를 꺾기 위해서
여러 차례 그들의 변경을 쳤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 청을 들어준다면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소?”
“예전에 사로잡았던 삼천 명의 백제 포로들을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백제가 신라를 도모한다면 도와 드리겠습니다.”
무왕으로서는 구미가 당기는 제안이었다.
실상 바다 건너 수국과 통교해본들 거리가 멀어 국익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
게다가 고구려는 문제(文帝)가 파견한 30만 대군을
일거에 섬멸할 정도로 막강한 국력을 지녔다.
무왕은 선대(先代) 아신왕(阿莘王)의 비극을 되풀이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무왕은 심계가 남달랐기에 쉽게 동의하지 않고 짐짓 연태조를 떠보았다.
“만일 우리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할 것이오?”
무왕이 의외로 강하게나오자 연태조는 눈을 가늘게 뜨며 정색을 하고 대답했다.
“별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신라에 같은 제안을 할 수밖에요.”
무왕은 이 말을 듣고 안색이 창백해졌다.
무왕은 예전에 신라의 진흥왕(眞興王)이
고구려와 손잡고 백제를 배신했던 일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그 당시 백제의 성왕(聖王)은 한수(漢水) 유역을 신라에 빼앗기고
목숨마저 잃어야 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수국과 손잡고 고구려에 대적할 수도 없었다.
이전의 여수전쟁이 좋은 본보기였다.
누가 감히 고구려가 엄청난 수효를 자랑하는 수국의 침략군과 싸워
이길 수 있으리라 상상이나 했겠는가?
무왕은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을 느꼈다.
고구려가 예전처럼 신라와 손을 잡는다면 백제는 사직조차 보존하기 어려웠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무왕은 짐짓 파안대소(破顔大笑)하며 말했다.
“아하하, 짐이 잠시 그대를 시험했소이다.
우리는 고구려와 피를 나눈 혈맹(血盟)인데 내 어찌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겠소?
짐 또한 고구려와 잘 지내기를 간절히 바라오.”
이리하여 백제는 고구려와 화친을 맺었다.
그 후 백제는 고구려와 손을 잡은 사실을 숨기고
줄타기 외교로 수국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였다.
그리고 적절한 시점인 611년10월에 신라의 가잠성(暇岑城)을 공격하여
성주 찬덕(讚德)이 전사하게 함으로써 신라가 고구려를 넘보지 못하게 하였다.
한편, 수황(隨皇) 양제(煬帝) 양광(楊廣)은 대운하 공사가 거의 끝나가자
대신들을 불러 모아 고구려를 칠 뜻을 밝혔다.
“천하의 모든 나라들이 짐에게 고개를 숙이는데
오직 고구려만이 굴복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우리의 국경을 침범하니 어찌 이를 두고 볼 수 있겠는가?”
이 시기에 수나라는 북쪽의 근심거리였던 돌궐마저 굴복시키고
만방에 그 세력을 떨치고 있었다.
이제 그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세력은 고구려뿐이었다.
“하지만 지난 전쟁이후로 고구려와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들도 더 이상의 충돌을 원하지 않으니 당분간은 지켜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양소(楊素)는 전쟁보다는
무리한 부역으로 인해 궁핍해진 백성들을 살피는 일이 먼저라 여겼다.
하지만 양제에게 있어 백성들은 물만 흐르게 해놓으면
언제든지 움직이는 물레방아와 같은 존재들이었다.
“그대는 지난날 돌궐(突厥)에서의 일을 잊었는가?
고구려는 앞으로는 사신을 보내어 우리를 섬기는 척하지만
뒤로는 북방의 오랑캐들을 결집하여 우리를 칠 준비를 하고 있다.
요 근래 들어서는 임유관(臨楡關) 앞에서도
고구려 군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 않느냐?”
양제는 양소가 말문이 막히자 모든 대신들을 둘러보며 자신이 결심한 바를 공표했다.
“고구려는 법령이 가혹하고, 부세가 무거우며,
권세를 잡은 자들은 붕당(朋黨)을 지어 싸움을 일삼을 뿐 아니라,
뇌물을 받고야 일을 처리하니 백성들은 억울함을 풀 길이 없다.
해마다 거듭된 재앙으로 인해 집집마다 기근에 시달리고,
끊임없이 전쟁을 치름으로써 요역(了役)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부역과 재해로 힘이 다해 죽은 시체가 도랑과 구덩이를 가득 메우니
백성들의 근심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처럼 고구려 영토 안에서 비탄과 울음이 끊일 날이 없으니
짐이 어찌 가만히 보고만 있겠는가?
하늘의 뜻에 따라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는 일이
천하의 군주인 짐의 본분이 아니겠는가?”
신하들은 양제의 말을 듣다보니
마치 오늘날의 수국 현실을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당시 수국은 모진 부역 때문에 민심이 이반하고
여기저기에서는 반란이 그칠 날이 없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감히 나서서 간하는 자가 없었다.
신하들은 자신의 치부(恥部)는 모르고
남의 잘못을 들추려 하는 양제의 주장에 기가 막힐 뿐이었다.
622년 탁군(涿郡)에 집결한 수의 고구려 침략군은 총 1백 13만 3천 8백명.
전군을 24군으로 편성했는데 1군은 기병 40대와 보병 80대로 구성되었다.
1대가 1백명이었으므로 1군에 기병 4천명, 보병 8천명이었다.
이렇게 하면 전투병력은 28만 8천명밖에 되지 않지만
각 군마다 치중대(輜重隊)가 전투병력 수만큼 편성되었다.
그 외에 중간에 보급기지도 두어야 하고,
이를 위한 경비 병력과 병참부대도 있어야 하므로 총 113만이 된 것이다.
기병은 10대를 1단으로하고, 보병은 20대를 1단으로 하여 군마다 4단을 두었는데
단마다 갑주와 깃발, 복장의 색깔이 달랐다.
이 엄청난 군대가 한 번에 출발할 수 없으므로 하루에 1군씩 출발시키되
군마다 40 리씩 간격을 두게 했더니 전군의 길이는 9백 60리에 뻗쳤다.
이와는 별도로 양제를 호위하는 어영군 6군이 또 있었는데,
이들의 행렬한 80 리였다고 한다.
이 광경은 과연 인산인해(人山人海)의 장관이라 칭할 만했으니
중국 역사상 초유의 병력이 고구려 정벌을 위해 동원되었던 것이다.
양제가 고구려를 침략할 대군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영양태왕은
수군원수(水軍元帥)인 태제(太弟) 고건무(高建武),
오늘날의 국방부장관 격인 막리지(莫離支)와
병마원수(兵馬元帥)를 겸직하는 을지문덕,
그리고 국무총리 격인 대대로(大對盧)에 있는 연태조와 더불어
이에 맞설 방책을 의논했다.
“도적들의 수효가 무려 백만을 헤아린다 한다. 이를 어떻게 격파하면 좋겠는가?”
강단이 있는 영양태왕조차도 수군의 엄청난 숫자를 전해 듣고는 다소 근심스러웠다.
“도적들이 백만 대군이라고는 하나 군수품을 나르는 인부들을 제하면
실제는 오십 만에서 육십 만 정도입니다.
그것도 이곳저곳에서 긁어모은 오합지졸입니다.
더구나 수주(隋主)는 지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사옵니다.
저들이 요하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빨라도 이 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들은 엄청난 병력을 투입했기에 분명 보급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연태조가 상황을 정확히 짚어냈지만, 고건무가 그의 의견에 반박하고 나섰다.
“아무리 오합지졸이라해도 숫자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탁군을 떠난 수의 대군이 임유관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국경은 지금 초비상 사태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요서에 군대를 파견해야 합니다.”
그러자 연태조가 다시 나섰다.
“우리는 먼저 이들을 영정하에서 막을지,
아니면 요하(遼河)에서 막을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연태조가 말을 마치자, 을지문덕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무리하게 나아가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성을 굳게 지키며 도적들이 지치기만을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대군인 저들은 보급에 문제가 생길 테니 자연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를 노려 친다면 어렵지 않게 섬멸할 수 있습니다.”
을지문덕의 말이 채끝나기도 전에 고건무가 눈에 쌍심지를 켜고 나섰다.
“그렇다면 이대로 손놓고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들판에 낱알 하나,
병아리 한 마리도 남기지 않는 청야전술(淸野戰術)을 써야 합니다.
수군은 분명 많은 수효를 믿고 단번에 우리 성들을 함락시키려 할 것입니다.
군사의 숫자에서 열세인 우리 고구려가
저들과 정면으로 맞딱드려 봤자 승산이 없습니다.”
을지문덕의 이야기가 끝나기 무섭게 고건무가 반박했다.
“저들이 우리 강토에 들어온다면 백성들의 피해가 막심할 것이오.
차라리 지난번처럼 요택에서 저들을 공격하여 섬멸하는 것이 낫지 않겠소?
이야말로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 여겨지오.”
잠자코 듣고 있던 영양태왕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적군이 사오십만 정도의 군사라면 지난번처럼 요택으로 나아가 싸우겠지만,
저들은 도합 백만 대군이다. 요택에서 막아낼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
을지문덕은 태왕의 말씀이 끝나길 기다렸다가
이번 전쟁에서의 자신의 구상을 털어놓았다.
“지난 수국과의 전쟁 이후,
재침에 대비해 수백 명의 간자들을 수국 전역에 침투시켜 동향을 파악해 왔사옵니다.
또한 군사의 조련과 군비의 확충은 물론
변방의 성주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유사시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므로 도적들은 요하를 넘는 즉시
우리가 쳐 놓은 그물에 걸려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을지문덕은 자신감이 넘쳤다.
이때 연태조가 신중하게 말했다.
“우리가 요동 방어선에서 수군의 주력을 묶어 놓을 수만 있다면
막리지의 계책이 좀 더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동성의 병력으로 수의 대군을 막을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을지문덕은 확신에 차서 대답했다.
“요동성주(遼東城主) 고연탁(高連卓)은 침착하고 지략이 뛰어난 장수입니다.
그라면 아무리 백만 대군이라 해도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연탁 장군을 믿어보기로 하자.”
영양태왕은 결론을 짓고 나서 신하들을 둘러보며 명했다.
“막리지 겸 병마원수 을지문덕은 이번 전쟁에서 총 책임을 맡아
고구려 전군을 지휘토록 하라.
준비가 끝나는 대로 요동으로 떠나라.”
고건무는 가슴속에서 불덩어리가 치밀어 올랐다.
비록 을지문덕이 변방을 안정시킨 공로가 있다고는 하지만
전쟁에 있어서는 애송이에 불과했다.
자신이 그런 자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그러나 누구도 태왕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다.
그것은 태왕의 동생인 고건무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그는 쓰린 속을 달래며 명을 받들었다.
18. 요하(遼河)에서의 공방전(攻防戰)
임유관(臨渝關)을 통과한 양제(煬帝)가 거느린 수국(隨國) 군사들은 진군을 거듭하여
3월 중순이 되어서 요하(遼河)에 도착했다.
양제 일행이 요하 어디에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무려라에서 요동성(遼東城)으로 가는 길목 어디였던 것 같다.
이때에 대사자(大使者)<온준溫俊>,·대형(大兄)<해승유解昇裕>,·
대모달(大模達)>재증협무<再曾協武> 등이 인솔하는 2만의 고구려군이
적군의 도강(渡江)을 막기 위해 유리한 지점에 진을 치고 있었다.
양제는 신하들을 둘러보며 물었다.
“아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구려 군사들을 단숨에 제압하여야 한다.
손쉽게 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공부상서(工部尙書) <우문개宇文愷>가 나서서 아뢰었다.
“군사 수대로 뗏목을 만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부교(符橋)를 세워서 단숨에 강을 건너는 것이 좋겠사옵니다.”
양제는 즉석에서 <우문개>에게 세 개의 부교를 만들도록 했다.
<우문개>의 설계에 의해 만들어진 부교는
수군(隨軍) 공병(工兵)들에 의해 강변으로 운반되었다.
요하 유역은 2백리 정도가 사람이 살 수 없고, 통행하기도 힘든 진창이었다.
이런 곳에 수군 공병들은 부교를 강에서 직접 설치한 것이 아니라
안전한 곳에서 만든 후 강으로 운반해 와 사다리 놓듯 걸쳤다.
양제는 부교가 완성되자 군사들에게 즉각 도강(渡江) 명령을 내렸다.
우둔위대장군(右屯衛大將軍) <맥철장麥鐵杖>이 선봉장으로서
무분랑장(茂賁郎將) <전사웅錢士雄>· 호분랑장(虎賁郎將) <맹차孟叉>와 더불어
군사들을 거느리고 부교 위를 달렸다.
그런데 수군에게는 불행하게도 측정이 조금 잘못되어서 다리가 3미터 가량 모자랐다.
그리하여 앞선 군사들이 뒤에서 달려드는 군사들에게 떠밀려 차가운 물로 떨어졌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강가 동안의 언덕 위에 궁시(弓矢)를 든 고구려 군사들이 나타나
부교 쪽으로 활시위를 당겼다.
<맥철장>은 이대로 있다가는 몰살(沒殺)을 면키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적군에게 등을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그는 왼손에 원방패(圓防牌)를 들고 오른손에 쥔 장창(長槍)을 내두르며
날아오는 화살을 힘겹게 막아냈다.
그때 뭍에서는 고구려의 도부수(刀斧手)들이 모습을 드러내며
강가로 올라오는 수병(隨兵)들을 무자비하게 도륙(屠戮)하고 있었다.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한 <맥철장>은
부하 장수인 <전사웅>· <맹차>를 데리고 부교에서 뛰어내렸다.
그는 비처럼 쏟아지는 고구려군의 화살을 쳐내며
허리까지 차오르는 물살을 헤치고 강기슭으로 나아갔다.
한편 강 서안(西岸)에서는 부교가 짧아 군사들이 강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양제는 친히 보검(寶劍)을 빼들고 군사들을 독려해서 부교로 밀어 넣었다.
고구려의 군사들에게 둘러싸여 고군분투(孤軍奮鬪)하던 <맥철장>은
자신이 어느새 고립무원(孤立無援)의 처지에 놓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를 호위하고 있던 수병들은 어느새 물속에 머리를 박은 채
강물의 들썩임에 따라 덩달아 춤을 추었다.
군마(軍馬)에 늠름하게 앉아 미첨도(眉尖刀)를 꼬나 잡은 고구려의 장수(將帥) 하나가
앞으로 나서며 <맥철장>에게 소리쳤다.
“나는 고구려의 대형 <해승유>라고 한다.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그러나 <맥철장>은 끝까지 무인(武人)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저항했다.
<해승유>는 말을 몰아 <맥철장>에게 접근하더니 미첨도를 높이 쳐들었다.
<맥철장>은 <해승유>의 공격을 막아내려고 원방패를 들어 올렸으나
도보(徒步) 상태에서 마상(馬上)의 적을 맞아 제대로 싸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결국 <맥철장>은 <해승유>의 미첨도에 정수리를 얻어맞고
그 자리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전사웅>은 역시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고구려 군사들에게 다가갔지만
의욕만 가지고는 태산처럼 버티고 서 있는 고구려 군사들의 장막을 뚫을 수 없었다.
고구려의 궁수대(弓手隊)를 이끌던 <재증협무>가 <전사웅>을 보고
궁시(弓矢)를 겨누어 화살을 날렸다.
목 언저리에 화살을 맞은 <전사웅> 역시 캄캄한 요하의 물속에 잠겼다.
<맹차>는 조금도 상황이 반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몸을 피해 달아나려고 했지만
양쪽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피하지 못해
대꼬챙이에 꽂힌 개구리처럼 물속에 쳐 박혔다.
서전(緖戰)에서 장수(將帥) 셋이 전사하고
2만여 명이 넘는 수병(隨兵)이 살상되는 피해를 입자
양제는 하는 수 없이 전군에 후퇴 명령을 내렸다.
이때는 이미 수병들의 시체가 요하 동쪽 기슭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양제는 첫 전투에서 패배의 쓴잔을 마셨지만
이에 개의치 않고 이튿날부터 매서운 공격을 퍼부었다.
<우문개>가 공병들을 재촉하여 이틀 만에 부교를 다시 만들자,
양제는 그동안 속속 집결한 후속부대들을 도강작전에 투입했다.
양제의 명을 받은 좌익위대장군(左翊衛大將軍) <우문술宇文述>과
우익위대장군(右翊衛大將軍) <우중문于仲文>이 이끄는 대군이
일거에 부교를 넘어서자,
요하 동편을 지키던 <온준>·<해승유>·<재증협무> 등의 고구려군은
더는 버티어 내기가 어려웠다.
아무리 죽여도 끝없이 몰려오는 수군을 당해낼 방법이 없었다.
한동안 궁사전(弓射戰)을 벌이며 수군(隨軍)을 사살하던 고구려의 군사들은
적당한 때를 노려 강변을 내주고
요동성(遼東城)과 건안성(建安城) 방면으로 후퇴했다.
이 치열한 싸움에서 수군은 엄청나게 많은 사상자를 냈다.
하지만 백만이 넘는 대군이었으므로 양제는 그다지 큰 타격이라 여겨지지 않았다.
그는 어느 정도의 피해는 입었지만 요하 동안(東岸)을 점령했기에,
수군의 승리라고 자위하며 기고만장(氣高萬丈)했다.
고구려군으로서도 소기의 성과를 충분히 거둔 싸움이었다.
수나라의 군사들을 열흘이나 요하에 묶어둔 것만 해도 큰 성과였다.
을지문덕은 시시각각으로 전황을 보고받았다.
그는 예상했던 대로 일들이 진행되자, 다음 계획을 준비했다.
수(隨)의 대군은 요하를 건넌 후에 곧바로 요동성으로 향했다.
군사들의 행렬이 일으키는 흙먼지가 모래 폭풍을 연상시켰다.
이때 요동성에서는 이미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고구려 국경 방어의 중심인 요동성은 수백 년 간 이어진 수많은 외침(外侵)에도
성문을 열어 본 적이 없는 난공불락(難攻不落)의 요새였다.
요동성은 백하(白河)를 해자(垓字)로 활용한 평지성(平地城)으로서,
산성(山城)에 비해 떨어지는 방어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큰 돌을 써서 십여 장 높이의 거대한 성벽을 쌓았다.
방형(方形)을 취한 성은 내성(內城)과 외성(外城)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외성의 네 귀퉁이에는 점장대(點將坮)를세 워 사방을 살필 수 있도록 만들었다.
요동성은 성의 총길이가 이십여 리에 이르는 큰 성이었다.
성벽 위는 말이 양 방향에서 달려와도 부딪치지 않을 정도로 넓었고,
궁수들을 보호하기 위한 엄호물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세워져 있었다.
성문은 북쪽과 동쪽으로 나 있는데,
성문 주위로 치(雉)를 두름으로써 적군이 성문을 쉽게 뚫지 못하게 했다.
요동성은 북쪽으로 백암성(白巖城)과 개모성(蓋牟城)
남쪽으로 안시성(安市城), 건안성과 긴밀한 연락을 유지함으로써
방어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었다.
을지문덕의 지시를 받은 요동성주(遼東城主) 대형(大兄) <고연탁高連卓>은
삼만에 이르는 정병(精兵)을 조련하는 한편,
군량미 오십만여 석을 비축하고 무기와 성벽을 수리하면서 장기전에 대비하였다.
성문을 굳게 지키고 싸운다면 아무리 많은 수의 적군들이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막아낼 자신이 있었다.
하지만 요하에서 돌아온 군사들로부터 수군의 전력에 대해 보고받았기에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고연탁>은 성 곳곳을 순시하며 군사들을 독려하고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를 살폈다.
드디어 수국의 대군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요동성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납게 펄럭이는 기치(旗幟)가 하늘을 뒤덮고 색색의 갑옷이 대지를 끝없이 메웠다.
<고연탁>은 이전에 그처럼 많은 군사들을 본 적이 없었으므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고구려의 장수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맡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단련이 되어 있었다.
<고연탁>은 금새 냉정을 되찾고 매와 같이 날카로운 눈을 빛내며
적군의 허실을 살폈다.
수군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성을 물샐틈없이 포위해 버렸다.
사방을 둘러봐도 보이는 것은 바다뿐이라는 말처럼
요동의 하늘 아래에는 온통 수국의 군사들로 넘실거리고 있었다.
“내일까지 말미를 주겠다. 굳이 목숨을 버릴 필요가 있느냐?
항복하면 각기 지위에 합당한 예우를 받게 되리라.”
공격에 들어가기 앞서
좌무위장군(左武衛將軍) <최홍승崔弘昇>이 회유(懷柔)에 나섰다.
<고연탁>을 비롯한 요동성 수비군의 장수와 병사들은 이를 커다란 모욕으로 여겼다.
“칼을 들었으면 휘둘러라. 창을 들었으면 찔러라. 활을 들었으면 쏘아라.
전장에서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느냐?”
그들의 의지는 요동성의 견고한 성곽만큼이나 굳건했다.
요동성에 대한 수군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수군은 높고 견고한 고구려의 성들을 공략하기 위해
각종 공성구(攻城具)를 동원하였다.
투석기로 돌을 날려 성벽을 파괴하거나
성벽 위의 적군과 방어무기를 분쇄하는 발석차(發石車),
성벽이나 성문을 파괴하기 위해
끝을 뾰족하게 깎은 통나무를 밀고 가서 부딪치는 충차(衝車),
나무로 틀을 짜고 좌우에 각각 세 개 씩 도합 여섯 개의 바퀴를 달아 굴려서 움직이며,
앞쪽에 굵직한 두개의 높은 기둥을 세우고 뒤쪽 바닥에서부터
비스듬하게 계단을 만들어 2단계의 사닥다리를 세우는 운제(雲梯)에다
성벽 가까이 접근해 땅을 팔 수 있도록 만든 장갑으로 된 전호피차(塡壕皮車),
이동식 망루 내부에 병사를 태운 다음 도르래를 이용해 망루를 올리고
성(城) 내부의 사정을 염탐하기 위한 소차(巢車)등이 실전 배치되었다.
그리고 그 거대한 기계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따로 치중대(輜重隊)가 구성되었다.
양제는 이런 신무기들로 인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자신하고 있었다.
게다가 성을 지키는 군사들보다 수십 배나 많은 군사로 공격한다면
함락시키지 못할 성이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막상 전투가 벌어지자, 상황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갔다.
요동성주(遼東城主) 대형(大兄) <고연탁高連卓>은
아장(亞將)인 모달(模達) <옥승인玉承因>· 말객(末客) <간상원簡相原>을 대동하여
자신이 직접 남문에서 수성전(守城戰)을 지휘하였고,
요하(遼河)에서의 방어전(防禦戰)에 참전하였던 대사자(大使者) <온준溫俊>과
대형(大兄) <해승유解昇裕>에게는 동문에서 군사를 독려하도록 했으며,
요동성 수비군의 참좌(參佐)인 모달(模達) <모선각牟先角>에게는 서문을 맡겼다.
수군(隨軍)은 어느새 장마철 무성하게 자라난 수풀처럼 벌판을 메우며
발석차를 도열시키고 족히 수백 근은 됨직한 바위를 날렸다.
요동성 수비군은 성벽 주변에 마름쇠를 뿌리고
포노(砲弩)와 강노(强弩)를 발사해 수군의 전진을 막았다.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돌과 화살 세례를 받자 진격하던 수군 병사들은 주춤했다.
그러나 그들은 곧 전열을 정비하여 여러 번 무두질해
쇠뇌 공격조차 뚫지 못할 정도로 질겨진 가죽을 씌운
전호피차(塡壕皮車)들을 앞세우고
그 뒤에 장방패(長防牌)를 든 수군 보병들이 화살을 막으며
운제를 끌고 요동성의 성벽으로 접근해 갔다.
“저들은 분명 충차로 남문을 공략하는 동시에,
운제를 걸고 성벽을 타 오르려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수성전(守城戰)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두었으니
저들은 결코 목적을 이룰 수 없으리라. 그렇다고 절대 방심해서도 아니 된다.
전투에서 순간의 부주의는 곧 패배로 연결될 수 있다.”
성주인 <고연탁>은 부관들에게 주의를 주고는 성벽을 뛰어 다니며 군사들을 독려했다.
성벽 가까이로 접근해 온 수군의 강노에서 쏘아진 화살이
곳곳에서 날아오르고 있었다.
성벽으로 접근한 수군 병사들이 운제의 사다리를 뻗어 올렸다.
수십 개의 운제가 앞을 다투어 성벽 위에 걸쳐졌다.
전호피차 밑에 숨어있던 군사들과 방패를 들고 접근한 군사들이
일제히 운제를 타고 올랐다.
성벽 아래로 시선이 쏠린 틈을 타서
발석차가 성 가까이로 접근하여 거대한 바위를 날렸다.
성벽 곳곳에 바위가 떨어졌지만 성곽이 워낙 튼튼하여
크게 부서지거나 무너져 내리지는 않았다.
어지럽게 전개되는 수군의 공격 속에서도
요동성을 수비하는 고구려 군사들은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요동성 수비군은 장방패(長防牌)를 이용하여 날아드는 수군의 화살을 막고
구창(鈎槍)으로 성벽에 걸친 운제를 밀어내거나
장창(長槍)으로 올라오는 적병을 찔러 떨어뜨렸다.
고구려의 궁수(弓手)들은 성가퀴 뒤에 몸을 숨긴 채
성벽으로 다가오는 적병을 향해 화살을 날렸다.
이에 성민(城民)들까지 합세하여 끓는 물이나 오물을 붓거나
바위와 통나무들을 던져 기어오르는 적병을 물리쳤다.
기합과 비명소리가 섞여서 울려 퍼지는 가운데
수병(隨兵)들의 시신(屍身)이 요동성 앞에 즐비하게 쌓여 갔다.
19. 요동성전투(遼東城戰鬪)
수장(隋將)들은 많은 군사를 동원해 끊임없이 요동성(遼東城)을 공격했지만
요동성의 고구려 군사들은 결코 물러섬이 없었다.
성벽에서의 공방전(攻防戰)이 한참 벌어지고 있을 때,
수(隋)의 좌효위대장군(左驍衛大將軍) <형원항荊元恒>이 거느린 군사들이
충차(衝車)를 앞세우고 남문으로 밀어닥쳤다.
하지만 요동성의 문은 옹성(甕城)으로 둘러쳐져 있었기 때문에
쉽게 공략할 수가 없었다.
옹성은 입구만 남겨 놓고 성문을 항아리처럼 둘러싼 형상으로
적군이 안으로 들어서면 사방에서 공격을 받게 되어 있었다.
<형원항>은 무수히 쏟아지는 화살 세례를 견디지 못하고 군사를 물려야만 했다.
한편 중랑장(中郎將) <토만서吐萬緖>의 부대는 전호피차(塡壕皮車) 밑에 몸을 숨긴 채
성벽 밑의 땅을 파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작업 또한 그리 순조롭지가 않았다.
위에서 쏟아지는 날벼락들을 피하며 힘겹게 작업을 했는데,
한 장 정도 파 내려가자 물이 새어 나왔다.
놀랍게도 성벽 아래로 물길이 나 있었다.
이는 조백하(潮白河)와 연결된 물길이었다.
굴을 파던 수군(隨軍) 병사들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이제까지의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간 것이었다.
이들로부터 작전이 실패했다는 보고를 받은
좌군의 주장인 좌익위대장군(左翊衛大將軍) <우문술宇文述>은
난감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가 지휘하던 군대 역시 성벽을 넘어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미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으므로 <우문술>은 일단 군사를 물렸다.
아침부터 쉬지 않고 전투를 치루었기에 수군 가운데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무사한 자들 역시 피로로 인해 몸을 가누기 힘들 지경이었다.
우문술은 일단 군사들을 물려 성에서 십여 리 떨어진 곳에 진을 친 후에,
육합성(六合城)에 있는 양제(煬帝)에게 가서 전과를 보고했다.
양제는 요동성에서 서쪽으로 수십 리 떨어진 곳에 육합성을 지은 후,
그곳에 주둔하고 있었다.
양제는 노기가 충천하여 당장 장수(將帥)들을 불러들였다.
“고작 요동성 하나 함락시키지 못하다니,
그러고도 짐(朕)의 장수들이라 할 수 있는가?”
좌중에는 침묵만 흘렀다. 누구도 함부로 나서지 못했다.
그러다가 이윽고 좌익위대장군 <우문술>이 나섰다.
“요동성은 견고하고 빈틈이 없을 뿐 아니라
고구려 군졸들의 저항이 예상보다 훨씬 거세옵니다.
단기간에 성을 함락시키기는 어려울 듯 하옵니다.”
“저들보다 수십 배나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도
그깟 성 하나를 함락시키지 못한단 말이냐?”
양제의 질타가 쏟아지자, <우문술>은 얼굴을 들지 못했다.
그때 좌후위대장군(左侯衛大將軍) <단문진段文振>이 나서며 아뢰었다.
“요동성은 많은 전투를 겪으면서 약점을 보완해 왔기 때문에
일거에 함락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에게는 이곳에서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일단 요동성을 놓아두고 바로 평양성을 기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성을 빼앗고 고구려왕을 사로잡는다면 나머지 성들은 자연 항복해 올 것입니다.”
<단문진>은 수군의 약점을 꿰뚫고 있었다.
그들이 수백만을 헤아리는 대군이라는 점은 커다란 위력을 발휘했지만
그만큼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식량이 필요했다.
그런데 고구려군이 이미 청야전술(淸野戰術)을 펼쳐 식량이 될 만한 것은
모두 성안으로 거두어들였기 때문에 수군이 현지에서 얻을 것이 없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오로지 후방에서 운반되는 식량에만 의존해야 하는데
그 많은 식량을 먼 거리로부터 지속적으로 대기는 어려웠다.
더구나 오랫동안 이어진 무리한 토목사업과 원정으로 인해
수(隋) 국내의 상황 또한 그리 좋지 않았다.
이런 상태로 전쟁을 오래 끈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
“<단문진> 장군이 내놓은 작전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익위대장군(右翊衛大將軍) <우중문于仲文>이 반대하고 나섰다.
“만일 요동의 많은 성들을 그대로 남겨 놓고 진군한다면
항상 후방의 안위를 걱정해야 하고, 보급선이 끊길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비해 궁여지책으로 군사들이 식량을 소지하고 간다면 진군의 속도가 떨어져
고구려군이 미리 대비할 여유를 줄 뿐 아니라
오랜 행군에 지친 군사들이 무거운 식량을 몰래 버릴 지도 모릅니다.”
우중문은 과거에 고구려를 침공했던 나라들이 압도적인 전력의 우위에도
결국 패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요동의 고구려 성책들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장군들 사이에 갑론을박(甲論乙駁)이 오고 가는 동안
양제의 가슴속에는 분노만 쌓여 갔다.
양제는 참다못해 서슬 푸른 명령을 내렸다.
“전군을 동원해 대대적인 공세를 펼쳐라.
<우중문>의 우군은 동문을, <우문술>의 좌군은 남문을 치도록 하라.
그리고 중군은 서쪽과 북쪽 성벽을 압박하도록 하라.
만약 성을 함락시키지 못한다면 너희들 목부터 치겠다.”
양제는 요동성을 점령하고 후방의 안위를 확보한 후에 진격하기로 결정했다.
이제는 정면 돌파로 고구려 성들을 모조리 굴복시킴으로써
천하에 본때를 보이겠다는 양제의 오기가 작용했다.
이튿날부터 수군의 맹렬한 공격이 재개되었다.
성으로 돌격하지 않고 꾸물거리는 군사들은 가차 없이 목이 베어졌다.
수군은 더 많은 발석차(發石車)를 동원하여 쉴 새 없이 돌덩이를 발사함으로써
고구려의 요동성 수비군을 괴롭혔다.
곳곳에서 바위에 맞아 깨지고 터져서 죽거나 다치는 군사들이 늘어났고,
성곽의 일부가 부서지기도 했다.
하지만 요동성 수비군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시체와 부상자는 곧바로 안치소(安置所)와 군의(軍醫)에게 보내졌고,
부서진 성곽은 임시방편으로나마 재빨리 보수가 되었다.
싸움이 거듭될수록 더 많은 수병(隨兵)들이 성벽으로 오르는 사다리에 매달렸지만,
완강한 방어에 막혀 꼭대기에 이르지 못하고 낙엽처럼 떨어져 바닥을 붉게 물들였다.
그런 동안에 요동성의 군사들 또한 화살에 맞아 줄기 꺾인 국화처럼 고꾸라졌다.
치열한 접전이 한 달도 넘게 지속됐다.
60만의 수군(隋軍)은 쉴 틈도 없이 줄기차게 요동성을 몰아쳤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5만 명 가까이 이르는 사상자만내고 있었다.
요동성을 지키는 4만 6천여 명의 고구려군 역시 피해가 크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동안의 전투에서 5천여 명의 전사자와 2천여명의부상자가 나왔는데,
전사자 가운데는 요동성의 동쪽 방어를 담당하던
대사자(大使者) <온준溫俊>도 포함돼 있었다.
요하(遼河)에서 수군(隨軍)의 도강작전(渡江作戰)을 저지하는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 냈던 <온준>은 그의 아버지 <온달溫達>이 그랬던 것처럼
진정한 군인답게 전장(戰場)에서 자신의 생애를 마쳤다.
<온준>의 부하 장수인 대형(大兄) <해승유解昇裕>는
왼쪽 다리에 적군의 화살을 맞아 부상을 입었다.
양쪽 군사들이 모두 지쳐 있었지만
적은 수로 싸워야 했던 고구려 군사들의 피로가 더욱 심했다.
하지만 요동성주(遼東城主)인 대형(大兄) <고연탁高連卓>은
이미 전쟁에 대비해 포노(砲弩)와 강노(强弩) 같은 무기를 많이 만들어 두었고
군량도 충분히 비축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수성전(守城戰)을 성공적으로 이끌 확신이 있었다.
군사들의 사기 또한 드높았다.
그에 비해서 수군 병사들의 사기는 매우 떨어져 있었다.
그들은 수십만의 대군이 번갈아 가면서 공격을 했는데도
빈틈을 보이지 않는 요동성에 대해서 경악을 넘어 경외심(敬畏心)을 가졌다.
수십여 일 동안 이어진 교착상태는 자부심이 강한 <우중문>에게 치욕이었다.
별달리 뾰족한 방법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성을 함락시킬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질 것이었다.
더구나 임유관(臨渝關)에서 요하에 이르는 길에 난데없이 출몰하는 거란병(契丹兵)과
고구려군(高句麗軍)으로 인해 벌써부터 보급선(補給線)에 문제가 생기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요동성 주위의 성들에서 일제히 반격을 개시한다면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었다.
<우중문>은 수하의 장수들을 소집했다.
“아무래도 지금의 방법으로는 성벽을 넘어서기 어려울 듯하오. 다른 방책이 없겠소?”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우익위장군(右翊衛將軍) <설세웅薛世雄>이 의견을 개진했다.
“백하의 모래를 이용해서 모래주머니를 만들어 성 높이만큼 쌓은 후에
이를 밟고 성벽으로 오르면 됩니다.
비록 많은 노고를 감수해야겠지만 완성만 된다면
대군이 일시에 쇄도해 들어갈 수 있는 통로(通路)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 된다면 아무리 질긴 고구려군이라도 두 손을 들게 될 것입니다.”
<우중문>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둠을 틈타 은밀히 일을 진행한다면
큰 희생을 피하고도 모래주머니 언덕을 만들 수 있을 듯했다.
<우중문>은 <설세웅>에게 모래주머니 만드는 작업을 지시했다.
그리고 요동성에 있는 고구려 군사들이 의심을 품지 않도록
성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수일에 걸쳐 수백만 개의 모래주머니가 완성되자,
<설세웅>은 어둠을 틈타 군사들을 거느리고 성벽 가까이로 다가갔다.
군사들은 입에 매를 물고 발소리를 죽여 가며 모래주머니를 날랐다.
그러나 요동성주 <고연탁>은 이미 수군의 작전을 간파하고 있었다.
그는 <설세웅>이 이끄는 수군이 성벽에 다가올 때나
모래주머니를 쌓을 때도 모르는 체하며 결정적인 순간에 타격을 주기 위해
그들이 충분히 함정에 발을 들여놓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것도 모르고 <설세웅>의 군사들은
성벽 위에서 파수 보는 군사들의 눈을 피해 성벽을 따라 모래주머니를 쌓아올렸다.
차츰 작은 언덕이 생겨나더니 산더미로 변해갔다.
모래주머니가 성벽 꼭대기에서 한 길 정도 밑에까지 쌓였을 때,
<설세웅>의 군사들이 모래주머니로 만든 길을 따라 성벽 위로 오르자
고구려 군사들이 느닷없이 커다란 기름 항아리를 들고 나타났다.
수백 개는 족히 됨직한 큰 항아리가
모래주머니를 밟고 올라오는 수군 병사들을 향해서 일제히 들이부어졌다.
천지사방에 기름 냄새가 진동했다.
앞서서 비탈진 길을 오르던 수병(隨兵)들이 기름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졌다.
이들에 밀려 뒤에 따라오던 군사들도 덩달아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
수병들은 온통 기름 범벅이 되어 있었다.
이때 성벽 위에서 일제히 횃불과 불화살이 날아올랐다.
모래주머니 길 곳곳에서 불길이 일어나더니 순식간에 사방으로 번졌다.
성벽을 향해 달리던 <설세웅>의 군사들은 졸지에 불길에 휩싸이는 처지가 되었다.
온몸에 기름을 칠하고 있는 수병들은 화마(火魔)의 좋은 먹이감이었다.
불길은 수많은 수군 병사들을 집어 삼켰다.
불길이 타 들어가면서 수군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늘에 뜬 별무리가 놀라서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될 만큼 끔찍한 참상이었다.
고구려 군사들은 확인 사살이라도 하려는 듯 그 위에 화살을 마구 쏘아댔다.
부하들이 불길에 휩싸여 쓰러져 가는 모습을 본 <설세웅>은 급히 퇴군을 명했다.
잠시라도 지체했다가는 살아남을 목숨이 하나도 없을 듯했다.
수군 병사들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고 있는 전우들을 뒤로하고
혼비백산(魂飛魄散)하여 달아났다.
<설세웅>도 그 무리에 섞여 간신히 목숨만은 구할 수 있었다.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우중문>은 성벽 아래에서 불길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일이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우중문>이 군사들을 이끌고 성벽 가까이로 달려가 보니
살이 타는 냄새와 소름 끼치는 비명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여기저기 몸에 불이 붙은 수병들이 불구덩이 속에서 뛰쳐나왔다.
<설세웅>도 온통 불에 그을린 참혹한 몰골로 꽁지가 빠지도록 도망쳐 오고 있었다.
<우중문>은 그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혔다.
마지막 작전조차 실패로 돌아갔기에 요동성의 함락이 더욱 아득하게 느껴졌다.
이처럼 <고연탁>이 지휘하는 요동성의 고구려군은
수군이 힘으로 밀어붙이면 힘으로 막아내고,
꾀로 승부하면 꾀를 내어 대응하는 공방전을 벌이며 3개월이 넘게 잘 버티고 있었다.
양제로서는 요동성에 붙잡혀 허송세월한 셈이었다.
양제는 화가 나서 제장을 다그쳤다.
“내가 직접 요동에 오는 것을 반대하더니,
너희들의 무능함을 들킬까봐 두려워해서 그랬구나.
지금 여기 와서 너희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니 모두 다 목을 베고 싶을 따름이다.
너희들이 그토록 죽음이 두렵다면 힘을 다해서 싸우지 말라.
내가 너희 모두를 죽이지 못하리라 생각하는가?”
수군 장수들은 두려워 벌벌 떨면서 모두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이미 탁군에서 출정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속전속결(速戰速決)은 애초부터 어긋나 있었다.
궁지에 몰린 양제는 결국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평양성(平壤城)을 직접 공격하기로 했다.
“<우중문>,<우문술>은 정예병력 삼십만을 선발하여
그들을 이끌고 연산산맥을 넘어 곧장 평양성을 쳐라.
이미 동래를 출발한 내호아의 수군(水軍)이 평양성으로 향하고 있을테니
협공(挾攻)을 펼쳐 고구려 태왕을 잡아라.”
<우중문>이 양제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문제는 보급이옵니다. 이곳에서 평양까지는 수백 리 길이옵니다.
그곳까지 가는 내내 고구려의 영토이고,
그 안에는 이미 한 톨의 곡식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옵니다.
결국 군사들은 자신들이 먹을 식량을 짊어지고 가야 하옵니다.
휴대해야 하는 식량과 무기의 무게로 볼 때,
별동대(別動隊)의 기동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사옵니다.”
물론 양제도 그런 사실을 모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에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평양성 공략이야말로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었다.
물론 양제에게도 믿는 구석이 없지 않았다.
바로 우익위대장군(右翊衛大將軍) <내호아來護兒>가 이끄는 해군이었다.
그의 해군이 예정대로 움직였다면 이미 패수구에 이르렀을 것이었다.
평양성은 패수구에서 지척이니 양제의 예상이 맞는다면
고구려 영양태왕은 졸지에 뒤통수를 얻어맞을 처지였다.
왕명은 지엄한 법이었다.
이미 임금의 명령이 내려졌기에 <우중문>도 더는 왈가왈부할 수 없었다.
<우중문>과 <우문술>을 비롯한 아홉 명의 장수가
각기 자신의 휘하 병력을 이끌고 별동대에 참여했다.
이들은 고구려군의 눈을 피하기 위해 각기 다른 길로 흩어져 나아가
대릉하 서안에서 집결할 계획이었다.
양제는 친히 떠나는 장병들을 배웅했다.
이제 수군의 운명은 그들의 어깨 위에 놓여 있었다.
양제는 떠나는 <우중문>에게 보검(寶劍)을 내리며 격려했다.
“그대의 뛰어난 지략과 용맹이라면 반드시 큰 전공을 세울 것이라 믿는다.”
<우중문>은 양제가 가장 신임하는 장수였다.
비록 이번 원정에 있어서는 견해가 달랐지만
그 또한 신중한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니 그를 나무랄 수는 없었다.
별동대라고는 하지만 이 역시 삼십만 오천 명이나 되는 대군이었다.
기세 좋게 바람에 휘날리는 깃발들이 앞장서서 나아가고
그 뒤로 대열이 꼬리를 물고 꿈틀거리며 움직였다.
<우중문>은 군마(軍馬) 위에 앉아 말이 가는 대로 몸을 내맡겼다.
20. 평양성에 접근했다가 완패한 <내호아>
우익위대장군(右翊衛大將軍) <내호아來護兒>가 이끄는 수국(隨國)의 수군(水軍)은
강회(江淮)지방, 그러니까 회수(淮水) 유역과
양자강(揚子江) 하류지역의 인원으로 구성한 군대였다.
이 군단 역시 전문적으로 배를 다루는 선군과 하역부대,
그리고 선단 방어를 위한 전투 병력으로 구성되었는데,
전투요원의 숫자만 최소한 5만은 넘었던 것 같다.
내호아의 함대는 풍파를 만나지 않고 패하 언저리에 쉽게 당도하였다.
양제(煬帝)가 친히 통솔하는 육군이
요동성에서 고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내호아>는
약속한 기일에 평양성에서 회전(會戰)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그의 머리는 공명심(功名心)으로 꽉 차 있었다.
<내호아>는 수군 단독으로 출전하여 일대공로를 세우겠다고 별렀다.
부총관인 <주법상周法尙>이 육군과 합동작전을 벌여
평양성을 공략해야 한다고 만류했으나 <내호아>는 듣지 않았다.
수군(隨軍)의 함선들이 거침없이 패수구(浿水口)를 지나 강을 따라 오를 때,
<주법상>은 군사들에게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다.
언제 강변에서 고구려군이 공격해올지 모르는 일이었다.
패수는 수심이 깊고 폭이 넓을 뿐 아니라 경사가 완만해서
수군의 오층누선처럼 큰 배도 어렵지 않게 항해할 수 있었다.
대규모의 선단이 이미 패수로 진입해서 평양성에서 지척까지 접근해 있는데
고구려 측에서 아무 반응이 없다는 사실에 이상하게 여긴 <주법상>은
<내호아>에게 이렇게 건의했다.
“고구려의 도성까지 가까이 왔는데 적의 반격이 없다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혹시 복병이 있을지도 모르니 여기서 잠시 배를 멈추고
적의 동정부터 살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호아>는
<주법상>이 지나치게 걱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고개를 저었다.
“적군은 우리보다 병력이 적다. 게다가 고구려의 도성이 가까이에 있지 않은가?
설혹 복병이 있다고 해도 그 수효가 얼마나 되겠는가?
압도적인 힘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종종 전쟁을 망치는 이유는
바로 노파심으로 인한 망설임이다.
기회가 왔을 때 이를 잘 이용할 줄 아는 사람만이 승리의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다.”
<주법상>으로서는 고구려군을 멸시하는 <내호아>의 태도가 못마땅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결코 위태롭지 않다’는
손자병법(孫子兵法)의 교훈을 굳이 들먹이지 않아도
싸울 상대에 대해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병법의 기본이라 할 수 있었다.
전쟁의 역사를 돌아보아도 자만심에 차 있던 군대가
패전의 쓴맛을 본 예는 비일비재(非一非再)했다.
하지만 이런 불만을 드러내 놓고 말할 수는 없었다.
어쨌든 큰 과오를 저지르지 않는 한
<내호아>는 양제가 임명한 십만 수군의 우두머리였다.
<내호아>의 선단이 평양의 장안성에서 육십여리 정도 떨어진 곳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패수의 강폭이 좁아지면서 강가의 지형이 평야에서 삼림으로 바뀌었다.
주변에는 소나무, 전나무, 이깔나무, 물푸레나무 등의 다양한 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차
강바람도 함부로 드나들지 못할 정도였다.
울창한 나무들로 인해 시야가 막히자 <주법상>은 불안감이 엄습하였다.
<주법상>은 급히 누선의 꼭대기에 있는 망루로 올라가서 사방을 둘러보았다.
강변을 감싸고 있는 거대한 숲이 눈에 들어왔다.
높은 곳에서 보니 마치 선단이 숲에 의해 포위당한 형국이었다.
숲 너머로 우뚝 솟은 산봉우리가 눈에 들어왔다.
그때였다. 갑자기 숲속에서 북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숲의 곳곳에서 나무들이 흔들리더니 강의 양안(兩岸)에서 화살이 무더기로 날아왔다.
수병(隋兵)들은 갑자기 날아온 화살을 맞고 쓰러져 갔다.
나무에 가려 어디에서 화살을 쏘는지 파악할 수가 없었다.
장수들의 명령에 따라 수병들은 날아오는 화살을 피해
선창으로 몸을 숨겼다가 일어나 반격을 개시했다.
선창에 장착된 쇠뇌에서 크고 억센 화살이 날았다.
고구려 군사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화살이 날아온 방향을 어림짐작해서 응사할 수밖에 없었다.
1천여 척의 배에서 일제히 화살이 날자 숲 속의 나무들은 완전히 벌집이 되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새어 나왔다.
수병들은 계속해서 수풀을 향해 화살을 마구 쏘아댔다.
수만 발의 화살이 순식간에 날아갔다.
타격이 컸는지 숲 속에서 더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주법상>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급히 <내호아>에게 달려가서 외쳤다.
“비명소리만 들릴 뿐 정말고구려 군사들이 죽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필시 우리의 화살을 소모시키려는 계책입니다. 당장 사격을 멈추어야 합니다.”
<내호아>는 그제야 깜작 놀라서 선창에서 일어서며 소리쳤다.
“화살을 낭비하지 마라. 배를 강변에 붙이고 상륙해서 고구려 군사들을 소탕하라.”
진장(鎭將) <염차廉差>가 군사들을 거느리고 제일 먼저 강의 좌안(左岸)에 상륙했다.
그 뒤를 이어 진장 <장현욱蔣鉉旭>의 부대가 강가에 도착했다.
이들이 상륙하자, 잠시 주춤했던 고구려군의 공격이 다시 시작되었다.
숲 속에 몸을 숨기고 있는 고구려 군사들의 모습이
수장(隨將) <염차>의 눈에 들어왔다.
한동안 활을 쏘던 고구려군 병사들은 화살이 떨어졌는지, 낭패한 기색이 역력했다.
<염차>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군사들을 휘몰아 숲 속으로 뛰어들었다.
치열한 단병접전(短兵接戰)이 벌어졌다.
고구려군은 비록 수가 적었지만 지형에 익숙하고 전투 경험이 풍부했기 때문에
쉽사리 밀리지 않았다.
아름드리나무에 피가 튀고 비명소리가 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졌다.
양측 군사들의 시체가 가랑잎처럼 바닥에 나뒹굴었다.
이때 <주법상>이 이끄는 후위군이 당도하자, 팽팽하던 균형이 일시에 무너져 내렸다.
가뜩이나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분전하고 있었는데,
두세 배나 넘는 수군의 병력이 한꺼번에 당도하니
고구려군은 순식간에 전멸될 위기에 놓였다.
고구려군은 수군의 공격을 받아치며 숲 안쪽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들의 동작이 어찌나 빠른지
마치 먹이를 채어 달아나는 매처럼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다.
<염차>가 그들의 뒤를 추격하려 하자, <주법상>이 말렸다.
“저 뒤에 어떤 함정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네.
우리는 이곳의 지형을 잘 모르지 않나? 자칫하면 군사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어.”
<염차>는 피투성이가 된 칼날을 나무기둥에 꽂으며 분을 삼킬 수밖에 없었다.
배로 돌아온 <주법상>이 <내호아>에게 고구려군 병사들을 물리쳤다고 보고했다.
“내 뭐라 했는가?
저들의 방비가 이처럼 허술하니 평양성으로 곧바로 쳐들어 간다해도
쉽게 함락시킬 수 있을 걸세.”
“이 모든 게 아군을 안심시키기 위한 저들의 술책일 수 있습니다.
일단 이곳에 정박하여 육군이 당도하기를 기다리는 게 좋겠습니다.”
<주법상>은 간곡한 어조로 말렸으나
<내호아>는 한시바삐 평양성으로 쳐들어가고 싶었다.
“그대는 어찌 그리 소심한가?
장수가 적을 눈앞에 두고 싸움을 피하기만 한다면
언제 승리의 기회를 잡을 수 있겠는가?”
<주법상>은 아무래도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하지만 <내호아>의 의지가 너무도 굳어서 반대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렇다면 제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이곳에 주둔하며 후위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맘대로 하게. 이번 일에는 많은 군사가 필요 없네.
내 단지 삼만의 병력만으로 평양성을 함락시켜 보일 테니,
그대는 이곳에서 낚시나 즐기고 있게나.
내 들으니, 패수에는 살찐 물고기들이 지천이라 하더군.”
<내호아>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다.
<주법상>은 모든 모욕을 참아 냈다.
자신이 잠시 모욕을 감수함으로써 수하 군사들을 위험에서 구할 수 있다면
백 번이라도 견딜 수 있었다.
<내호아>가 이끄는 수군은 적당한 곳에서 하선하여 대오를 짠 다음
평양성을 향해 나아갔다.
어느새 짙게 깔린 어둠 속에서도 <내호아>는 평양성을 점령하고
고구려의 국왕을 무릎 꿇릴 생각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어둠이 내려 성벽 위에 횃불이 오를 무렵,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더니 한 떼의 군마가
평양성의 서쪽 성문인 다경문(多景門) 앞에 당도했다.
“어서 문을 열어라.”
수문장(守門將)이 직접 횃불을 들고 살펴보니
무리 속에 태제(太弟) <고건무高建武>의 모습이 보였다.
수문장은 황급히 성문을 열었다.
밝은 곳으로 나서자 <고건무>의 갑옷에 남아있는 생생한 전투의 흔적들이 드러났다.
뒤를 따르는 군사들의 형편도 그다지 다르지 않았다.
“곧 적이 쳐들어올 테니 경계를 더욱 강화하라.”
<고건무>는 수문장에게 단단히 이른 후에
측신(側臣)인 <고승高勝>을 불러 은밀히 명령했다.
“<고승> 장군은 즉시 일지군을 이끌고
외성에 위치한 영명사(永明寺)로 가서 매복하시오.”
군사들의 배치를 모두 끝내고 성벽 위에서 밖을 내다보니
어느새 아름다운 풍경들이 검은 먹물을 뒤집어쓰고 있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난 후
강가를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이던 발소리가 성벽 아래서 멈추었다.
날이 밝아 성벽 아래가 똑똑히 보이게 되었을 때,
성 위의 군사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어느새 다경문 앞에 수병(隨兵)들이 잔뜩 포진하고 있었다.
고건무는 이미 예상하고 있던 일이었으므로 별다른 동요 없이 침착했다.
그는 신기(神氣)에 가까운 기마술(騎馬術)을 지녔다고 평가받는
무사(武士) <풍잠豊岑>을 불러 조용히 지시했다.
명령을 받은 <풍잠>은 전투준비를 마친 후 휘하의 군사를 집결시켰다.
그는 말을 타고 성문 쪽으로 걸어가더니 수문장에게 외쳤다.
“성문을 열어라.”
성문이 열리자, <풍잠>은 장창(長槍)을 앞세우고 뛰어나갔다.
그의 뒤로 삼천의 기병이 함성을 지르며 따랐다.
고구려 군사들이 갑자기 치고 나오자 수군 진영에서 동요가 일었다.
풍잠은 곧바로 <내호아>가 있는 본진을 향해 말을 달렸다.
<장현욱>이 오십근짜리 대부월(大斧鉞)을 세워 들고 <풍잠>의 앞을 막아섰다.
두 장수는 군마(軍馬)를 몰아 서로 붙었다가 떨어지기를 반복하여
삼십여 합을 나누었다.
<장현욱>은 자신의 용력(勇力)에 대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자부심을 갖고 있었으나,
<풍잠>의 마상창술(馬上槍術)이 너무 빠르고 현란해서 마치 춤을 추는 듯
아름다운 곡선을 만들어 내자 놀라고 부끄러워 온 몸이 달아올랐다.
<장현욱>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자, <염차>가 재빨리 달려와 싸움을 거들었다.
<풍잠>은 적장 두 명의 협공을 받게 되었지만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게 공격을 받아넘겼을 뿐 아니라
틈을 노려 상대의 허점을 찔러 들어갔다.
<풍잠>은 끊어짐이 없는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장창(長槍)을 놀리면서
두 사람을 괴롭혔다.
<염차>는 영리하게 치고 빠지면서
상대 공격의 맥을 끊고 빈틈을 노려 도룡대도(道龍大刀)를 휘저었다.
<장현욱>은 쇠도 자를 듯한 강골에서 뿜어져 나오는 무시무시한 힘으로
대부월을 풍차처럼 돌리면서 상대의 기운을 뺐다.
세 장수의 접전을 지켜보던 <내호아>는
합(合)이 이어질수록 자신의 부하들이 불리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명의 수군 장수가 단 한 명의 고구려장수에게 눌리자,
<내호아>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마음 같아서는 그대로 적장의 손에 해(害)를 입도록 놓아두고 싶었다.
그런 정도의 실력으로 어찌 대수제국(大隋帝國)의 용장(勇將)이라 할 수 있겠는가?
만일 그들의 패배로만 끝나는 일이었다면
<내호아>는 분명 그대로 지켜보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장수들의 싸움은
이번 전투에서의 승패를 가늠하고 기선을 제압하는 중요한 일전이었다.
이 싸움에서 수군 장수들이 진다면 고구려군사들의 사기가 오를 테고,
그리 되면 고전(苦戰)을 할 수 있었다.
<내호아>는 전군에 공격명령을 내렸다.
수군(隋軍)들이 쇄도해 들어가자, 팽팽했던 균형은 일시에 무너져 내렸다.
고구려 군사들은 수군의 공격에 힘겹게 저항해 보았지만
계속해서 성 쪽으로 밀려났다.
두 적장과의 결투에 몰입해 있던 <풍잠>은 사세가 불리해졌음을 깨닫고
그곳에서 몸을 빼내서 재빨리 도망쳤다.
기세가 오른 수군은 성문으로 달아나는 고구려군을 맹렬하게 추격했다.
평양성에서는 후퇴하는 군사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성문을 열었다.
그런데 뒤쫓는 수군의 속도가 너무도 빨랐다.
성문을 지키던 군사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놀라서 성문을 닫으려 했을 때는
이미 수군이 성안으로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고구려 군사와 수군 병사들이 뒤섞이며 성문주변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 틈에 <내호아>는 본대를 이끌고 성문을 점령해 버렸다.
졸지에 성문을 빼앗긴 고구려 군사들의 얼굴에는 당황하는 기색이 떠올랐다.
<내호아>는 곧 고구려의 국왕을 잡을 수 있다는 꿈에 부풀어
숨 돌릴 틈도 없이 밀어붙였다.
하지만 평양성(平壤城)은 외성(外城)과 중성(中城), 내성(內城)으로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에 외성의 성문을 통과했다고 해도
왕궁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관문이 많았다.
외성을 지키고 있던 고구려 군사들은 수국의 군대가 성안으로 몰려들자,
외성을 버리고 정양문(正陽門)과 함구문(含句門)을 통해서 중성으로 피한 후,
성문을 굳게 닫았다.
외성을 빼앗은 <내호아>는 중성과 내성 또한 곧 함락시킬 수 있으리라 자신했다.
마침 날이 저물자,
<내호아>는 하루 종일 전투에 지친 군사들에게
성민(城民)들이 떠나 텅 빈 집들을 배정해 주고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
일단 외성에서 밤을 보낸 후,
전열을 정비하여 단번에 중성과 내성을 돌파할 생각이었다.
평양성의 외성은 서민(庶民)들이 주로 사는 지역으로
바둑판처럼 반듯하게 구획되어져 있었고, 그 사이로 길이 곧게 뻗어 있었다.
길가에 가로수들이 줄을 맞추어서 있는 모습이 도성 전체가 잘 정돈된 느낌을 주었다.
각 구획마다 집들이 들어서 있는데 어림잡아도 수만 채에 이를 듯 했다.
이것만 보아도 평양성이 얼마나 번화한가를 짐작할 수 있었다.
집들은 규모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로 소담하고 정결했다.
하지만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고구려 백성들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이미 수군의 침입소식을 듣고 모두 중성으로 대피를 마친 듯했다.
수국의 군사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온 군량을 아끼기 위해서
집집마다 식량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았지만 어찌나 철저하게 챙겨 갔는지
겨우 찾은 것이라고는 오래된 곡식 몇 자루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개와 닭 몇 마리 정도였다.
수군 병사들은 오랜 항해로 인한 피로와
고구려의 도성을 점령했다는 자만심에 군기가 해이해졌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피로에 지친 수군 병사들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파수를 보는 병사들의 시선은 온통 정양문과 함구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혹시라도 고구려 군사들이 성문을 열고 나와 기습해 올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새벽녘이 되자, 어둠이 몰고 온 정적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피워 놓은 화톳불의 불씨는 사그라 들었고,
보초를 서는 군사들도 선 자세로 졸고 있었다.
그들은 간간이 졸다가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는 통에 놀라서 깨기는 했지만
주변이 조용한 것을 확인하고는 다시 잠에 빠져들었다.
평양성은 언제 전투가 있었나 싶게 평화롭고 고즈넉했다.
이때 어둠 속에서 발소리를 죽이며 움직이는 한 무리의 그림자가 있었다.
무리는 점점 그 수가 늘어나더니 순식간에 길가를 가득 메웠다.
앞선 사내가 횃불을 받쳐 들며 뒤따르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불길이 일고 쇳소리가 울리면 적병들이 집 밖으로 뛰쳐나올 것이다.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베어라.”
불빛에 비친 얼굴은 바로고 <건무>의 측신인 <고승>이었다.
<고승>은 <고건무>의 명령을 받고 영명사에 숨어 있다가
적군이 방심하고 있는 틈을 타서 기습을 감행하려는 것이었다.
이윽고 성 곳곳에서 불길이 오르고 쇠를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면서
고구려 군사들의 함성소리가 사방에 진동했다.
외침을 듣고 놀라서 집 밖으로 뛰쳐나오던 수군 병사들은
밖에서 지키고 있던 고구려군의 공격을 받고 목숨을 잃었다.
고구려 군사들은 창으로 수병들을 찌르다가 허리에 찬 칼을 뽑아 목을 베었다.
저승사자라 해도 이보다 빠를 수는 없었다.
넓은 저택에 들어 비단으로 꾸며진 호사스런 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내호아>는
밖에서 일어난 소란에 눈살을 찌푸리며 일어났다.
창밖에서 화광(火光)이 새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놀란 <내호아>는
문을 열고 뛰쳐나오며 부하들을 찾았다.
“게 아무도 없느냐?”
이때 진장 <염차>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집 안으로 급히 뛰어 들어왔다.
“고구려 군사들이 기습을 해왔습니다.
분명 중성으로 통하는 문들은 충분히 경계했는데
어디서 갑자기 나타났는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군사들은 어찌됐느냐?”
“각기 집을 배정해 분산해 놓은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군사는 한 군데 모아 두어야 힘을 발휘하는 법인데,
이리 흩어져 있으니 아무리 수효가 많아도 고구려 군사들을 막아 내기 어렵습니다.”
<내호아>는 자만심으로 전술의 기본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자신을 자책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어서 군사들을 모으도록 해라.
저들은 이 외성(外城) 어딘가에 숨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수효가 그리 많지 않을 테니,
정신만 바짝 차린다면 곧 진압할 수 있을 것이다.”
<내호아>는 <염차>를 대동하고 집 밖으로 나가 화광이 충천한 성안 구석구석 돌며
놀라고 흥분한 군사들을 진정시키고 모이도록 했다.
그들이 다경문과 고리문을 잇는 대로에 접어들었을 때,
<장현욱>이 한 명의 적장과 자웅(雌雄)을 겨루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장현욱>은 있는 힘을 다해 대부월(大斧鉞)을 내두르며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였으나
그의 움직임은 점점 둔해지기 시작했다.
반면 <장현욱>과 맞서는 고구려의 장수 <고승>은 마치 어린 아이를 상대하는 듯
<장현욱>의 공격을 너무도 쉽게 피하고 있었다.
“제법 근사한 무기를 들었다마는
겨우 그 정도 실력으로는 네 한 목숨 부지하기도 어렵겠구나.”
<고승>은 교묘하게 <장현욱>의 비위를 건드리고 있었다.
이에 <장현욱>은 냉정을 잃고 마구잡이로 대부월을 휘둘렀다.
싸움에서 냉정을 잃으면 상대의 기량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그리되면 당연히 승리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마련이었다.
<염차>는 <장현욱>의 목숨이 경각(頃刻)에 놓여 있음을 깨닫고 재빨리 달려가서
<고승>에게 덤벼들었다.
<내호아>도 군사들을 거느리고 그를 돕기 위해 달려갔다.
구원군이 달려오는 것을 본 <고승>은 쓴웃음을 지으며 돌아섰다.
“명(命)이 길기도하구나.
이번에는 그냥 살려 두겠다. 되도록 내 눈에 띄지 않는 게 오래 살 수 있는 길이니라.”
<고승>은 군사를 이끌고 정양문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적장에게 단단히 창피를 당한 <장현욱>은 얼굴을 들 수 없었다.
당장 만회를 하지 못한다면 어찌 군사들 앞에서 호령을 할 수 있겠는가?
차라리 스스로 칼을 물고 자결하는 게 나을 일이었다.
여전히 성안 곳곳에서 불길과 함께
고함소리와 창칼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장현욱>은 투구를 벗어던지고 머리를 풀어 헤치며 외쳤다.
“내 만일 이 치욕을 갚지 못한다면 살아서 이곳을 떠나지 않으리라.”
<장현욱>은 휘하의 군사들을 이끌고 정양문 쪽으로 달렸다.
그의 안위를 걱정한 <염차>는 이를 말리기 위해서 뒤쫓았다.
달려가는 <염차>의 등 뒤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뒤에 남은 <내호아>는 대로변으로 도망쳐 나온 군사들을 모아서 반격을 준비했다.
인원을 점검해 보니 원래 인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실로 막심한 피해가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내호아>의 오기는 꺾이지 않았다.
“적의 기습은 전장에서 늘 있는 일이다.
비록 이번 일로 약간의 피해를 입기는 했지만
우리는 아직 고구려군을 압도할 힘을 가지고 있다.
지금부터 반격을 개시하여 애석하게 돌아간 전우들의 원한을 갚아 주도록 하자.”
<내호아>는 군사들을 독려하여 반격에 나섰다.
해가 선명하게 붉은 얼굴을 드러냈다.
수군의 창검이 햇살을 받아 다시금 빛났다.
그때 멀리서 <염차>가 헐레벌떡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 뒤를 따르는 군사들 역시 무언가에 쫓기는 듯 급히 뛰어왔다.
<내호아> 앞에 당도한 <염차>가 다급하게 외쳤다.
“고구려의 주력군이 함구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걱정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이미 상당한 전력을 잃은 마당에 양쪽의 적군을 한꺼번에 상대하기는 벅찬 일이었다.
그때 <염차>가 고개를 푹 꺾으며 말 위에서 떨어졌다.
<내호아>가 황급히 다가가 어깨를 잡고 일으키려 하는데 끈적한 감촉이 느껴졌다.
<내호아>가 놀라서 그의 어깨 부위를 살피니 깊은 창상을 입었는지
피가 흥건히 배어 나오고 있었다.
“이보게, 괜찮은가?”
<염차>가 잦아드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다.
“<장현욱>의 시신을 찾아서 함께 고향으로 보내 주십시오.”
<염차>는 이 말을 남긴 채 고개를 떨구었다.
그렇다면 <장현욱> 또한 죽음을 당했다는 뜻이었다.
<내호아>는 졸지에 수족(手足)을 잃은 듯했다.
아무리 불굴의 정신으로 무장한 그였지만 이번 충격에서는 쉬이 벗어날 수 없었다.
<내호아>가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황금 갑주(甲胄)를 입은
<고건무>가 이끄는 고구려의 왕성 수비대가 그 위용을 드러냈다.
<내호아>는 급히 말에 올라 군사를 정돈하여 고구려 군사들을 맞았다.
<고건무>가 등편(藤鞭)을 치켜들고 <내호아>에게 큰 소리로 호통쳤다.
“네놈이 수(隋)의 수군총관(水軍總管) <내호아>로구나.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왔더란 말이냐?
너는 성지(聖地)를 더럽혔으니 당연히 큰 벌을 받아야한다.”
<내호아>는 <고건무>만 죽이면 상황을 반전시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장검(長劍)을 빼들고 <고건무>에게 달려들었다.
<고건무>의 호위무사인 <풍잠>이 <내호아>의 앞을 막아섰다.
두 사람의 창과 칼이 부딪치는 것을 신호로
고구려군 병사들이 일제히 수군에게 달려들었다.
수군 병사들도 함성을 지르며 이에 맞섰지만 이미 사기가 꺾인 상태였으므로
무기를 버린 채 제각기 살길을 찾아 달아났다.
<내호아>는 <풍잠>의 상대가 될 수 없었다.
숨 쉴 틈 없이 몰아치는 <풍잠>의 공격에 점점 팔의 감각이 무뎌졌다.
<내호아>는 더 버티다가는 목숨을 건지기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풍잠>을 공격하는 척 하다가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다.
일단은 목숨을 건져 후일을 기약하겠다는 생각이었다.
<내호아>가 달아나자,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던 수군 병사들마저 무너져 내렸다.
이제 이들은 그저 살길을 찾아 헤맬 뿐이었다.
<내호아>는 호위 군사 십 수명의 호위를 받아 혈로를 뚫고
간신히 대동문(大同門)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미 <풍잠>이 길을 막고 서 있었다.
<풍잠>은 외성 안의 지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길을 앞질러 와 있었던 것이다.
“구차하게 살려 애쓰지 말고 순순히 목을 내놓아라.”
<풍잠>이 장창(長槍)을 곧추 세우고 서서히 <내호아>에게 다가갔다.
<내호아>는 살기를 포기하고 그 자리에서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런데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갑자기 대동문이 열리더니 한 떼의 군사들이 성안으로 몰려 들어왔다.
<풍잠>이 놀라서 손을 멈칫하고 있을 때,
백여 명의 수병(隋兵)들이 달려와 <내호아>를 감쌌다.
“장군, 괜찮으십니까?”
익숙한 목소리였다.
눈을 떠 보니 어느 틈에 <주법상>이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이 이처럼 반갑기는 처음이었다.
평소에 사사건건 참견을 해대는 통에 밉상으로만 여겼는데,
이제는 하늘에서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 보낸 신장(神將)처럼 느껴졌다.
<내호아>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서 이곳을 피하셔야합니다.
고구려의 본군이 당도하면 남은 전력으로는 막아내기 어렵습니다.”
앞장을 선 <주법상>이 <풍잠>을 밀어 재끼며 무섭게 말을 몰아 나갔다.
<내호아>는 그새를 놓칠세라 황급히 뒤따랐다.
뒤에서는 “<내호아>를 잡아라”라는 고구려 군사들의 외침소리가 따갑게 들려왔다.
<내호아>는 온 힘을 다해 지친 말에 채찍을 내리쳐서 꽁무니를 뺐다.
이리하여 <내호아>가 구사일생(九死一生)으로 대동문을 빠져나가 선착장에 당도하니
배가 기다리고 있었다.
<내호아>는 배에 몸을 싣고서야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내호아>가 탄 배는 곧바로 노를 저어 선착장을 떠났다.
점점 멀어져 가는 평양성을 바라보며
<내호아>는 한바탕 악몽(惡夢)을 꾼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가 거느렸던 3만의 군사들 중 살아남은 수군은 겨우 삼십 명뿐이었다.
수군의 대참패였다.
“해가 한창 중천에 있는데 악몽이라니. 필시 낮도깨비에 홀린 것이 분명해.”
<내호아>는 고개를 저으며 측은하게 중얼거렸다.
해는 여전히 하늘에 떠있고, 패하의 시퍼런 물은 쉼 없이 하류로 배를 밀어내었다.
21. 전쟁사(戰爭史)에 길이 빛날 살수대첩(薩水大捷)
<우중문于仲文>·<우문술宇文述> 등이 이끄는
30만 5천명의 수군(隨軍) 별동대(別動隊)는 평양성(平壤城)으로 직공하라는
양제(煬帝)의 특별명령을 받고 새로운 각오로 요동을 출발하였다.
그런데 이들은 진군하는 도중
고구려군의 완강한 차단작전(遮斷作戰)에 시달려야 했다.
<우중문>은 약한 군마 수천 기를 맨 끝에 세우고 앞에는 정기(精騎)를 거느렸다.
고구려 군사들이 후방에서 기습하며 치중대(輜重隊)를 습격하자
<우중문>은 정기를 돌려 고구려의 유격대를 물리쳤다.
<우중문>의 부대는 치중대에 손상을 입었지만
다른 군단에서는 이미 더 많은 타격을 입었다.
백일치의 식량과 무기,군수장비와 천막까지 합치면
병사 하나가 짊어져야 하는 무게는 곡식 3석과 맞먹었다.
더운 여름에 이런 엄청난 짐을 짊어지고
몇 백리를 이동한다는 것은 매우 고된 행군이었다.
병사들은 무게를 견디다 못해 몰래 식량을 버렸다.
앞으로 찾아올 굶주림에 대한 걱정보다는 당장 짓누르고 있는 고통을 참을 수 없었다.
<우중문>을 비롯한 장수들은 이를 막기 위해 군량을 버리면
참수형(斬首刑)에 처한다는 엄격한 군령을 내렸지만 소용이 없었다.
수군이 대릉하에 닿을 때쯤에는 그들의 식량은 보름치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심각한 군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지에서 먹을거리를 찾았지만,
이미 을지문덕의 명령에 의해서 백성들이 깊은 산이나 성으로 피신하면서
식량이 될 만한 것은 곡식 한 톨조차도 거두어 간 이후였다.
아무리 용맹스러운 군사들이라고 해도
식량이 떨어지면 싸울 의욕이 꺾이기 마련이었다.
이처럼 사기가 떨어진 상태라면 앞으로 벌어질 전투의 결과는 뻔했다.
군사들이 취사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우문술>은
힘겹게 발걸음을 옮겨 <우중문>의 막사에 들어갔다.
<우중문>은 밤새 한숨도 잠을 자지 못했는지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장군, 이제 식량이 보름 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이쯤에서 돌아가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다.
“고르고 고른 삼십만의 정예 군사를 이끌고 와서 아무런 전과없이 돌아간다면
폐하의 노여움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소?
차라리 이곳에서 칼을 물고 자결하는 것이 나으리다.”
우중문의 말이 격하게 튀어나왔다.
그 또한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기까지 와서 한번 싸워 보지도 않고 물러날 수는 없었다.
“이제 대릉하만 건너면 평양성이 그리 멀지 않소이다.
단숨에 달려가 평양성을 함락시키고 그들이 비축해 둔 식량을 빼앗으면
군사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소이다.”
<우중문>은 애써 희망을 얘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문술>은 상황을 그리 낙관적으로 보지 않았다.
현재 고구려군의 중심에는 을지문덕이 있지 않은가?
그의 신출귀몰한 지략은 이미 수국의 조정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우문술>로서는 그의 존재가 신경 쓰이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믿었던 <내호아>의 수군이 평양성 전투에서 패하여,
해포로 물러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평양성의 방비 또한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때 <내호아>는 <주법상>의 도움으로 간신히 평양성에서 탈출한 뒤,
해포로 물러나 사태를 관망하고 있었다.
“이는 <내호아>가 성급하게 굴다가 고구려인들의 계책에 넘어갔기 때문이요.
더는 왈가왈부하지 맙시다. 이대로 돌아간다면 그대나 나나 모두 죽는 목숨이오.”
<우중문>의 비장한 한마디에 <우문술>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차라리 고구려군과 맞붙어 싸우는 것이 목숨을 건질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
정오가 되자, <우중문>은 자신의 막사로 장수들을 소집했다.
“내일까지는 군사들을 충분히 쉬게 하시오.
모래 날이 밝으면 대릉하를 건너 평양성으로 진군합시다.
이제 조금만 참으면 풍요로운 평양성에서
마음껏 약탈을 즐길 수 있다고 군사들을 독려해 주시오.
절대 군사들 앞에서 불안한 내색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오.”
장수들은 자못 비장하게 명을 받았다.
<우문술>은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눈을 내리깔고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때 호위병이 뛰어 들어오더니 아뢰었다.
“지금 진영 앞에 자신을
고구려의 병마원수 <을지문덕>이라고 칭(稱)하는 자가 와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좌중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을지문덕乙支文德>은 고구려의 막리지(莫離支)이자 병마원수(兵馬元帥)로서
고구려 백성들의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호랑이 소굴이나 다름없는 수군 진영에 나타났다는 사실은
놀랍기 그지없었다.
<우중문> 역시 전혀 뜻밖의 일에 의심이 먼저 들었다.
어쩌면 적정(敵情)을 살피기 위해서 <을지문덕>을 가장한 인물을 보냈을지도 몰랐다.
아무래도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이리 위험한 곳에
제 발로 나타난다는 건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가짜든 진짜든 확인을 해 볼 필요는 있었다.
<우중문>은 호위병에게 명해 <을지문덕>이라 칭하는 자를 데리고 오라 했다.
잠시 후 기품과 영민함이 느껴지는 고구려의 장수 하나가 들어왔다.
투구 아래 단아한 콧날과 어우러지는 수염,
그리고 깊고 흡인력이 있는 눈은 그가 <을지문덕>이 분명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을지문덕>이 앞으로 나서자, 철린으로 된 갑옷이 출렁이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다.
그는 적진 한 가운데에서도 조금도 주눅 든 빛이 없이 태연했다.
“그대가 을지문덕이오?”
<우중문>은 여전히 미심쩍었다.
“그렇소. 내가 바로고구려의 병마원수 <을지문덕>이오.”
<우중문>은 앞에 서 있는 <을지문덕>을 보며 양제의 당부를 떠올렸다.
“이번 전쟁에서 고구려의 국왕과 <을지문덕> 두 사람만 잡는다면
우리의 승리는 따 논 당상이다”
그만큼 <을지문덕>이란 이름은 고구려인들의 자부심이었고,
수국(隨國)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그러니 눈앞에 있는 자가 정말 <을지문덕>이라면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가 아닐 수 없었다.
“그대가 <을지문덕>이 분명하다면 그냥 둘 수 없다. 여봐라, 당장 저 자를 포박하라!”
<우중문>의 명령을 듣고 호위병들이 다가서자
<을지문덕>은 오히려 태연함을 잃지 않으며 준엄하게 호통쳤다.
“나는 대고구려 태왕폐하의 어명을 받고 왔으니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마라.”
<을지문덕>을 묶으려고 밧줄로 옭아매려던 수군 병사들은
그의 기백에 눌려 주춤 물러섰다.
“귀국은 어찌하여 아무런 잘못도 없는 우리나라를 침범했는가?
비록 지난날 양국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는 했지만
이후로 화친을 맺고 선린관계를 유지해온 사이가 아닌가?
이번 사태는 심히 유감스럽지만
우리 폐하께서는 아직도 수나라와의 화목한 관계를 깨뜨리고 싶어하지 않으시오.
그런 뜻에서 공격을 받아도 방어에만 전념하고 일체 반격을 하지 마라 명하셨소.
그러니 지금이라도 군사를 물려서 돌아가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쪽에서도 반격에 나설 수밖에 없소이다.
부디 요하와 평양성에서 당했던 불행한 일들을 잊지 말고 현명하게 처신하시구려.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오.”
<을지문덕>은 이성에 대한 호소로 시작해서
불행한 사태를 자초하지 말라는 경고로 마무리했다.
하지만 <우중문>도 그리 만만한 인물은 아니었다.
“고구려가 죄가 없다니, 그런 어불성설(語不成說)이 어디 있소?
고구려는 돌궐을 부추겨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지 않았소?
이번에는 결코 당하지 않겠소.”
“우리가 돌궐과 연합하여 수국을 공격하려 했다니 말도 안 되오.
이 모두가 서로 간의 오해에서 비롯된 듯하니 이쯤에서 체면을 지키고 돌아가시오.
우리 태왕 폐하께서는 귀국이 이대로 군사를 물린다면
이제까지의 잘못을 불문에 부치겠다고 하셨소.
또한 양국의 우호관계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귀국을 방문하실 의향이 있음을 전하라 하셨소이다.”
<을지문덕>의 말은 단호하면서도 설득력이 있었다.
“정말 고구려의 국왕께서 직접 장안으로 와서 우리 폐하를 알현하시겠다고 하셨소?”
<우중문>은 <을지문덕>의 말에 귀가 솔깃했다.
그처럼 고구려가 고개를 숙인다면 구태여 싸움을 계속할 필요는 없었다.
고구려군의 전력으로 볼 때 수국(隋國)이 꼭 이긴다는 보장이 없었고,
만일 패배하기라도 한다면 나라의 뿌리까지 흔들릴 수 있었다.
“수군이 국경 밖으로 물러난 것이 확인되면 바로 수국의 도성으로 가실 것이오.”
<을지문덕>의 확신에 찬 대답은 <우중문>에게 믿음을 심어주었다.
“그렇다면 양국의 화평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 봅시다.”
<우중문>은 일이 의외로 쉽게 풀리는 듯해서 한결 마음이 가벼웠다.
“그럼 내 그리 알고 돌아가겠소. 다시 볼 때는 서로 웃을 수 있기를 바라겠소.”
<을지문덕>이 예를 갖추고 돌아가려 하자, <우문술>이 칼을 뽑아 들고 가로 막아섰다.
“폐하의 명령을 벌써 잊었던 말입니까?
내 이 자리에서 저 자를 베지 않는다면 어찌 폐하를 다시 뵐 수 있겠소?”
<우문술>의 반대가 거세자 <우중문>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잠시 주춤했다.
그때 위무사(慰撫使) <유사룡劉士龍>이 나섰다.
“자고로 사자(使者)의 목숨은 뺐지 않는 것이 전장에서의 관례입니다.
신의를 버리고 사신을 죽여서 대국의 명성에 먹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폐하의 명령이라 하지 않았소?”
“지금은 전시(戰時)입니다.
전시에는 누구보다도 지휘관의 판단이 우선입니다.
만일 <을지문덕>을 벤다면
모처럼 고구려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가게 됩니다.”
양제의 측근인 <유사룡>의 말이었으므로 <우중문>은 <우문술>의 반대를 물리치고
<을지문덕>을 보내 주었다.
<우문술>은 진영을 떠나는 <을지문덕>의 뒷모습을 보며
이대로 보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부랴부랴 아장(亞將)인 <동상포董相飽>에게 명령해
군사를 거느리고 <을지문덕>을 추격하게 했다.
이미 이를 예상하고 있던 <을지문덕>은 진영을 나서자마자 전속력으로 달렸다.
그를 수행하던 십여 명의 부하들도 후방을 경계하며 뒤를 따랐다.
<동상포>의 추격병 들이 <을지문덕> 일행을 뒤쫓아 대릉하에 도착했을 때
<을지문덕>은 벌써 강가에 닿아 배에 올라탄 후였다.
<동상포>는 언덕에 올라 <을지문덕>에게 황급히 외쳤다.
“고구려의 <을지문덕> 원수께서는 잠시 멈추십시오.
<우중문> 장군께서 고구려의 국왕께 보내는 선물이 있습니다.
돌아오셔서 받아 가시지요.”
그러자 <을지문덕>이 껄껄 웃으며 말했다.
“내 곧 군사를 이끌고 직접 받으러 갈 것이니 우 장군께는 기다리시라 전하게.”
<동상포>는 배를 타고 유유히 사라지는
<을지문덕>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동상포>의 보고를 받은 <우문술>은 가슴이 답답했다.
<을지문덕>에게 보기 좋게 우롱을 당한 것이었다.
<을지문덕>을 잡을 절호의 기회를 놓치다니
땅을 치고 하늘을 우러러 통탄할 일이었다.
만약 양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모두 죽는 목숨이었다.
이제 유일한 살 길은 한시라도 빨리 대릉하를 건너 평양성을 함락시키는 것뿐이었다.
<우문술>은 짙푸른 강물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이 강을 건너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었다.
한편 수군의 진영을 살피고 백마산성(白馬山城)으로 돌아온 <을지문덕>은
휘하의 장수들을 불러 모았다.
“저들은 지금 오랜 행군으로 인한 피로와 식량 부족에 따른 굶주림으로
매우 지친 상태이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우중문>이나 <우문술>을 비롯한 장수들은 실전경험이풍부한 용장이고,
삼십만이나 되는 대군이 목숨을 걸고 싸운다면 우리로서는 감당해 내기 어렵다.
우리가 이기려면 최대한 적군의 기운을 빼 놓아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군을 속일 계책이 필요하다.
앞으로 저들과 맞붙게 되면 절대 싸움에 이겨서는 안 된다.”
<을지문덕>의 얼굴에는 비장함이 묻어났다.
대형(大兄) <이갑정李岬丁>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그럼 저들에게 일부러 져야 한단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나는 그들을 평양성의 만찬에 초대하려 한다.
그러려면 손님을 맞을 준비가 필요하겠지.
<고이중> 장군은 즉시 오천의 군사를 거느리고 식성으로 떠나라.”
대모달(大模達)<고이중高利重>은 이미 언질을 받았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떠났다.
하지만 다른 장수들은 <을지문덕>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고이중>은 <을지문덕>이 가장 신임하는 인물인 만큼
그에게 맡겨진 임무가 중요하리라고 짐작할 뿐이었다.
“저들이 살수(薩水)를 건넌 후에는 맞아 싸우다가
적당한 때를 노려 패배한 척 후퇴하라.
그러면 수군은 기고만장(氣高萬丈)하여
금방이라도 우리를 굴복시킬 기세로 평양성으로 달려올 것이다.
때가 되면 그들의 숨통을 끊을 것이다.”
<을지문덕>은 장수들을 하나씩 불러 일일이 지령을 내렸다.
장수들은 명령을 받고 제각기 어디론가 달려갔다.
이제 남은 것은 마상창술(馬上槍術)에 일가견(一家見)이 있는 장수인
모달(模達) <임유林裕>뿐이었다.
“저에게는 아무 일도 안주십니까?”
임유가 볼멘소리로 <을지문덕>에게 물었다.
<을지문덕>은 은근히 웃으면서 말했다.
“그럴 리가 있나?
<임유>장군은 삼천의 군사를 이끌고 살수 상류로 올라가서
통나무와 진흙, 바위, 소가죽 등을 이용해서 제방을 쌓아라.
제방의 중앙에는 통나무로 수문(水門)을 만들고 그 둘레에 소가죽을 대도록 해야 한다.
수군이 평양성에서 후퇴하게 되면 이틀 후에는 살수에 닿을 것이다.
수군 병사들이 강을 반쯤 건넜을 때 수문을 파괴하라.
그러면 그놈들을 수장(水葬)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임유>가 <을지문덕>에게 다시 물었다.
“수문을 터뜨리는 것은 쉬운 일이나
물이 미쳐 도달하기 전에 수군이 강을 건너게 되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수국의 군사들이 살수를 건너려면 족히 한두시간은 걸리겠지만
제방을 터트린 후 강물이 수나라 군사들이 있는 곳에 도달하기까지는
반시간이면 족하다.
장군은 제방을 터트린 다음 강을 따라 내려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강을 건너오는 수군을 각궁으로 사살하라. 한 놈도 살려 보내서는 안 된다.”
임유는 군사 삼천을 이끌고 살수 상류로 출발했다.
<을지문덕>의 계획대로만 된다면
수국의 삼십만 별동대는 무사히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었다.
<우문술>과 <우중문>이 이끄는 수국의 삼십만 별동대는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대릉하를 건넜다.
강변에 오르자, 백마산성이 눈에 들어왔다.
백마산 골짜기에 의지해서 지어진 둘레가 오 리쯤 되는 작은 산성이었다.
<우중문>은 몇 천의 군사를 파견해서 성을 치게 했다.
그런데 성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우중문>은 의아한 생각이 들었지만 지체할 여유가 없었다.
그는 백마산성을 뒤로하고 남으로 행군을 재촉했다.
수군은 대릉하를 건넌 지 이틀 만에 박천을 지나 살수에 도착했다.
이곳까지 오는 동안 고구려 군사들은커녕 쥐새끼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시퍼런 물이 넘실대는 살수를 바라보며 <우중문>이 말문을 열었다.
“어찌 된 일인지 고구려군사들은 한 놈도 보이지 않으니,
아무래도 무언가 잘못된 듯하오.
혹시 우리가 <을지문덕>의 함정에 빠진 거나 아닌지 모르겠소이다.”
<우문술>도 같은 생각이었지만 지금에 와서 그런 말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었다.
“너무 염려 마십시오. 살수를 건너면 고구려 군사들이 보일겁니다”
<우중문>은 <우문술>의 말을 듣고 마음의 평정을 되찾았다.
그는 군사들에게 뗏목과 부교를 만들게 했다.
그러나 수군 병사들은 좀처럼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
계속된 행군에 지칠대로 지친데다가 대릉하를 건넌 이후부터는
식사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허기진 상태였다.
장수들은 명령을 따르지 않는 군사들을 채찍으로 휘갈겼다.
군사들은 그제야 마지못해 일어나 툴툴거리며 나무를 베고 뗏목을 만들기 시작했다.
하루를 허비했는데도 겨우 이백 척 정도의 뗏목을 만들었을 뿐 이였다.
<우중문>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군사들을 모아 놓고 일장 연설을 했다.
“군사들은 들어라!
이강만 건너면 산해진미와 금은보화가 가득한 평양성이 보일 것이다.
그러니 어서 힘을 내서 강을 건널 준비를 하자.”
그제야 수군 병사들은 분발하여 뗏목을 띄우고 부교를 가설했다.
수군이 살수를 건너자 고구려 군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평양성으로 돌아온 <을지문덕>은 이제 수성에만 머무르지 않고
군사들을 보내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고구려는 국내 사정이 안정되어 있었기에
국경 이외의 성에는 많은 군사를 두지 않았다.
그래서 식성 같은 규모가 큰 성에도 군사가 삼천을 넘지 않았다.
비록 을지문덕휘하의 정예군 사만이 가세하기는 했지만
수국의 대군을 정면으로 막아낼 수는 없었다.
<고이중>이 이끄는 고구려군은 30만의 수군 별동대에게 일부러 싸움을 걸었다가
전세가 불리해지면 퇴각하는 유인전(誘引戰)을 거듭하면서
적병들을 평양성 쪽으로 끌어들였다.
식성을 시작으로 청룡산성에 이르기까지
예닐곱 개의 성이 차례로 수군에 의해 점령되었다.
고구려군과 일곱 차례의 교전을 벌여 모두 승리한 <우중문>은
더 이상 고구려군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제 평양성을 함락시키고 나면 <을지문덕>은 물론
영양태왕까지 자신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목숨을 구걸하게 될 것이었다.
그때가 되면 <을지문덕>에게
자신을 기만한 일의 대가가 얼마나 컸던가를 일깨워줄 생각이었다.
거듭되는 승전으로 인해 자만심에 사로잡힌 <우중문>은
거침없이 진격하여 평양성에서 삼십여리 떨어진
대성산(大成山)의 북쪽 편에 진을 쳤다.
평양성으로 진격하기 위해서는 대성산을 넘어야 하는데,
산이 매우 험할 뿐 아니라 산등성이에는
북쪽에서 침입해 오는 적을 막기 위한 산성이 쌓여져 있었다.
수군(隨軍)은 있는 힘을 다해서 대성산성을 공격했다.
하지만 지형이 험준하고 성곽이 견고해서 쉽게 함락시킬 수 없었다.
그동안 승리의 단물에 취해 있던 수군 병사들은 대성산성에 주둔하고 있는
<을지문덕> 휘하의 고구려군이 격렬하게 저항하자 많은 피해를 입고 물러나야 했다.
성이 함락되지 않고 장기전(長期戰)으로 흐를 기미가 보이자,
<우중문>을 비롯한 수장(隨將)들은 당황했다.
그들은 이미 식량이 바닥이 난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수군은 대릉하를 건넌 후 줄곧 승전을 해왔으나
고구려군은 급히 달아나면서도 식량만은 반드시 챙겨갔기에 아무 것도 얻지 못했다.
한나절 동안 줄기차게 산성을 공격했지만 사상자만 늘어날 뿐 아무런 진전이 없었고,
게다가 제대로 먹지 못한 군사들은 결국 전의(戰意)를 상실하여
그냥 놓아둬도 제풀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이를 보다 못한 <우문술>이 <우중문>에게 이렇게 권했다.
“더 이상 싸우는 건 무리입니다.
비록 평양성을 눈앞에 두고 돌아가는 것이 아쉽지만
자칫하면 모두 굶어 죽을 수 있으니
한시라도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좌둔위장군(左屯衛將軍) <신세웅辛世雄>이 반대하고 나섰다.
“이제 조금만 더 힘을 쏟으면 성을 함락시킬 수 있습니다.
어찌 이런 상황에서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물론 아군의 식량난이 심각하지만 조금만 참고 버티면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우후위장군(右侯衛將軍) <왕인공王仁恭>이 조심스럽게 반론을 제기했다.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대릉하를 건넌 이후 아군은 너무도 순조롭게 이곳까지 달려왔습니다.
비록 몇 차례 고구려군의 저항이 있었지만
대성산성(大成山城)을 지키고 있는 고구려군의 강인함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물러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처럼 장수들의 의견이 분분하니 <우중문>으로서도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그때 번을 서고 있던 <유사룡>이 막사 안으로 들어섰다.
“고구려 진영에서 사자(使者)를 보내왔습니다.”
좌중이 일순 술렁거렸다.
<우중문>은 혹시 항복이라도 청하는 게 아닐까 하는 기대를 하며
사자를 들이도록 했다.
<을지문덕>의 명령을 받고 수군 진영으로 온 고구려의 사자는
소형(小兄) <고우총高于寵>이었다.
그는 막사로 들어와 <우중문>에게 정중히 예를 갖추며 말했다.
“저희 병마원수께서 우장군께 긴히 전하라는 서찰(書札)이 있습니다.”
<고우총>이 건네주는 봉투를 받아 든 <우중문>은 곧 봉투를 뜯고 서찰을 펼쳐 보았다.
<을지문덕>이 직접 쓴 한 편의 시(詩)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神策究天文 신통한 계책은 하늘의 이치에 닿았고
妙算窮地理 신묘한 책략은 땅의 이치마저 통달했네.
戰勝功旣高 싸움에 이겨 공로가 이미 높으니
知足願云止 만족함을 알고 이제 그만 돌아감이 어떠하리요.
언뜻 보면 <우중문>을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심히 그 뜻을 헤아리면 다분히 조롱의 뜻이 담겨 있었다.
<우중문>은 그 정도 행간(行間)을 읽지 못할 정도로 우둔하지는 않았다.
그는 서찰을 읽고 나서야
그동안 수군(隋軍)이 승승장구(乘勝長驅)했던 이유를 깨달았다.
그것은 자신의 뛰어난 통솔력 때문이 아니라 <을지문덕>의 계책에 놀아난 결과였다.
<우중문>은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러다가 마음이 좀 진정된 후,
자신의 군대가 매우 위험한 처지에 놓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답장을 받아 오라하시던가?”
<우중문>은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며 태연한 척 물었다.
“아닙니다. 다만 선물을 함께 전하라 하셨습니다.”
<을지문덕>이 보낸 사자인 <고우총>은 자신의 하인들을 시켜
막사 안으로 궤짝 하나를 운반하도록 했다.
사람 하나는 족히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였다.
<우중문>을 비롯한 수군장수들은 호기심이 가득한 눈으로 궤짝을 바라보았다.
<우중문>의 명령을 받은 군사 하나가 궤짝을 열었다.
안을 들여다본 군사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다.
군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이를 덜덜 떨고 있었다.
그 안에는 마치 살아 있는 듯 눈을 부릅뜨고 있는 사람의 머리와
반듯이 개어 놓은 붉은 깃발이 있었다.
이것을 본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외쳤다.
“저건 <내호아來護兒>의 부장(副長)인 <장현욱蔣鉉旭>이잖아.”
수군(隨軍)에서도 완력이 강하기로 유명했던 장수였다.
그의 비참한 모습을 본 수군 장수들은 새삼 고구려군의 무서움에 몸을 떨었다.
용기 있는 군사 하나가 궤짝에 있는 깃발을 펼쳐드니
우익위대장군(右翊衛大將軍) <내호아來護兒>의 이름과 직책이 씌여 있었다.
그것은 수(隋)의 수군총관(水軍總管)인 <내호아>의 대장기(大將旗)였던 것이다.
대장기를 빼앗겼다는 것은 완패를 의미했다.
<내호아>의 패배가 대수롭지 않은 수준이라고 여겼던 수군장수들로서는
큰 충격이었다.
이는 고구려군의 전력이 막강함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계속 이대로 버티다가는 궤짝 안에 있는 <장현욱>의 꼴이 될 것이라는
무언(無言)의 경고였다.
이제 식량도 없는 처지에, 그것도 적지에서,
감추었던 실력을 비로소 발휘하겠다는 강적(强敵)과 싸우는 것은
제정신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고구려의 사자인 <고우총>이 떠나자,
우중문은 그 자리에서 전군의 철수를 명령했다.
다른 장수들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는 반대하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
대성산성에 설치된 유막(惟幕) 안에 있던 <을지문덕>은
정탐꾼으로부터 수군이 철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드디어 때가 되었다. 전군은 전투를 준비하라.
지금 당장 성문을 열고 나가 우중문의 본진을 때린다!”
병마원수 <을지문덕> 자신은 정면 공격을 맡고
대모달 <고이중>은 군사를 거느리고 먼저 떠나 적군의 퇴로를 끊고
도망치는 적군을 쳐부순다는 전략을 세웠다.
“자, 숨 돌릴 틈도 주지 말고 들이쳐서 적군을 짓밟아야 한다. 모두 나를 따르라!”
마침내 <을지문덕>은 성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2만 명의 군사를 인솔하여
계곡 밑으로 돌진해 들어갔다.
<우중문>은 <왕인공>의 군사들을 후위에 남겨 고구려군의 추격을 저지하도록 하고,
나머지 군사들은 <형원항荊元恒>의 부대를 필두로 후퇴하도록 했다.
수군으로서는 시간을 끌수록 불리했기 때문에 전속력으로 달아났다.
일기당천(一騎當千)의 정예군인 고구려의 기마병들은
후퇴하는 수군의 후위를 순식간에 뒤쫓아 창과 칼로 찌르고 베어 나갔다.
<왕인공>은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면서
군사들을 규합하려 했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다.
“<우중문>과 <우문술>을 찾아 목을 베어라!”
선두에 선 <을지문덕乙支文德>이 사자(獅子)처럼 울부짖으며 장검(長劍)을 휘둘렀다.
그는 적진을 무인지경(無人之境)처럼 누비면서 닥치는 대로 수병(隨兵)들을 무찔렀다.
<왕인공>은 <을지문덕>을 알아보고
참사검(斬邪劍)을 높이 쳐들며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네놈이 배짱도 좋구나!
내 오늘 반드시 고구려의 병마원수 <을지문덕>을 베어 무공(武功)을 세우리라.”
<을지문덕>은 입가에 엷은 미소를 띄우며 <왕인공>을 조롱했다.
“너 따위는 죽여봤자 공연히 칼만 더럽힐 따름이니 어서 길을 비켜라!
나는 오로지 <우중문>의 수급(首級)을 원한다.”
그러자 <왕인공>은 분함을 참지 못하고 칼날을 세워 덤벼들었다.
<을지문덕>은 피 묻은 장검을 한 손으로 휘두르며 <왕인공>을 밀어붙였다.
10여 합을 싸우고 나자 <왕인공>은 자신의 무예(武藝)가
<을지문덕>에 미치지 못함을 깨닫고 당황하면서 말머리를 돌려 북쪽으로 달아났다.
그런데 앞서 후퇴하던 <우중문>의 본대도
전방에 나타난 고구려군(高句麗軍)에게 기습을 당해 처참하게 짓밟혔다.
<고이중高利重>이 거느린 고구려 군사들은 수군의 퇴로를 막고
<을지문덕>의 추격군과 함께 앞뒤에서 수군의 목을 조이며 협공을 펼쳤다.
고구려의 기마병들은 화살을 날리고 장창을 내지르며
도망치는 수병(隋兵)들을 참살했다.
수군 병사들은 고구려의 기마병들을 피해 산으로 달아났다.
이를 발견한 고구려의 도부수(刀斧手)들이
그들의 뒤를 쫓아가 도끼로 머리를 내리쳤다.
여기저기에서 수병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져 갔다.
고구려군의 집요한 추격에 쫓긴 수군은 어느덧 살수(薩水)에 이르렀다.
<우중문>은 살수 도하(渡河)를 위해 군사들의 대오를 정비했다.
장마가 끝나도 한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인지 강물의 수량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다.
“건너올 때 만들어 두었던 부교(浮橋)가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아무래도 비바람에 떠내려간 듯합니다.”
우문술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이런 낭패가 있나?
당장이라도 고구려군이 추격해올지 모르는 판에
한가하게 부교를 만들고 있을 수도 없잖소?”
<우중문>은 난감한 얼굴로 강물을 쳐다보다가 말을 이었다.
“보아하니 강물이 그리 깊지 않은 것 같소.
얕은 곳을 골라 걸어서 강을 건너도록 합시다.”
“자칫하면 물살에 휩쓸려가기 십상입니다.
비록 적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군사들을 위험으로 몰아넣을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안전하게 부교를 만들어서 건너야 합니다.”
<우중문>은 <우문술>의 고지식한 대답에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우문술>의 말을 듣지 않아서
지금과 같은 난처한 입장에 놓였기 때문에 고집을 부릴 수는 없었다.
<우문술>은 후위의 군사들에게 경계를 철저히 시킨 후에
휘하의 군사들을 이끌고 부교에 쓰일 뗏목을 만드는데 필요한 나무를 구하러 갔다.
그때 <우중문>의 눈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강을 건너는 모습이 보였다.
일곱 명 정도 되는 승려들이었다.
승려들은 망설이지 않고 승복(僧服) 바지를 걷어 올렸다.
그러더니 동네 앞개울을 지나듯이 사뿐히 강을 건넜다.
우중문은 이를 보고 크게 기뻐했다.
언제 고구려군이 나타날지 몰라 조마조마하고 있던 차에
이처럼 쉽게 강을 건널 수 있는 길을 발견했으니 기쁘지 않을 수 없었다.
우중문은 곧 전군에 명해서 승려들이 지나간 쪽으로 강을 건너도록 했다.
먼저 <형원항>과 <왕인공>의 부대가 나아가고, 그 뒤를 <우중문>의 본대가 따랐다.
그 다음에 <장근張瑾>과 <신세웅辛世雄>의 군대가 뒤따랐다.
뒤늦게 소식을 전해 듣고 <우문술>이 달려왔을 때는
이미 수군 병사들이 살수를 절반이나 건너가고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든 <우문술>이 황급히 뛰어가서 말리려고 했지만
닥쳐올 재앙을 막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
갑자기 하늘이 뒤집히고 대지가 갈라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태산을 덮을 만한 물결이 성난 황소처럼 달려들었다.
강물에 몸을 담그고 오로지 구원의 저편만을 바라보며
몸을 재게 놀리던 수군 병사들의 얼굴에 공포와 절망이 교차했다.
경악에 찬 외침이 채 꼬리를 거둘 틈도 없이 잔인한 물살은
그들의 만신창이가 된 몸뚱이와 놀라서 날뛰는 말들,
수레와 짐들을 통째로 삼켜 버렸다.
삶에 대한 집요한 집착조차도 탐욕스런 물살 앞에서는 속수무책(束手無策)이었다.
수군 병사들은 마지막 남은 힘까지 끌어내어 물살을 헤치고 나오려 애썼다.
하지만 냉정한 물살은 그들의 발목을 잡아채어 아래로 끌어내렸다.
발버둥치던 병사 하나가 마지막 숨을 몰아 내쉬며
사라진 자리 위로 새로운 물결이 덮쳐 왔다.
군마들조차도 헤엄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쓸려 내려갔다.
수병들을 잔뜩 삼킨 강물은 어느새 마른 땅까지 범람하고 있었다.
나무 등걸처럼 떠내려가는 군사들 중에 아직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의 절규가
건너편 언덕까지 메아리쳤다.
요행히 물살에 휩쓸리지 않고 강가 언덕으로 기어오른 군사들은
뒤에서 들리는 참혹한 울부짖음이
자신들을 다시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지나 않을까 두려워 떨었다.
그들은 그곳을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기 위해
이미 탈진해서 움직이지 않는 팔다리를 버둥거렸다.
평양성부터 수군을 뒤쫓아온 고구려 군사들은 살수 남안(南岸)에 도착했다.
그들은 수공작전(水攻作戰)에 참혹하게 죽어가는 수군 병사들을 지켜보았다.
강가에는 미처 강을 건너지 못한 수군 병사들이 어쩔 줄을 모른 채 서성이고 있었다.
고구려 군사들은 부채꼴 모양으로 수군을 포위하면서 궁시(弓矢)를 쏘았다.
엉거주츰했던 수병들이 화살을 맞고 쓰러지기 시작했다.
화살을 맞아 고슴도치가 된 수병들의 시체가 산을 이루었다.
화살 공격이 끝나자 고구려 군사들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아직 남아있는 수군 병사들에게 달려갔다.
수병들은 이제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고, 살기 위해 범람하는 강에 뛰어들었지만
악착같이 따라온 고구려군의 화살에 목숨을 잃었다.
푸르던 살수는 수병들이 흘린 피로 붉게 물들어갔다.
요행히 살수를 건너 강의 북안(北岸)에 안착한 <우중문>은
참담한 심정으로 무릎을 꺾고 앉았다.
흠뻑 젖은 갑옷에서 쉴 새 없이 물이 떨어졌다.
그때 좌둔위장군 <신세웅>이 살아남은 휘하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우중문>에게 다가왔다.
그 역시 몰골이 처참했다.
투구는 온데간데없고 바위에 부딪쳤는지 얼굴에 찢어지고 멍든 상처투성이였다.
“대장군, 지금 이곳에 머물러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고구려군이 어디서 습격을 해올지 모릅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하셔야 합니다.”
<우중문>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신세웅>의 부축을 받아 간신히 일어났다.
<신세웅>은 자신이 끌고 온 말에 <우중문>을 태우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북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언덕 위에서 화살이 소나기처럼 내렸다.
미리 강의 북안에 매복하고 있었던 고구려군이 쏘아대는 화살이었다.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고 안도하던 수군 병사들은
마치 가시나무처럼 온몸에 화살이 박힌 채 쓰러져 갔다.
강물이 덮치기 전에 재빨리 강을 건너 목숨을 부지했던 <신세웅>의 군사들도
화살 세례만큼은 피할 수 없었다.
북쪽 강변에 있던 수군에게 기습공격을 감행한 고구려군의 지휘관은
바로 <임유林裕>였다.
<임유>는 <을지문덕>의 명령에 따라 살수 상류에 만들어 놓은 제방을 무너뜨린 후
군사를 거느리고 강의 북안으로 달려왔던 것이다.
“한 놈도 살려 보내지 마라!”
<임유>의 호령이 떨어지자 고구려 군사들은 먹이를 발견한 굶주린 늑대 떼처럼
수군 병사들을 에워싸고 쳐 죽이기 시작했다.
<임유>는 혼전(混戰) 중에 <우중문>의 대장기를 보더니
군사들을 가로질러 <우중문>이 있는 곳으로 달려왔다.
이를 본 <신세웅>이 전체 길이가 일곱 자나 되는 협도(挾刀)를 비껴들고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임유>는 허공을 향해 장창(長槍)을 휘두르고 나서 큰소리로 외쳤다.
“나는 고구려의 장수 <임유>다.
수장(隋將) <우중문于仲文>은 순순히 말에서 내려
내 창끝 아래 목을 드리우도록 해라.”
<신세웅>은 비웃으며 받아쳤다.
“어찌 너 따위 무명소졸(無名小卒)이 무엄하게
우리 상장(上將)을 해(害)하려 한단 말이냐?
내 너를 응징하여 예의가 땅에 떨어진 작금의 현실을 바로잡겠다.”
<임유>는 고소(苦笑)를 금치 못했다.
적장은 죽게 된 마당에도 끝까지 입만 살아 있었다.
이런 한심한 인물이라면 굳이 긴장하고 싸울 필요도 없었다.
<신세웅>이 <우중문>을 돌아보며 외쳤다.
“제가 저 자를 막을 테니 어서 이곳을 빠져나가십시오.”
<우중문>은 초조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애송이가 천지를 분간 못하고 날뛰는구나.
관(棺)을 보아야 곡(哭)을 한단 말이냐? 어리석은 놈!”
<임유>의 장창이 바람을 갈랐다.
그러나 <신세웅>의 협도가 더 빨랐다.
<신세웅>이 <임유>의 공격을 필사적으로 막아내며 저항하는 틈을 타서
<우중문>은 고구려 군사들 사이를 뚫고 전속력으로 도망쳤다.
좌우에서 창과 칼이 날았지만
<우중문>은 조금도 속력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돌파해 나갔다.
그의 뒤로는 아장 두어 명이 따르고 있을 뿐이었다.
<임유>는 도망치는 <우중문>을 뒤쫓고 싶었지만
<신세웅>이 끈질기게 달라붙는 바람에 그를 대적하느라 우중문을 놓쳐 버리고 말았다.
<신세웅>은 필사적으로 <임유>를 가로막으며 그의 머리를 향해 협도를 내리쳤다.
그러나 <임유>는 신속한 동작으로 창대를 세워 <신세웅>의 공격을 받아내면서
전광석화(電光石火)처럼 반격해 나갔다.
<임유>의 마상창술(馬上槍術)은 기(奇)와 묘(妙)에 있어서
최상의 경지에 올라 있었다.
그의 장창은 얇게 찌르는 듯하면 어느새 깊게 찔러 오고,
머리를 내리치는 듯하더니 금방 옆구리를 파고들었다.
<신세웅>은 <임유>가 마상창술에 매우 뛰어난 실력을 갖추었으리라 짐작은 했지만
막상 싸워 보니 아주 무서운 고수(高手)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마상창술은 단순히 창만 잘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 앞서 뛰어난 기마술(騎馬術)이 필요했다.
고구려의 무사는 어릴 때부터 말을 달리는 일에 익숙했다.
경당(敬堂)이나 태학(太學)에서 배우는 무예 수업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도 바로 기마술이었다.
<임유>는 마방감(馬房監)인 아버지로 인해
어릴 때부터 말들과 동고동락(同苦同樂)했다.
그래서 말이 마치 자신의 일부와 같아서
걷는 것보다 말을 타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울 정도였다.
그는 말 위에서 어떤 자세도 가능했다.
말이 달리는 중에 말 배 밑으로 내려가 반대편으로 돌아서 나온다거나,
달리는말에서 뛰어 다른 말로 옮겨 타는 등의 신기(神技)를 보여 주어
사람들로부터 찬탄을 듣기도 했다.
그에게 있어 말은 벗이자, 동반자이고 신체의 일부였다.
<신세웅>이 그런 <임유>의 능력을 알 턱이 없었다.
그는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죽음을 각오한 저돌적인 공격으로 일관했다.
<신세웅>은 협도를 옆으로 비스듬히 세워 양손으로 꼬나 잡은 후
<임유>의 오른편을 파고들었다.
<임유>는 순간 창걸이에 창을 걸고 몸을 수그려
말의 왼쪽 옆구리에 붙어서 이를 피한 후에 다시 몸을 일으켰다.
어느새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환도(環刀)가 들려 있었다.
<신세웅>이 피할 사이도 없이 <임유>의 칼날은 정확하게 <신세웅>의 목을 베었다.
<신세웅>은 아직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다.
그저 섬뜩한 기운이 목을 스치고 지나갔다고 느꼈을 뿐이었다.
잠시 후 목 언저리에 그어진 선을 따라 피가 스며나더니
울대뼈부터 피가 솟구쳐 올라 주변으로 퍼져 갔다.
마치 피기둥의 행렬처럼 보였다.
<신세웅>은 피를 보고서야 공포에 휩싸였다.
차츰 그의 몸이 옆으로 쏠리더니 달리는 말에서 떨어져 바닥에 내팽개쳐졌다.
거구가 떨어지자, 대지에 흙먼지가 무성하게 피어올랐다.
<임유>는 대지에 안겨 몸을 끄덕이고 있는 적장을 돌아보았다.
그의 몸은 이제 날짐승과 들짐승들의 성찬으로 변할 터였다.
먼 타국에 있는 짐승들에게까지 육신을 보시(布施)하는 것은
장수(將帥)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었다.
<임유>는 비애감인지 회한(悔恨)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을 떨쳐 버리기 위해
또 다른 먹이를 찾아 달렸다.
전장이 한눈에 들어왔다.
수병들의 시체가 강북의 벌판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살수에서 간신히 죽을 고비를 넘긴 <우중문>은 수풀이 우거진 백마산 기슭에 이르러
패잔병을 수습한 <우문술>과 <형원항>을 만나 가까스로 탁 트인 강가에 도착했다.
<우문술>의 부장인 <조효재曺孝材>가 대릉하 근방을 샅샅이 수색한 끝에
어디서 빼앗았는지 거룻배 세 척을 구해 강안으로 끌고 왔다.
장수고 군졸이고 가릴 여유가 없이 천방지축(天方地軸) 앞을 다투어 배 위에 올랐다.
하지만 강을 건넌 후에도 요동으로의 귀환 길 역시 그리 평탄하지 않았다.
이미 식량이 바닥난 수군은 풀뿌리를 캐어 먹거나
나무 열매를 따먹으며 연명을 해야 했다.
게다가 이제는 고구려의 성들을 피해야 하는 처지였기 때문에
올 때보다 더욱 어려운 여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
시도 때도 없이 출몰하는 고구려 군사들은
굶주림과 무리한 강행군에 지친 수국 군사들을 집요하게 괴롭혔다.
수군 병사들은 목숨을 건지고자 장수들의 눈을 피해 진영을 이탈해 나갔다.
처음에는 하나둘씩 사라지더니 행군이 계속될수록 그 인원이 늘어났다.
나중에는 장수들을 포함해서 부대원들이 모두 이탈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우중문의 군대가 궁장령을 넘어 요동의 육합궁에 당도했을 때는
남아있는 인원이 겨우 2천 7백여 명에 불과했다.
30만이 넘는 수군 병사들이 죽거나 포로가 된 것이었다.
전쟁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대참패였다.
양제는 패배하고 돌아온 장수들을 용서하지 않았다.
분기가 탱천한 양제는 <을지문덕>을 놓아준 <유사룡>을 당장 처형하였고
<우중문>과 <우문술> 두 장수의 목에 칼을 씌우고
쇠사슬로 온몸을 꽁꽁 묶어서 감옥에 처넣었다.
도읍인 장안으로 돌아간 다음 그 죄를 물을 작정이었다.
1812년 6월 나폴레옹1세가 이끄는 프랑스 군대가 러시아를 침략했을 때
러시아군의 총사령관인 쿠투조프는 프랑스군을 러시아 내륙 깊숙이 끌어들여
보급선을 차단하고 말로야슬로베츠 전투에서 결정적인 타격을 가해 승리를 거두었다.
고구려의 <을지문덕> 역시 <우중문>이 이끄는 수의 대군을 평양성 근처까지 유인하여
살수에서 대승을 거두었던 것이다.
<을지문덕>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의 주도권을 쥐고
자신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적군을 끌어들여 전과를 올린 매우 뛰어난 전략가였다.
순암(順庵) 안정복(安鼎福)의『동사강목(東史綱目)』은
<을지문덕乙支文德>의 살수대첩(薩水大捷)에 대해 이렇게 칭송했다.
‘예로부터 전쟁의 승패는 군병력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
수나라는 천하를 통일하여 그 강성한 군사력과 부강한 국력이
고금을 통하여 제일이었으나,
<을지문덕>장군이 기회를 틈타 전력을 다해 적을 공격하기를
마치 마른 나뭇가지를 분지르고 썩은 나무 등걸을 뽑아 제치듯 하여
그들을 천하의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외적들이 후세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를 함부로 침범하지 못한 것은
을지문덕 장군이 남긴 공적 때문이 아니겠는가?’
또 단재(丹齋) 신채호(申采浩)의『을지문덕전(乙支文德傳)』은
그의 탁월한 용병술(用兵術)과 위대한 전공(戰功)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무릇 동서고금(東西古今)에 각국의 사기(史記)와 항간의 이야기들은
그 수가 극히 많아서 그것을 기록해 놓은 책들을 운반하는 소가 땀을 흘리고,
그 책들을 한곳에 쌓아놓으면 천장에 닿을 정도이지만,
그 속에 나오는 수많은 전쟁에 관한 기록과 이야기들 중에서
적은 수의 군사로써 많은 군사들을 격퇴하기를 <을지문덕>처럼 한 자가 있던가?
약한 군사로써 강한군사를 대적하기를 <을지문덕>처럼 한 자가 있던가?
일국의 대신으로서 일백만 명 군사의 적진에 출입하여
정탐하기를 <을지문덕>처럼 한 자 있던가?
약한 군사로써 외롭게 떨어져 있는 성을 지키면서 사면에서 쳐들어오는 강한 적들을 막아 홀로 우뚝 서서 능히 굴복하지 않기를 <을지문덕>처럼 한 자가 있던가?
여러 번이나 강한 적들을 그림자 하나도 돌아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어린 아이는 그 이름을 듣고 울음을 그치고,
초목(草木)들조차 그 이름을 알고 있기를 <을지문덕>처럼 한자가 있던가?
안으로는 정치와 교화(敎化)에 힘쓰고 밖으로는 적국의 침략을 막음으로써,
하나의 몸으로 장수(將帥)와 재상(宰相)의 직책을 겸임하였으되
그 행동이 편안하고 한가하여 음성과 안색에 변함없기를
<을지문덕>처럼 한 자가 있던가?
땅도 좁고 인구도 적은 나라로서 여러 차례 전쟁을 하면서도
백성들의 마음이 감복하여 원망하고 배반하는 자 하나 나오지 않고,
모두들 자기 한 몸의 뼈와 살과 피를 우리 상공(相公)께서
계획하시는 일에 바치겠다고 하게 만들기를 <을지문덕>처럼 한 자가 있던가?
그 후세 사람들이 만약 그의 머리털 하나만큼만 닮더라도
그 나라의 독립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며,
그의 한두 마디의 말만 잘 거두어 간직하더라도
그 나라의 역사를 채워 넣을 수 있을 것이니,
<을지문덕>이란 사람은 우리 대동국(大東國) 4천년 역사에서
유일한 위인(偉人)일 뿐만 아니라 또한 전 세계 각국에도 그 짝이 드물도다.’
『세종실록(世宗實錄)』「지리지(地理志)」에는
조선왕조(朝鮮王朝)의 개국공신(開國功臣)인 우재(吁齋) <조준趙浚>이
명사(明使) <축맹祝盟>을 데리고 안주(安州)에 있는 백상루(白相樓)에 올라가
청천강(淸川江)을 굽어보며 이런 시(詩)를 읊었다는 기록이 있다.
薩水湯湯庭碧虛 살수의 강물 출렁출렁 푸른 하늘 잠겼는데
隋兵百萬化爲魚 아직도 나무꾼과 어부들 사이에는 전해오는 말이 있다오.
至今留得漁樵語 일백 만의 수나라 군사들 물고기 밥 되어
不滿征夫一等餘 우리에게는 비웃음거리밖에 안 되네
22. 고구려와의 전쟁 때문에 멸망한 隋
수국(隋國)의 수군총관(水軍總管)인 <내호아來護兒>가 패수구(浿水口)로 진입하여
평양성(平壤城)을 함락시키려 하다가 태제(太弟) <고건무高建武>에게 완패를 당하고,
30만 대군의 별동대(別動隊)를 이끈 우익위대장군(右翊衛大將軍) <우중문于仲文>
마저 <을지문덕乙支文德>의 유인전술(誘引戰術)에 말려들어
살수대첩(薩水大捷)의 제물이 된 이후
요동성(遼東城)을 공략하던 양제(煬帝)의 어영군(御營軍)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요동성에서 넉 달이 지나도록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양제의 어영군 오십만 병력이
살수대첩 이후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정사(正史)의 기록에는 자세히 전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살수대첩(薩水大捷)이 제2차 여수전쟁(麗隨戰爭)을 개전(開戰) 8개월 만에
종결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양제는 분명 살수대첩의 소식을 들었겠지만
그리 쉽게 군대를 철수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양제는 평양성 함락에 실패하게 되자
전쟁의 목적을 고구려 정복에서 요동 지역을 석권하는 것으로 수정했을 것이다.
그러나 단재(丹齋) 신채호(申采浩)의『조선상고사(朝鮮上古史)』에 의하면
<을지문덕>의 군대가 <우중문>의 별동대를 패주시키고 나서 대릉하를 건너
서쪽으로 진격하여 오열홀(烏列忽) 일대에서
수(隋)의 잔여군(殘餘軍)을 소탕했다고 전한다.
여기서 말하는 오열홀이란 지명(地名)은 요동성의 또 다른 이름이거나
요동성 인근의 지역을 지칭하는 단어일 것으로 추정된다.
단재는 이 오열홀전투(烏列忽戰鬪)에 대해
“수국의 24개 군단 수백만 명이 전멸당하고
오직 호분랑장(虎賁郞將) <위문승衛文昇>이
고작 패잔병 수천 명을 수습하고 양제를 호위하여 도주하였다”
고『조선상고사』에 서술하였다.
또 “『수서(隨書)』에 살수(薩水)에서의
<우중문于仲文>과 <우문술宇文述>의 패전(敗戰)은 기록해 놓고
오열홀(烏列忽)에서의 양제(煬帝)의 패전은 기록해 놓지 않은 것은
이른바 위존자휘(爲尊者諱)의 춘추필법(春秋筆法)에 따른 것이니
춘추필법을 알아야 중국의 역사를 올바로 읽을 수 있다”
고 덧붙이기도 했다.
단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오열홀전투는 살수대첩보다 더 대단한 고구려의 승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도대체 <을지문덕>이 뛰어난 통솔력과 신통한 지략으로 승전(勝戰)하여
전장의 고혼(孤魂)이 되게 한 수나라 군사들의 목숨은 과연 몇 명이었더란 말인가?
더욱 놀라운 것은 당시 고구려군(高句麗軍)이
수군(隋軍)을 요동지방에서 몰아낸 것에만 그치지 않고
수나라의 내지(內地)를 향한 진공(進攻)작전을 벌였다는 점이다.
『태백일사(太白逸史)』「고구려본기(高句麗本紀)」에 따르면
<을지문덕>은 고구려군을 두 개의 전투 대대로 크게 구분하여 재편하였는데,
한 개 부대는 현도도(玄菟道)를 타고 태원(太原)까지 진격하게 하면서
다른 한 개 부대는 낙랑도(樂浪道)를 타고 유주(幽州)까지 진격하게 했다는 것이다.
태백일사에 보이는 고구려군의 원정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무엇보다 태백일사의 기록 내용이 사실이란 전제하에 풀이해 보면
당시 고구려군은 우선 수나라의 정치·군사적 중심지를 완전히 파탄시킨 셈이다.
더욱이 유주지역을 들이쳤다면 수국의 동북쪽 전진거점을 붕괴시킨 것이다.
당시의 유주지역은 고구려는 물론 돌궐족의 동방한계선의 분쟁지역이었다.
한편 고구려의 태원지역 원정의 의미는
적진 깊숙이 자리한 후방지휘소를 타격한 것으로 이해된다.
결국 고구려의 유주와 태원을 향한 원정은 수나라의 동방 한계거점과
후방 지휘거점에 대한 파괴에 초점이 있던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다.
<을지문덕>은 아울러 수나라 동북변 지역으로의 분산된 진공작전을 직접 추진했는데,
계획된 지역에 이르러서는 수나라의 각 주군(州郡) 지역민들을 불러서 위로까지 했다.
실로 <을지문덕>의 풍모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단재는『을지문덕전(乙支文德傳)』을 통해 그의 사람됨을 이렇게 서술하였다.
‘…무릇 전쟁에 임하여 적을 상대함에 있어서
군사를 지휘하기를 마치 정해진 길 가듯이 하고,
편안하고 한가롭게 놀러가는 듯한 마음으로 적진에 들어가서 노련하고
사나운 적장들을 마치 손 안의 장난감 다루듯이 하였으니
침착하고 용맹스러우며 임기응변(臨機應變)과 지략(智略)이 있었다고 말한 것은
이로 말미암아 붙여진 이름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을지문덕>을 보건대,
<을지문덕>에게 침착함과 용맹함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침착하고 용맹한 것만으로 <을지문덕>이 <을지문덕>으로 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을지문덕>에게 임기응변과 지략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임기응변과 지략만으로 <을지문덕>이 <을지문덕>으로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을지문덕>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르기를, 공(公)은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강하고 굳센 사람이었으며,
홀로 우뚝 선 사람이었고, 위험한 것을 무릅쓰고 피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진실하고 성실하였기 때문에 임금과 신하 사이에 뜻이 맞아
십여년간 마음이 서로 마치 물과 고기처럼 서로 잘 맞아서 이간질하는 말이 없었고,
장수와 재상이 서로 한마음이 되어서
내정을 닦고 외적을 물리치는 일을 부지런히 하고
서로 권면(勸勉)한 결과 그 군사는 강국의 군사가 되었고,
그 백성은 강국의 백성이 되어서
동쪽과 서쪽의 여러 나라들을 노려볼 수 있었던 것이다.
강하고 굳세었기 때문에 수나라가 중원 천하를 통일한 여세를 몰아
마치 손을 대면 데일 듯한 기염(氣焰)으로
노도(怒濤)와 광란(狂瀾) 같이 무섭게 쏟아져 들어오고,
군함(軍艦)들은 바다 위에 개미떼 같이 모여 있고,
철기(鐵騎)는 요동 벌판에 구름같이 진을 치고 있으면서
사신(使臣)을 보내어 위협하고 공갈치기를 여러 번 하였으나,
여전히 굽히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는 강하고 굳센 정신으로
조용하고 안온한 얼굴로써 응대하였던 것이다.
그 당시 수나라의 형세와 기세에 두려워서 굴복하지 않는 나라가 없었고,
가깝게는 신라와 백제가 그 앞에서 꼬리를 흔들고 아양을 떠는 모습을 보였고,
멀게는 돌궐(突厥)과 거란(渠丹)도
그 앞에서 무릎을 꿇는 수치를 무릅쓰는 상황이었으나,
불쌍하고 가련한 여러 나라들 중에서는
이를 부끄럽게 여기는 장부(丈夫) 하나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홀로 우뚝 서 있었기 때문에,
공(公)은 홀로 참담한 수완을 발휘하여 적이 강해도 그를 밀쳐내고,
적이 약해도 그를 밀쳐내며 둘이 같이 설 수 없음을 맹세하고,
자웅(雌雄)을 겨뤄보려고 유인하였던 것이다.
위험한 것을 무릅쓰고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탄하고 험한 것도 돌아보지 않고,
죽고 사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 차례 혼자 말 타고 호랑이 굴속으로 들어가서
호랑이 새끼를 얻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의 한쪽면만 살펴보고 이르기를 침착하고, 용맹스럽고,
임기응변이 있고, 지략이 있는 자였다고 한다면 그게 어찌 옳겠는가?
공 같은 자야말로 진정 우리 선조들 중에서 제일 모범적 인물이고,
제일 모범으로 삼을만한 사람이로다.’
수군이 완전히 물러가자,
을지문덕은 평양성으로 돌아와 영양태왕(嬰陽太王)을 배알하였다.
태왕은 을지문덕에게 친히 어주(御酒)를 따라주며 그의 공로를 치하했다.
“그대가 결국 이 나라를 구했구나.”
“소신이 무슨 공(功)이 있겠사옵니까?
이는 폐하의 성덕과 태제 전하를 비롯한 군민들이 합심하여 이룬 개가이옵니다.”
<을지문덕>은 겸손하게 주변사람들에게 공로를 돌렸다.
“막리지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번 전쟁에서 이기기 어려웠을 것이오.”
<고건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늘 <을지문덕>을 시기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던 <고건무>조차도
그의 뛰어난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과찬이십니다. 태제전하께서 평양성을 지켜내지 못하셨다면
오늘날의 승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을지문덕>은 <고건무>를 추켜세웠다.
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일이 조정의 화합과 백성들의 안정을 위하는 길이었다.
<을지문덕>은 <고건무>가 야심이 큰 인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허나 이번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안심할 수는 없사옵니다.
수주는 호승심이 강한 자이옵니다.
이대로 곱게 물러날 리가 없사옵니다. 반드시 다시 쳐들어올 것이옵니다.”
<을지문덕>의 단언을 듣고 영양태왕이 웃으며 물었다.
“그렇다면 어찌 대비해야겠는가?”
“먼저 국경의 방비를 강화하고
성들 사이의 협력 체계를 더욱 원활하게 조직해야 합니다.
소신이 요동으로 나가서 변경의 체제를 다시 정비하겠습니다.”
<을지문덕>은 전쟁이 끝나자마자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길을 떠나려 했다.
그는 승전의 대가로 상급을 바라지도 않았고 안락한 휴식을 원하지도 않았다.
그가 원하는 바는 고구려가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평화로운 나라가 되는데 일조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요동 길을 자원하면서도 희망에 찬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영양태왕은 이러한 <을지문덕>이 믿음직스러웠다.
“짐은 막리지가 항상 옆에 있어 주기를 바라지만
그대의 뜻이 나와 틀린 적이 없음을 알기에 보내겠다.”
<을지문덕>은 태왕에게서 점점 멀어지더니
어느새 대전문을 빠져나가 모습을 감추었다.
햇볕이 대전 앞마당을 밝게 비추었다.
서력 613년 정월에 수황(隋皇) 양제(煬帝) 양광(楊廣)은 조서(詔書)를 내려
전국의 군사들을 탁군으로 소집하고
요서의 옛 성을 수리하여 군량을 저장하게 하였다.
양제는 신하들을 불러놓고 말했다.
“고구려를 이기지 않고는 천하 제일이라 말할 수 없다.
아직도 우리의 국력은 바닷물을 뽑아내고 산을 옮길 수 있으니
고구려와 전쟁을 벌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젊은 신하 <곽영郭榮>이 간곡하게 아뢰었다.
“오랑캐가 예의를 잃는 것은 신하의 일입니다.
귀중한 쇠뇌를 새양 쥐를 잡으려고 쓰지는 않습니다.
어찌 천자(天子)의 몸으로 욕되게 작은 도둑을 대적하십니까?”
이 말을 귀담아 들을 양제가 아니었다.
회의는 하나의 통과 의례였다.
모든 일은 양제의 뜻에 따라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양제는 3월에 50만의 군사를 모아 요동으로의 원정길에 나섰다.
양제의 첫 번 째 고구려 침략 때와 비교하면 수국의 병력이 많이 줄어 있었던 것이다.
양제는 요동 일대에 있는 고구려의 성들을 먼저 함락시키고 나서
전진한다는 전술을 쓰기로 했다.
양제가 이끄는 수군(隋軍)의 주력부대가 요동성 앞에 나타난 것은 4월초였다.
요동성은 또 다시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었다.
수국의 재침을 예상하고 있던 요동성주(遼東城主) <고연탁高連卓>은
부하 장수들과 함께 병력을 정돈하여 신속하게 방어태세에 들어갔다.
이미 제2차 여수전쟁(麗隨戰爭)에서 파괴된 성벽의 수리도 끝났고,
군량이나 군수장비 등도 충분히 비축해 놓은 요동성은
더욱 강력해진 방어력을 자랑했다.
수군은 비루(飛樓)·당거(撞車)·운제(雲梯) 등을 이용해
사면에서 동시에 요동성을 공격하였다.
하지만 <고연탁> 휘하 요동성의 고구려 군사들은
아무리 많은 대군이 모질게 공격해 와도
수성전(守城戰)을 성공적으로 벌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쳤다.
오랫동안 요동성을 공격했지만 효과를 얻지 못하자 양제는 군사들을 동원해
백만 개의 흙 포대를 만들어 성과 높이가 동일한 거대한 토산을 쌓았다.
수군은 그 위에 어량대도(魚粱大道)라 불리는 넓이가 30보나 되는 큰 길을 만들어
성 안으로 포노(砲弩)를 쏘아댔다.
또 팔륜루거(八輪樓車)를 만들어서 성루의 고구려 군사들을 공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요동성의 고구려군도 더 적극적으로 항전하였다.
이렇게 20여 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싸워 양군의 희생자가 속출하였다.
양제(煬帝)의 어영군(御營軍)이 요동성을 공략하는 동안
우후위장군(右侯衛將軍) <왕인공王仁恭>은
7만의 보기군(步騎軍)을 거느리고 신성(新城)을 에워쌌다.
그러나 이미 신성에는 막리지(莫離支) 겸 병마원수(兵馬元帥) <을지문덕乙支文德>이
<고이중高利重>·<재증협무再曾協武>·<임유林裕> 등 부하 장수들을 데리고
3만의 정예군을 인솔하여 입성(入城), 수성전(守城戰)을 준비하고 있었다.
<을지문덕>이 직접 신성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수군 병사들의 사기는 극도로 저하되었다.
<을지문덕>은 <왕인공>이 군사를 몰아 성을 공격하면 노련하게 이를 막아내다가
적군이 지쳐 잠시 물러가 쉬면 기병대를 보내
뛰어난 기동력으로 급습하고 빠지는 유격전(遊擊戰)을 전개했으며,
적군이 성문 가까이에 오면 쇠뇌와 포차를 발사하여 저지하도록 했다.
이렇게 해서 수군의 신성 공략도 요동성에서 처럼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한 채 피해만 늘어갔다.
그런데 양제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급보가 전해졌다.
예부상서(禮部尙書) <양현감楊玄感>이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이에 <양현감>의 친구였던 병부시랑(兵部侍郞) <곡사정斛斯政>은
자신에게 화가 미칠까 두려워 고구려로 귀순해왔다.
신성에서 <왕인공>과 전투를 벌이고 있던 <을지문덕>은
수(隋)의 국내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접하자
곧 고구려군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것이며
선발대를 임유관(臨渝關)으로 보내 수군의 퇴로를 차단할 것이라는
소문을 일부러 수군 진영에 흘려보냈다.
이 첩보를 받은 양제는 크게 겁을 먹고 서둘러 퇴각을 지시했다.
수군은 진영과 보루, 장막, 공성용 무기 등
수많은 물자들을 놓아둔 채 밤을 틈타 황급히 도주했다.
“원수님은 어째서 아군이 반격한다는 사실을 적군에게 알렸습니까?”
부관인 <고이중>이 묻자 <을지문덕>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싸움에서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라 했다.
이는 그만큼 군사들의 생명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저들은 내란으로 인해 마음이 불안한 상태이기에
우리가 대군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접하면 겁이 나서 도망갈 수밖에 없다.
전쟁은 사기의 싸움이다.
전의를 상실하고 황급히 물러나는 적을 추격하는 일처럼 쉬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제 우리는 도망치는 적을 쫓아가서 무찌르면 된다.”
장수들은 을지문덕의 심계에 혀룰 내둘렀다.
을지문덕은 요동성으로 전령을 보내
퇴각하는 수군을 추격하여 섬멸하라는 명령을 전했다.
이에 요동성주 <고연탁>은 성문을 열고 군사를 풀어
도망치는 수군을 들이쳐 십여만에 이르는 적병을 죽이거나 포로로 잡았다.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거듭 참혹한 패배를 당했으면서도
양제는 <양현감>의 반란을 진압하자,
다시금 백성들을 동원하여 고구려 정벌을 준비했다.
양제는 오직 복수심에 가득차서 나라의 형편은 돌보지도 않았다.
해가 바뀌자,
양제는 고구려 침략에 참전할 군사들을 회원진(懷遠鎭)에 집결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때에는 민란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
수국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 있어 군사들이 제때에 도착할 수가 없었다.
회원진에 모여든 군사는 그전에 비하여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그렇지만 <내호아來護兒>의 함대가 평양성을 향해 항진하는 척 하다가
느닷없이 비사성(卑蓑城)을 습격하여 함락시키자 고구려 측은 크게 당황하였다.
여수전쟁 최초로 수나라가 고구려의 성 하나를 무너뜨린 것이었다.
사실 고구려도 끈질긴 양제의 침략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더 이상버텨내기가 버거웠다.
일단 끝없는 소모전(消耗戰)을 중단하고 남쪽의 대비도 세워야 했다.
영양태왕은 사신을 보내 곧 수나라로 입조(入朝)할 것이니
철군시켜 달라는 청을 하면서 <곡사정>을 묶어 보냈다.
양제는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중원제국의 황제로서 자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다는 생각에 괴로워하고 있었지만,
<곡사정>이 소환되자 일단 자신의 체면이 세워졌다는 위안을 받고
이 거짓 항복을 순순히 받아들였다.
그는 자신이 거느린 수군은 물론
비사성을 함락시킨 <내호아>의 군대에게도 철군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두 나라 사이에 강화(講和)가 맺어졌다.
<내호아>는 이 조칙을 받고 거의 손안에 들어오게 된 승리를 놓쳤다고 통분해 했다.
<곡사정>은 양제가 회원진에서 군사를 돌려 장안으로 돌아온 뒤
끓는 가마솥 안에 넣어져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다.
20여년에 걸친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수나라는
그 후유증으로 인해 결국 쇠락의 길에 들어섰다.
양제는 마침내 자신의 신하인 <우문화급宇文化及>에게 살해되었고,
반란군의 수괴 <이연李淵>이 장안을 점령하고
당(唐)을 건국함으로써 수(隋)의 짦은 역사는 막을 내리고 말았다.
수나라가 중원을 통일한 지 38년 만에 멸망하게 된 것은
그 직접적인 원인이 고구려와의 전쟁에 있었다.
양제는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요동벌판에 쏟아 부었지만
실익은 하나도 챙기지 못했다.
수나라와의 전쟁은 고구려인들에게 반외세(反外勢) 저항의식을 심어주었고
뒷날 민족사의 주체의식과 자주의식을 고양시켜 주었다.
특히 을지문덕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주역으로서 민족사의 귀감이 되었다.
그러나 고구려와 수나라 사이의 전쟁이 완전히 끝난 후에
<을지문덕>에 대한 역사의 기록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을지문덕>이 전쟁 이후 어떻게 됐는지,
언제 사망하여 어디에 묻혔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민족사 최고의 영웅인 그의 묘소(墓所)는 현존(現存)하지 않게 되었다.
23. 한국인으로서 한국 역사의 위대한 영웅을 알지 못한다면?
수(隋) 양제(煬帝)의 침략을 막아내고 여수전쟁(麗隋戰爭)을
고구려(高句麗)의 승리로 이끈 고구려 말기의 전설적인 영웅 을지문덕(乙支文德).
한국 근대(近代) 민족주의사학(民族主義史學)의 시조(始祖)인
단재(丹齋) 신채호(申采浩) 선생이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인물로
고구려의 훌륭한 군사전략가 을지문덕을 부각시킨 것은
일제(日帝)의 침략으로 국운(國運)이 기울던 시기에
우리 민중에게 영웅을 숭배하는 마음을 고취시켜
민족자주정신(民族自主精神)을 되살림으로써
한국의 민족해방운동(民族解訪運動)을 활성화하겠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가 종결된 지 69년째가 되었으나,
국내에서도 국외에서도 여전히 과거사(過去史) 청산(淸算)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아주 오래 전부터 자국의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하기 위한 역사 교육을 강화하면서
일제의 한국 침략을 미화하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심각하게 폄하하는 내용으로
왜곡하여 서술된 엉터리 역사 교과서를 편찬하고
이것을 전국의 각급 학교에 사용하도록 허락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여기에 덧붙여 중국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정식으로 고조선·부여·옥저·고구려·발해 등의 역사를 한국의 고대사에서 분리시켜
중국사에 편입시키려 하는 동북공정(東北工程) 프로젝트를 시작하였고,
지난 2007년에 이미 그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이런 주변국가의 역사인식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자국의 역사 교육에 관심을 두기보다
오히려 고사(枯死)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다.
한국의 초등학교에서는 국사(國史) 수업이 아예 없다.
중학교에서도 국사 과목이 없어진 지 이미 오래다.
고등학교에서는 국사가 선택과목으로 밀려나면서
학생들이 국사를 배우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까지 번졌다.
결국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국사 과목 교과서를 단 한 줄도 읽지 않고도
대학 진학이 가능해졌고, 행정·사법·외무고시에도 국사 과목이 없으니
국사를 모르는 사람들로 공직이 채워질 위기에 놓였다.
세계에서 자국의 역사를 교육하지 않는 나라가 있는가?
불행하게도 대한민국만이 제 나라의 역사를 교육하지 않는 나라로 전락했다.
이에 대한 교육부 관계자의 해명은
“수능시험에 시달리는 고교생들에게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한 과목이라도 더 줄여줘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정말 참담한 망언(妄言)이다.
심지어
“국사 교육을 하게 되면 국수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길러주게 돼 세계화에 역행 한다”
고 주장하는 고위급 공직자도 있다.
더욱 기가 막힐 망언이다.
아무리 형편없는 나라라고 해도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청소년 교육을 맡겨도 좋을지 심각하게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다.
세계은행의 예측에 따르면 2020년 정도면
중국 경제가 미국을 추월할 정도로 성장할 것이라고 한다.
그때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국가인 한국은
세계 최강국인 중국과 UN 상임이사회 진출을 노리고 있는 일본 사이에 낀
샌드위치가 될 것이라는 불길한 예언도 이미 나와 있다.
그 2020년 무렵에 한국의 정치·경제·과학을 이끌어 갈 핵심적인 인재들은
과연 어디에서 배출될까?
바로 초등학교 상급반의 유소년 학생들이다.
그 유소년들에게 국사를 가르치지 않고 민족의 정체성에 대해 깨닫지 않게 하고서도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도가 많다고 생각한다면
이만저만한 착각이 아니다.
정부가 지금 당장 서둘러야 할 일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정신적 근대화 작업에 나서는 일이다.
오직 그 하나로 피폐할 대로 피폐해진 이 정신적 공황에서 헤어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전통적인 부분을 내다버리는 것을 자랑으로 삼았을 뿐,
우리 민족의 본 바탕에 흐르는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논증하는 일에 너무도 소흘했다.
이른바 세계화라는 외형에만 요란을 떨었지
국가의 웅비(雄飛)에 준비하는 프로젝트를 운영할 궁리도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프랑스 민주공화국 제21대 대통령 프랑수와 미테랑은
“자국의 역사를 배우지 않는 국민은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한 국민이다”고 말했으며
백암(白巖) 박은식(朴殷植) 선생은
“나라는 멸망할 수 있으나 역사는 소멸될 수 없다”고 말했다.
7세기 초 강국인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고구려는 당당히 승리를 거두었고,
그 중심에는 영웅 을지문덕이 있었다.
우리가 정말 고구려인들의 후손이 맞다면
그의 위대한 전공(戰功)과 웅혼(雄渾)한 기상(氣像)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고대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540. 眞智대제 金輪의 폐위와 眞平대제 白淨의 등극 (0) | 2014.11.16 |
|---|---|
| 539. 박창화 필사본 화랑세기는 가짜인가? (0) | 2014.11.16 |
| 537. 隋書 본기로 보는 고구려의 위상 (0) | 2014.11.15 |
| 536. 명농(明穠)의 죽음과 여창(餘昌)의 등극 (0) | 2014.11.13 |
| 534. 고구려와 北齊의 관계 (0) | 2014.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