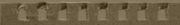고조선과 북부여, 고구려의 강역을 살피기 전에
중국의 하북성과 산서성을 가로지르는 태항산맥과 황하개도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 태항산(太行山)
태항 산맥(太行山, Taihang Mountains)은
중국 수도 북경 남쪽의 산서성과 하북성의 경계를 이루는 산맥으로
5행산(五行山), 왕모산(王母山), 여와산(女蝸山), 태항산(太行山)이라고도 불린다.
산은 동북에서 서남방향으로 뻗어서 하북, 산서, 하남 3개의 성에 걸쳐 있다.
북으로 북경 서쪽에서 일어나 남으로는 황하 북쪽 절벽에 달하고
동으로 하북평원에서 400km를 뻗어나가
하북과 하남 두 성이 자연적으로 경계를 이루며,
북쪽은 높고 웅장하면서 남쪽은 낮고 수려하며,
동쪽은 가파르고 서쪽은 완만한 형세를 이룬다.
태항산맥은 동쪽의 화북평야와 서쪽의 산서고원(황토고원의 동쪽끝)사이에 위치하며
평균해발이 1,500m에서 2,000m정도에 달하고
동서의 길이가 250km, 남북의 길이가 600km이다.
2,000m이상의 산만해도 북쪽의 끝에는
하북성의 장가구(張家口)시에 소오대산(小五台山)이 있고
높이가 2,882m로 가장 높다.
이밖에 영산(靈山)、동영산(東靈山)이 있고,
산서성의 태백산(太白山), 남색산(南索山), 양곡산(陽曲山), 백석산(白石山) 등이 있다.
남쪽 끝은 고봉으로 능천의 불자산(佛子山)、판산(板山)이 있는데
1,745m, 1,791m이다.
동쪽에 있는 해발 1,000m정도의 창암산(蒼巖山)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기봉으로서
역사가 오래되어 이름난 누각 등이 많은 풍경구이다.
태항산의 항(行)자는 ‘걷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행’으로 읽고
‘줄’이나 ‘항렬’의 뜻일 때는 ‘항’으로 읽기 때문에
태항산 경우에는 ‘커다란 산이 줄지어 있다’는 의미로 항이라고 읽는다.
그리고 산서성(山西省), 산동성(山東省)이라는 지명은
태항산맥의 서쪽과 동쪽에 있다는 의미에서 생겨날 정도로 험준하여
지리분계선의 역할을 하였고 군사적으로 천험의 요충지가 되어 왔다.
더구나 이 산의 동쪽에 사는 사람을 동이족(東夷族)이라고 하여
동이족인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산이기도 하다.
태항 산맥 북쪽은 북경으로 흐르는 거마하(拒馬河)에 의해서
북경 북부를 둘러싸고 있는
군도산(軍都山, 군도산맥은 좀 더 동쪽 요서로 뻗은 연산산맥의 일부)과 멀어지며,
남단은 하남성의 심하평원(沁河平原)에서 끝난다.
서쪽으로 산서고원에 연접하고
동쪽의 날개는 중간정도의 산이나 낮은 산, 구릉을 지나 평원에 이른다.
산의 척추가 되는 동쪽은 하북평원에서 나와 일어나고 화북평야로부터 우뚝 솟아
낙차가 커 1,000m이상 절벽을 만들기도 해 산의 기세가 웅장하다.
산맥의 서쪽은 산서성의 고원지대로 완만하게 연결되고 산언덕은 완만하고 평평하다.
태항산지구에서 많은 강이 발원하거나 지나며
이어진 산맥 중 끊어진 곳이 수구를 형성하여
화북평원이 산서고원으로 들어오는데 이 산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8개의 길을 통하여 서로 왕래하였다.
- 태항 팔형(八陉)
산의 중간은 많은 강이 흘러 끊어지기도 하며 산세가 가팔라 골짜기도 깊은데
천연길이 중요한 출입구인 관구(關口)가 된다.
산중에는 수없이 많은 웅장한 요새 중 유명한 것으로 하북의 자형관(紫荊關),
산서의 낭자관(娘子關), 홍제관(虹梯關), 호관(壺關). 천정관(天井關) 등이 있다.
산서고원의 물 흐름은 태항을 경유하여 화북평원으로 유입하는데
물길은 굽이돌아 깊고 맑은데 협곡은 연접하여 폭포가 급하게 흐른다.
태항산 가운데에는 동서로 가로 지른 골짜기 횡곡(橫谷)으로,
유명한 군도형(軍都陉)、포음형(蒲陰陉)、비호형(飛狐陉)、정형(井陉)、
부구형(滏口陉)、백형(白陉)、태항형(太行陉), 지관형(軹關陉) 둥이 있고
이를 칭하여 태항 팔형이라 한다.
첫 번째 길은 지관형(軹關陉)으로 지(軹)는 전국시대 魏나라의 성이다.
이로 인하여 그 터가 지금 하남성 제원시(濟源市) 동쪽의 지성진(軹城鎭)이고
지관형(軹關陉)은 제원현(濟源縣) 41리가 되는 곳이며
관은 구멍길(孔道)을 말하고 지관으로 인해 형세가 험준하고
예전 용병을 할 만한 땅이다.
두 번째 길은 태항형(太行陉)으로 지금 하남성 신양현(信陽縣) 서북35리 되는 곳으로
문은 넓어 3보나 되고 길이는 40 리이다.
태항산 산수화속에는 길을 따라 태항산이 북상한다.
산서성 보성 남쪽의 태항산 위인데
관계있는 이름이 태항관으로 천정관(天井關), 웅정관(雄定關)이라 칭하며
이 길은 남하해 직접 호뢰관(虎牢關)에 다다라 축록중원의 중요한 길의 하나이다.
셋째 길은 백형(白陉)인데 하남성 휘현 서쪽 50리 되는 곳이다.
하남 휘현(輝縣) 서쪽 50 리로 이 길에 의지하여 남으로 황하를 넘어 개봉을 공격한다.
이곳은 동으로 큰 이름을 얻으러 진격하고
북으로는 안양(安陽), 한단(邯鄲)을 엿볼 수 있으며
군사요충지를 공격할 수 있고 물러나서 방어할 수 있는 군사적인 요충지이다.
네 번째 길은 부구형(滏口陉)이 되는데
지금 하북성 무안현(武安縣)의 남쪽이고 자현(磁顯)의 사이에 있는 부산(滏山)이며,
구통예(沟通豫) 북쪽 안양과 하북 북쪽 한단(邯鄲)과 晉의 구멍도로이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이 길로 자(磁), 형(邢)으로 나가서 조(趙), 위(魏)에 도달한다하였다.
다섯 째 길은 정형(井陉)으로 옛 관의 이름인데 토문관이라고도 칭한다.
이런 이유로 위치가 지금 하북성 정형현(井陉縣)의 정형산(井陉山) 위이다.
정형(井陉)은 이어져 진(晋)나라의 기(冀)와 노(魯)나라의 요충으로
그 군사적인 지위는 매우 중요한다.
정형관은 낭자관이라고도 하며
마치 1대가 겨우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좁은 길인데
동서로 마차가 다닐 수 있는 유일 한 통로이다.
여섯 째 길은 비호형(飛狐陉)으로 비호구라 칭한다.
지금 하북성 내원현(淶源縣) 북쪽과 울현(蔚縣)의 남쪽으로 양안은 우뚝 솟아 있으며
일선에 작은 통로가 있고 구불구불하게 나가는 것이 100여리나 된다.
옛 부터 비호(飛狐)에 걸터앉아 목을 짓누르고 등을 두드리고 나아가
유(幽)와 연(燕)을 핍박하여 가장 승리를 할 수 있는 곳이다.
일곱 째 길은 포음형(蒲陰陉)이라고 하는데
지금 허북성 역현(易縣) 서쪽 자형령(紫荊嶺)위에 있다.
산꼭대기에 자형관(紫荊關)이 있고 압관(庄關)이라고 한다.
송나라 때는 금파관(金陂關)이고 원(元), 명(明)이래 자형관이라고 하였는데
그 땅의 봉우리는 가파르며 길은 기울어 안으로 통하고
산의 서쪽 큰 군사요충지에 달한다.
비호형과 포음형 사이에 노룡새가 있다.
여덟 째 길은 군도형(軍都陉)인데 지금 북경시의 창평현 서북쪽이다.
옛 이름은 군도산(軍都山)으로 관(關)이 있어 군도관이라 한다.
북제(北齊)는 납관관(納款關), 당나라 때는 계문관(薊門關)이라 하였다.
다른 층에는 봉우리가 첩첩히 솟아 형세가 웅위하며 절벽이 걸려있고
양면은 우뚝 솟아 있으며 큰물이 가운데로 흐르고,
기묘하고 험한 하늘이 열려 옛날에는 요애(要隘)라고 하였다.
고대에 연나라를 나가서 진(晋)나라 북쪽으로 가서
내몽고 요새 밖의 목구멍 길에 이른다.
태항팔형(太行八陉)은 예전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시간의 추이에 따라서 이미 공로, 철로 등으로 바뀌어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길이 되었고
옛날의 군사상 요충지는 이미 경제 건설의 대동맥이 되었다.
태항산의 자연은 소오대산 남쪽 언덕과 같이 수직 온도와 면의 차가 다르다.
1,000m이상은 구름과 낙엽송이고, 북쪽 언덕은 1,600m이하 여름의 푸른 숲이며,
1,600~2,500m사이는 고아열대초원이다.
- 안문관(雁門關)
고대 북방족의 중원침입의 요도로
안문관이 무너지면 중원을 잃게 되는데 전중국의 전략요지이다
안문관은 v자형으로 월동 시 철새들의 남방이주의 지점으로
추동절에 기러기들이 대량으로 날아가 안문이라 하는데
장성의 협곡지형으로 이곳이 가장 복잡한 지형이다
명대에는 거용관 이서의 남북 내외장성의 관할점으로
외삼관은 편두관(偏頭關) 안문관(雁門關) 영무관(寧武關)인데
안문관이 최고의 방위체계의 사령부로 전국에서 민국초년에 이르기까지
140여차의 전쟁을 치룬 胡漢 격전지이다.
편두관은 흔주시 편관현, 영무관은 흔주시 영무현,
안문관은 흔주시 대현에 있다.
- 백석산과 낭아산(갈석산)
태항산맥의 최북단에 있는 산이 백석산이다.
백석산은 매 계절마다 산색과 풍경이 바뀌는 온대기후로
하루에도 72번이 변하는 풍광이 변환막측 운해표묘한 신산(神山)이라 한다.
백석산은 동으로 60공리가 이어지고
또 하나의 명성이 큰 대산이 나타나 홍색영웅들의 산인 낭아산이다.
낭아산은 하북성 역무현 서부로 태항산 동록인데 태항산맥계에 속하고
5坨 36봉으로 형성되어 기봉이 줄을 잇고 장약낭아(壯若狼牙)라하고
득명하여 낭아산(狼牙山)이 된 것이다.
장가계의 석영암 봉림과 유사한 경관으로 도초의 암벽이 이어지고
천개의 푸른 취록이 협곡을 푸르게 하는 곳이다.
수억 년의 지각변동으로 카르스트지형이 생겨 수발릉창하(秀撥凌蒼霞)라 하는데
운무의 신비함이 인간을 압도한다는 곳이다.
이 낭아산이 갈석산으로 중원과 고조선, 북부여, 고구려를 가르는 경계였다.
- 북악
하북성 당현(唐縣)의 대무산 국가삼림공원은 고 북악 항산으로
중국의 5대산중 하나로 삼황오제시의 전설로 유구한 역사로
사기 봉선서에는 순임금이 항산에 제사하고
한 선제는 신작 5년(BC57년) 오악을 봉하는 조서를 전국에 내린다.
항산은 북악이 되고 대무산은 신첨산, 신선산으로 상산(尙山)이라 하게 되는데
수차의 개명이 이루어지는데 황제들의 이름을 피하려는 피휘제도로
중국지명은 수없이 바뀐 것으로 또는 대사건과 길상 미신 등의 원인인데
대무산은 3명의 황제가 항(恒)으로
한문제 <유항>, 당 목종 <이항>, 송 진종 <조항>이 이산을 괴롭힌 것이다.
청사고에는 항산의 앞에 늘 古자를 붙이는데 古北岳 恒山이라 강조한 이유이다.
고 북악 항산은 하북 서부의 태항산맥은 주봉이 5군데로
대무산이 공인된 주봉으로 고 북악은 대무산을 말하는 것이다.
300년 전 청 순치연간 산서성 대동시 혼원현의 항산에 제사를 개제하는데
대무산의 고 북악의 명칭이 옮겨간 것이다.
대무산은 산은 푸르고 물이 맑아 신운이라 하고
웅위기험의 기세로 최고봉인 태을봉은 1,890미터에 달하여
태항산의 주봉중 하나이다.
- 황하개도(改道) 및 해안선의 변화
중국의 모친하인 황하는 청장고원의 파안카라산 북록에서 일어나
협곡을 거쳐 황토고원을 지나고
노북(魯北)에서 발해로 들어가는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강이다
중국의 남북을 관통하여 황색표대를 지나 거대한 운반대로
부단히 중하류로 다량의 진흙모래를 실어내 황하유역의 지세를 개변시켜
짙은 남색의 해만으로 변화를 가져온다.
연간 토사량은 일 미터의 제방으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의 3배이다.
지구의 적도를 27번 돌 수 있을 정도로 매년 16억 톤의 토사를 실어내는데
25%만 강 아래 묻히고 10억 톤이 바다로 들어간다.
전 유역 중 76개의 일급지류 중 73개가 황하로 유입되는데 세류가 점차 거류가 되고
색상이 완전히 황색으로 변하여 감숙성 류가협에서 누런 도하에 흘러들어
황하가 처음으로 모래를 받아들인다.
매년 2900만 톤의 토사가 도하에서 황하로 유입되고
이후 황하는 청에서 황으로 변한다.
하류는 태산 노산 기산 등 魯中구릉지역을 거쳐 곤곤 동류의 입해구로 접근하여
남북으로 종횡하여 바다에 이른다.
산동 구릉은 대해중 하나의 섬으로 진예 대협곡 후 황하구인데
퇴를 충적하며 해안선을 시작한다.
산동 구릉의 태산 산곡의 장애로 남북으로 구불거리며 서행하여
서회평원에 충적평원을 만들고 회하와 동시에 충적을 한다.
북으로 황회 해대평원을 이루고 고대 황하삼각주이고 대 황하 삼각주이다.
唐代 시인 이백은 황하는 하늘이 내린 것이라 하는데
황하의 토사는 하류의 하도와 입해구에 퇴적된다.
지질시기 태항산하의 남색해만은 동으로 천리나 후퇴하여
25만 평방공리의 황회해 대평원을 형성한다.
당시의 화북평원은 대해로 고대 지질시기 태항산 이동은 모두 대해로
태항산은 해안선으로 점차 대륙이 되고 이동은 황회대평원과 화북평원이 형성된다.
황하개도의 설은 다양한데 6차례 대 개도가 있었다 한다.
1차는 우(虞)왕 고도로 기원전 2070년-기원전 602년 사이다.
하상주, 춘추시대에 황하는 진예 대협곡에서 거의 정북으로 흘러
지금의 보정(保定)시에서 발해에 유입되었다.
2차는 서한 유로로 기원전 602년-11년 사이다.
전국시대, 서한시대에 황하는 지금의 창주(滄州)시로 흘러 발해에 유입되었다.
3차 동한 유로는 11년-893년 사이다.
동한 이후 수당시대에 황하는 지금의 빈주(濱州)시로 흘러 발해에 유입되었다.
이 시기에 항하 하류에 많은 삼각주가 형성되어
새로운 성시(城市)가 많이 생겨 나게 되었다.
'강역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조조의 북정(北征)으로 보는 고구려의 강역 (2) | 2019.01.31 |
|---|---|
| 야마토 타케루의 동정(東征)으로 보는 백제의 강역 (0) | 2019.01.30 |
| 燕 <진개秦開>의 동정(東征)으로 보는 고조선의 서방 강역 (0) | 2019.01.28 |
| 위화진경(魏花眞經)으로 보는 신라의 궁궐 (1) | 2019.01.23 |
| 당(唐)의 기미주로 보는 고구려의 강역 (0) | 2019.01.23 |